피츠제럴드의 소설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예감이 기이한 방식으로 담기곤 하는데, 그의 작품에서 학문을 탐구하려던 남자 주인공이 결혼을 하면서 연예오락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은 피츠제럴드가 1920년 4월 젤다 세이어와 결혼한 뒤 대중문학 쪽으로 마음이 급격히 기우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 매슈 J. 브루콜리(피츠제럴드 학자)
부와 명성 그리고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좇는 군상은, 피츠제럴드가 열세 살(1909)에 첫 단편을 발표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마흔네 살(1940) 아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발표한 160여 편에 이르는 작품들 전체를 가늠하는 데도 유효한 기준이 될 만큼 피츠제럴드 문학의 중요한 소재일 뿐 아니라 주제이기도 했다.
- 「옮긴이의 말」에서
피츠제럴드는 헨리 제임스 이후 미국 소설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 T. S. 엘리엇
그는 어린아이처럼 잠이 들었고, 그런 모습에는 어떤 힘겨운 기억들도— 대학 시절 호기로웠던 나날들도, 수많은 여자들의 가슴을 달뜨게 했던 빛나던 시절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저 유아용 침대의 하얗고 폭신한 벽만이, 나나와 이따금 그를 보러 오는 한 남자 그리고 잠이 들 무렵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던 “태양”만이 있을 뿐이었다. 태양이 지고, 그의 눈이 감기면, 꿈도 없이, 그를 괴롭히는 어떤 꿈도 꾸지 않고 그는 잠에 빠져들었다.
지나간 날들이—부하들을 이끌고 산후안 고지를 향해 달려가던 거친 돌격도, 사랑하던 젊은 힐데가드를 위해 여름밤의 도시에 짙게 어둠이 내릴 때까지 일에 파묻혔던 신혼 시절도—그보다 앞서 먼로 거리에 있던 음산한 버튼 가의 옛집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밤이 늦도록 시가를 피우던 날들이 마치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그의 기억에서 몽롱한 꿈처럼 사라져 버렸다.
_ 1권 335~336쪽, 「벤저민 버튼에게 일어난 기이한 현상」
“꿈이라도 꾼 것 같아.” 키스마인이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옷 한 벌에 돈 한 푼 없는 약혼자랑 여기 이렇게 있다니, 너무 이상해! 별이 저렇게 빛나는데,” 하고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전엔 별이 있다는 걸 몰랐어. 난 늘 별이 누군가가 가진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했어. 이제 보니 겁이 나. 모든 게 꿈이었다고, 내 어린 시절이 모두 꿈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
“꿈이었어,” 하고 존이 나직이 말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은 꿈이야. 몸 안에 있는 미친 성분들이 만들어 낸. (…) 어쨌든 우리. 한동안은, 한 해쯤은, 사랑을 하자. 너랑 나랑. 그게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신성한 광기가 아닐까 싶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들이랑, 또 어쩌면 환멸이라는 초라한 선물뿐.”
_ 1권 398~399쪽, 「리츠 호텔만큼 큰 다이아몬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그 자신을 위한 거였다. 그의 입을, 눈을, 두 손을 그대로 놔두었다. 어떻게 해 보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오래전에 멀리 사라져 버렸으므로, 더는 돌아올 수도 없었다. 문들은 모두 닫혔고, 태양도 떨어져 버렸으며, 아름다움도, 영원히 스러지지 않는 쇠붙이 같은 아름다움만 남겨 놓은 채 스러져 버렸다. 그가 견뎌 낼 수 있었던 슬픔마저도 환상의 나라 저 뒤편에, 겨울의 꿈들이 무성히 피어나던 청춘의 나라, 삶이 더없이 풍요로웠던 그 나라, 저 뒤편에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오래전에,” 하고 그가 입을 떼었다. “오래전에, 내게 뭔가가 있었지. 하지만 이제 그건 없어. 이제 사라져 버렸어. 가 버렸어. 울 수도 없구나. 어떻게 해 볼 수도 없구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_ 1권 436쪽, 「겨울의 꿈들」
시간은 세상 어디에나, 그의 삶과 그녀의 삶,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순간, 그는 알았다. 시간이 다하도록 찾는다 해도 지나간 4월의 시간들은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두 팔이 쥐가 날 때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갖고 싶었던, 싸워서 쟁취하고 싶었던,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무엇이었다. 하지만 서편으로 지던, 석양으로 밀려 들어가던, 혹은 밤의 미풍 속으로 흘러들던, 그 만져 볼 수 없는 속삭임은……
그래, 가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4월은 끝났다. 4월은 흘러갔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랑도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_ 1권 559~560쪽, 「‘현명한 선택’」
머리와 어깨
버니스, 단발머리로 자르다
얼음 궁전
연안의 해적
5월의 첫날
젤리빈
벤저민 버튼에게 일어난 기이한 현상
리츠 호텔만큼 큰 다이아몬드
겨울의 꿈들
주사위, 쇳조각 그리고 기타
용서
랙스 마틴존스와 웨을스의 와응자
‘현명한 선택’
부잣집 소년
옮긴이의 말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연보
■ 지은이_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F. Scott Fitzgerald, 1896~1940)
윌리엄 포크너,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함께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1896년 9월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태어났다. 프린스턴 대학 재학 중에 단편소설, 희곡, 시를 발표하며 왕성한 문학회 활동을 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장편소설 『낭만적 이기주의자』를 여러 번의 개작 끝에 『낙원의 이쪽』(1920)으로 출간하여, 하루아침에 유명 작가로 등극한다. 피츠제럴드는 이 소설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공허함에서 벗어나려 향락에 빠진 미국 젊은이들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의 무절제와 환멸을 그려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작품의 성공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그는 젤다 세이어와 결혼하고 사교계 명사로 떠오른다. 미국 동부와 프랑스를 오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 가면서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에스콰이어》 등의 신문과 잡지에 단편소설을 발표한다. 잘 팔리는 단편소설 위주로, 파티에 가기 전에 급하게 쓰다 보니 오탈자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중은 춤과 파티, 꿈과 로맨스로 화려한 1920년대 재즈 시대가 잘 담긴 그의 소설에 열광했고, 이 단편들은 『말괄량이와 철학자들』과 『재즈 시대 이야기들』로 묶여 출간된다.
1925년,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이자 시대를 초월한 걸작이 된 『위대한 개츠비』를 출간하여 T. S. 엘리엇, 거트루드 스타인 등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평론가들로부터 ‘문학적 천재’로 칭송받으며 문단에서도 인정받는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미국 대공황과 함께 그의 삶도 추락하기 시작한다. 알코올 중독과 잦은 부부 싸움, 아내 젤다의 신경쇠약으로 인한 입원 등 신산스러운 삶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고 1934년, 9년 만에 야심차게 장편소설 『밤은 부드러워』를 출간하나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할리우드로 옮겨 가 여러 편의 시나리오를 쓰며, 『마지막 거물의 사랑』을 집필하던 중 1940년 12월 21일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그는 『위대한 개츠비』를 포함한 장편소설 다섯 편과 160여 편의 단편소설을 남겼다.
■ 옮긴이_ 하창수
소설가이자 번역가. 1987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중편소설 「청산유감」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1991년 장편소설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로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했다. 최근엔 단편소설 「철길 위의 소설가」로 현진건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지금부터 시작인 이야기』 『수선화를 꺾다』 『서른 개의 문을 지나온 사람』, 장편소설 『천국에서 돌아오다』 『걷는 자의 대지』 『그들의 나라』 『함정』 『1987』 『봄을 잃다』, 작가 이외수와의 대담집 『먼지에서 우주까지』 『마음에서 마음으로』 『뚝,』 등을 출간했다. 옮긴 책으로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윌리엄 포크너』 『킴』 『소원의 집』 등 주요한 영미 작가들의 소설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
1920년대 미국 재즈 시대의 유능한 이야기꾼
영원한 젊음의 표상,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뉴욕에 와서 제 작품이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판매된 걸 안 게
스물두 살 때였습니다. 그건 다시금 맛보고 싶은, 일생에 오직 한 번밖에
느낄 수 없는 가슴 뛰는 일이었음을 전합니다.”
- 피츠제럴드가 에이전트 해럴드 오버에게 보낸 서신에서 -
윌리엄 포크너,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함께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소설이 현대문학 「세계문학 단편선」 스물일곱 번째와 스물여덟 번째 권으로 출간되었다. 1920년대 미국 재즈 시대의 유능한 이야기꾼이자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의 대변자, 시대를 초월한 걸작이 된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로 유명한 피츠제럴드는 다섯 편의 장편소설과 160여 편이나 되는 단편소설을 남겼다. 그의 소설에는 섬세하고 여린 내면을 지닌 사람들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그래서 더 고독하고 쓰라렸던 인생들이 담겨 있는데, 이 단편선에는 그러한 이야기들 중 대표적인 단편소설 30편을 엄선하여 두 권에 나누어 담았다. 부와 명성,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좇는 군상, 인생에 눈을 뜨는 젊은이의 초상, 한 세대의 연대기가 유연하고도 서정적으로 펼쳐진다. 각각의 단편에는 피츠제럴드 전기 작가이자 학자인 매슈 J. 브루콜리의 전문적인 해설이 더해져, 발표할 당시 피츠제럴드의 상황이나 일화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 돕는다.
20세기 초 미국 ‘잃어버린 세대’의 대변자
사랑과 상실, 인생의 허무를 노래한 낭만적 이상주의자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피츠제럴드는 열세 살에 첫 단편을 써서 학교 신문에 게재한다.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하여 단편소설, 희곡, 시를 발표하는 등 왕성한 문학회 활동을 했는데, 그 때문에 성적은 부진했다. 낙제할 위기에 처한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앨라배마에 주둔해 있다가 그곳 대법원 판사의 딸인 젤다 세이어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제대 후 광고 회사에 취직하고 약혼을 하지만 박봉에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파혼당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소설 집필에 전념한 그는 프린스턴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장편소설 『낭만적 이기주의자』를 여러 번의 개작 끝에 『낙원의 이쪽』(1920)으로 출간하여, 하루아침에 유명 작가로 등극한다. 이 소설에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공허함에서 벗어나려 향락에 빠진 미국 젊은이들 ‘잃어버린 세대’의 무절제와 환멸을 그려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작품의 성공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피츠제럴드는 젤다 세이어와 결혼하고 사교계 명사로 떠오른다. 미국 동부와 프랑스를 오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 가면서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에스콰이어》 등의 신문과 잡지에, 주로 잘 팔리는 단편소설 위주로 발표한다. 갖고 싶은 비싼 시계를 사기 위해 혹은 파티에 가기 전에 급하게 쓰다 보니 오탈자가 많았지만 대중은 춤과 파티, 꿈과 로맨스로 화려한 1920년대 재즈 시대가 잘 담긴 그의 소설에 열광했고, 이 단편들은 『말괄량이와 철학자들』과 『재즈 시대 이야기들』로 묶여 출간된다.
1925년,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출간하여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평론가들로부터 ‘문학적 천재’로 칭송받으며 문단에서도 인정받는다. T. S. 엘리엇은 “피츠제럴드는 헨리 제임스 이후 미국 소설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했고, 다소 냉소적인 평론가 거트루드 스타인은 “그는 이 소설로 동시대를 창조했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미국 대공황과 함께 그의 삶도 추락하기 시작한다. 알코올 중독과 잦은 부부 싸움, 아내 젤다의 신경쇠약으로 인한 입원 등 신산스러운 삶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고 1934년, 9년 만에 야심차게 장편소설 『밤은 부드러워』를 출간하나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할리우드로 옮겨 가 여러 편의 시나리오를 쓰며, 『마지막 거물의 사랑』을 집필하던 중 1940년 12월 21일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세계문학 단편선」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1』에는 그가 20대 초반에서 30대로 막 넘어가던 때까지, 가장 왕성한 필력을 자랑하던 시기에 발표한 단편들이 담겨 있다. 연애 소설, 판타지에서 정치사회적 관심까지 피츠제럴드의 다양한 문학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노인으로 태어나 갓난아이로 삶을 마감하는 「벤저민 버튼에게 일어난 기이한 현상」과 거대한 산 전체가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기발한 SF적 상상력이 펼쳐지는 「리츠 호텔만큼 큰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재즈 시대의 유희적 삶을 유쾌하면서도 암울하게 그려 낸 「5월의 첫날」, 한편의 즐거운 활극을 보는 듯한 「연안의 해적」, 그리고 부와 명성의 허상과 실체를 보여 주고, 사랑에 헌신한 한 남자를 그린 「부잣집 소년」까지, 열네 편이 실려 있다.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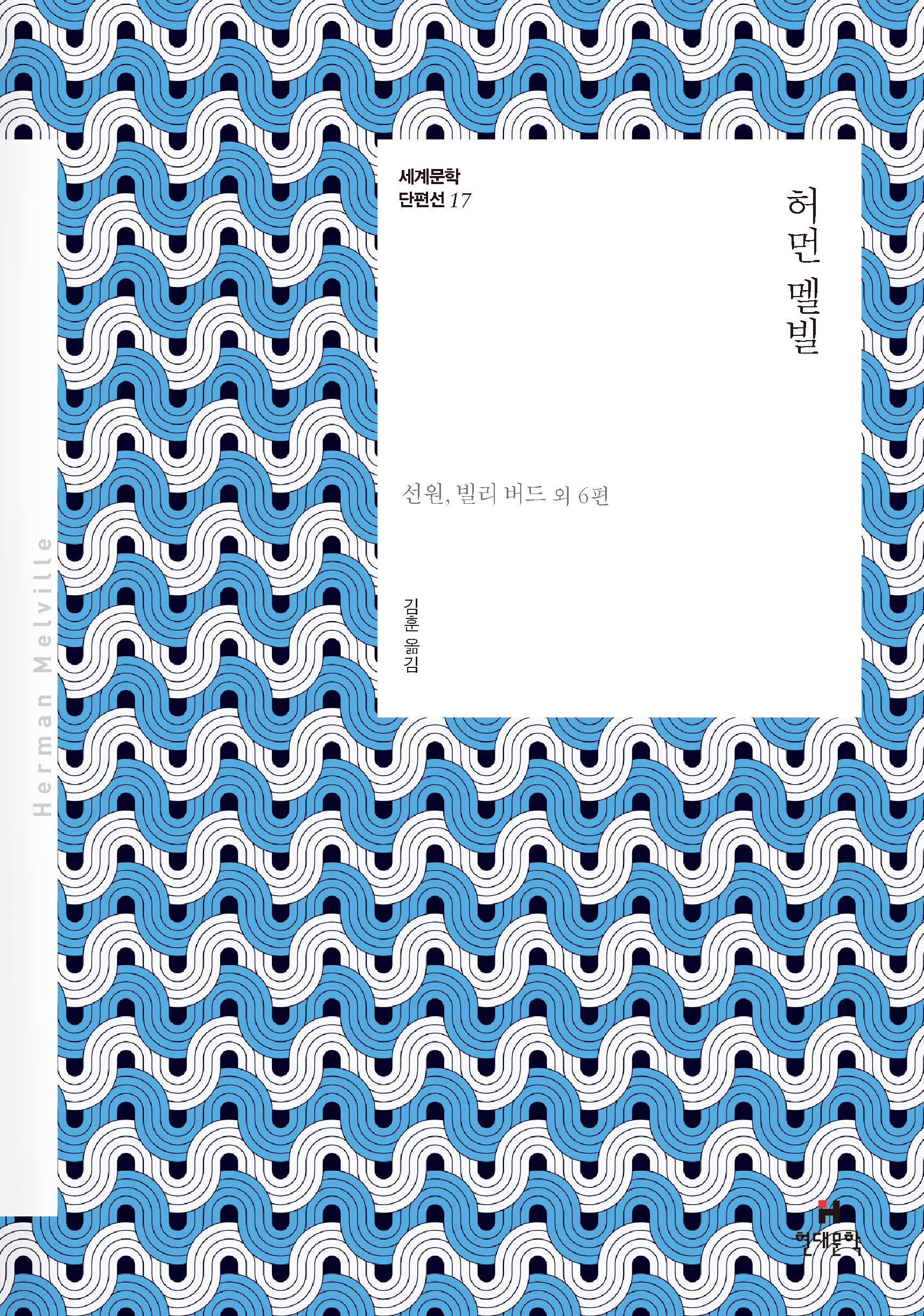

.jpg)
.jpg)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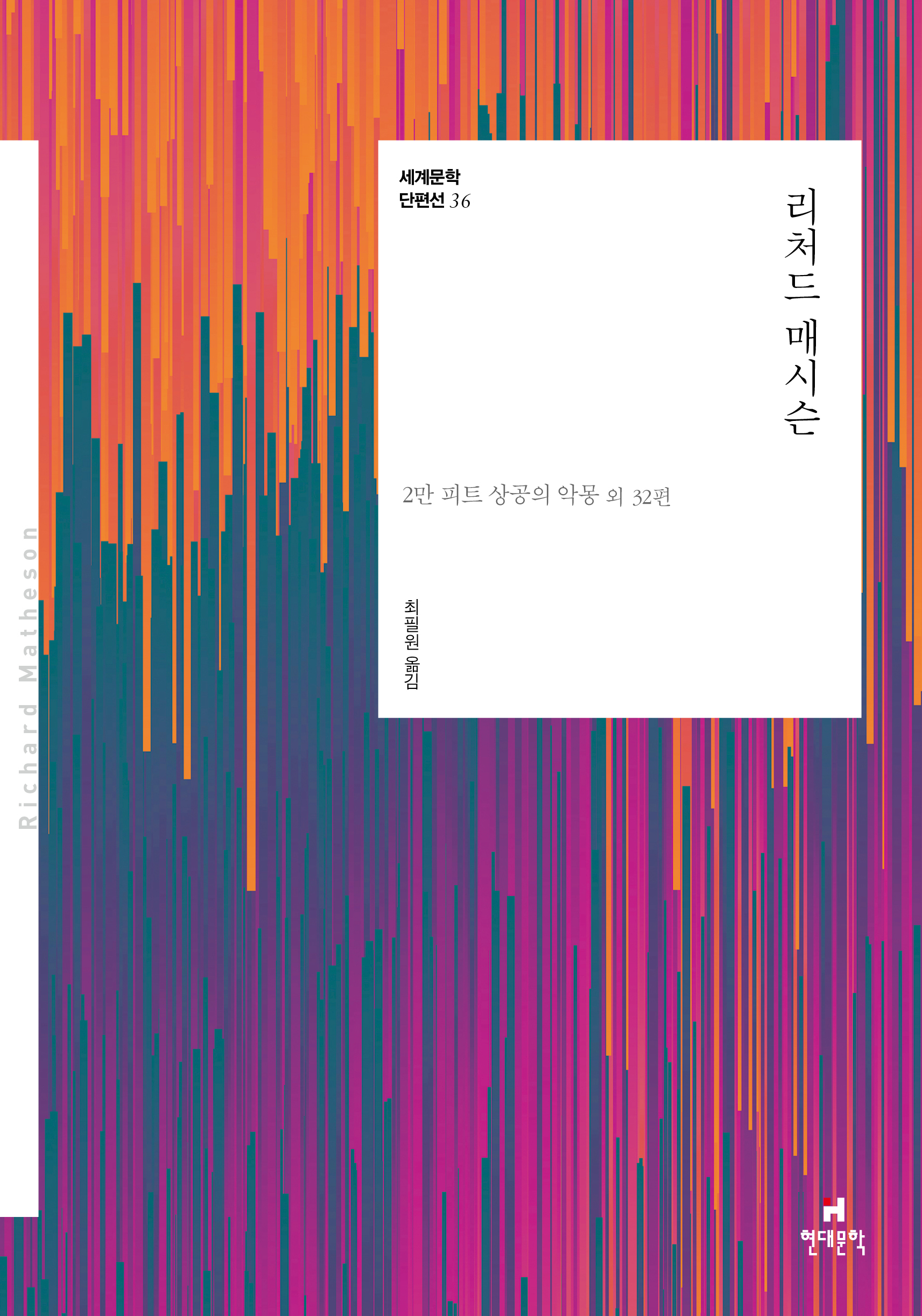
.jpg)
.jpg)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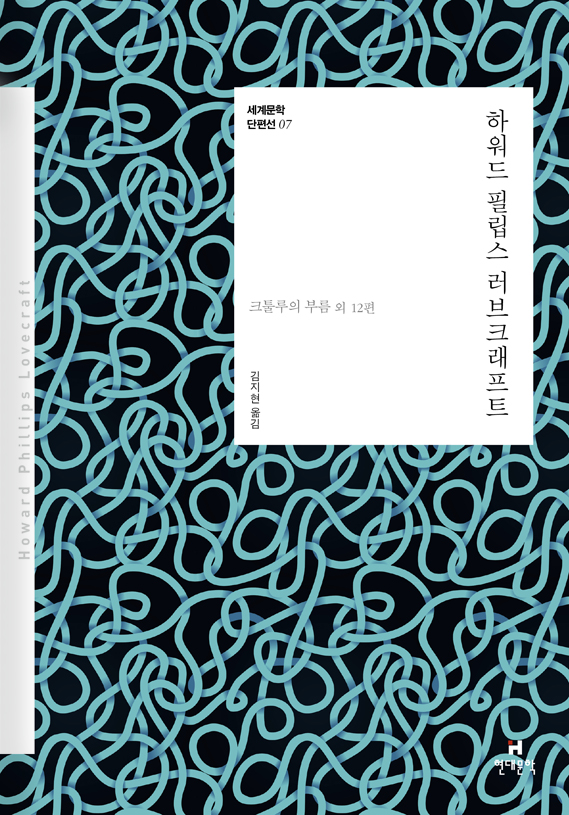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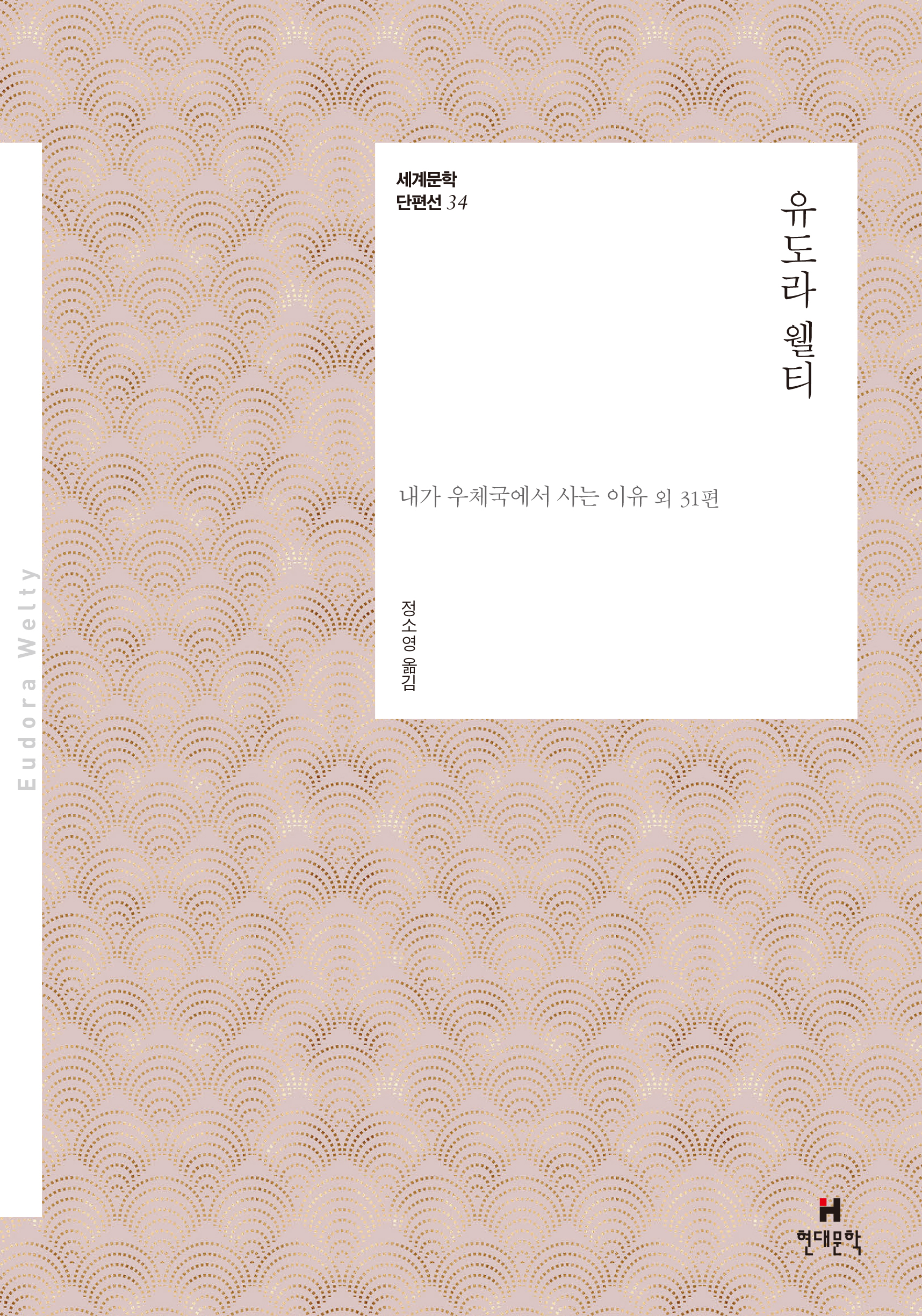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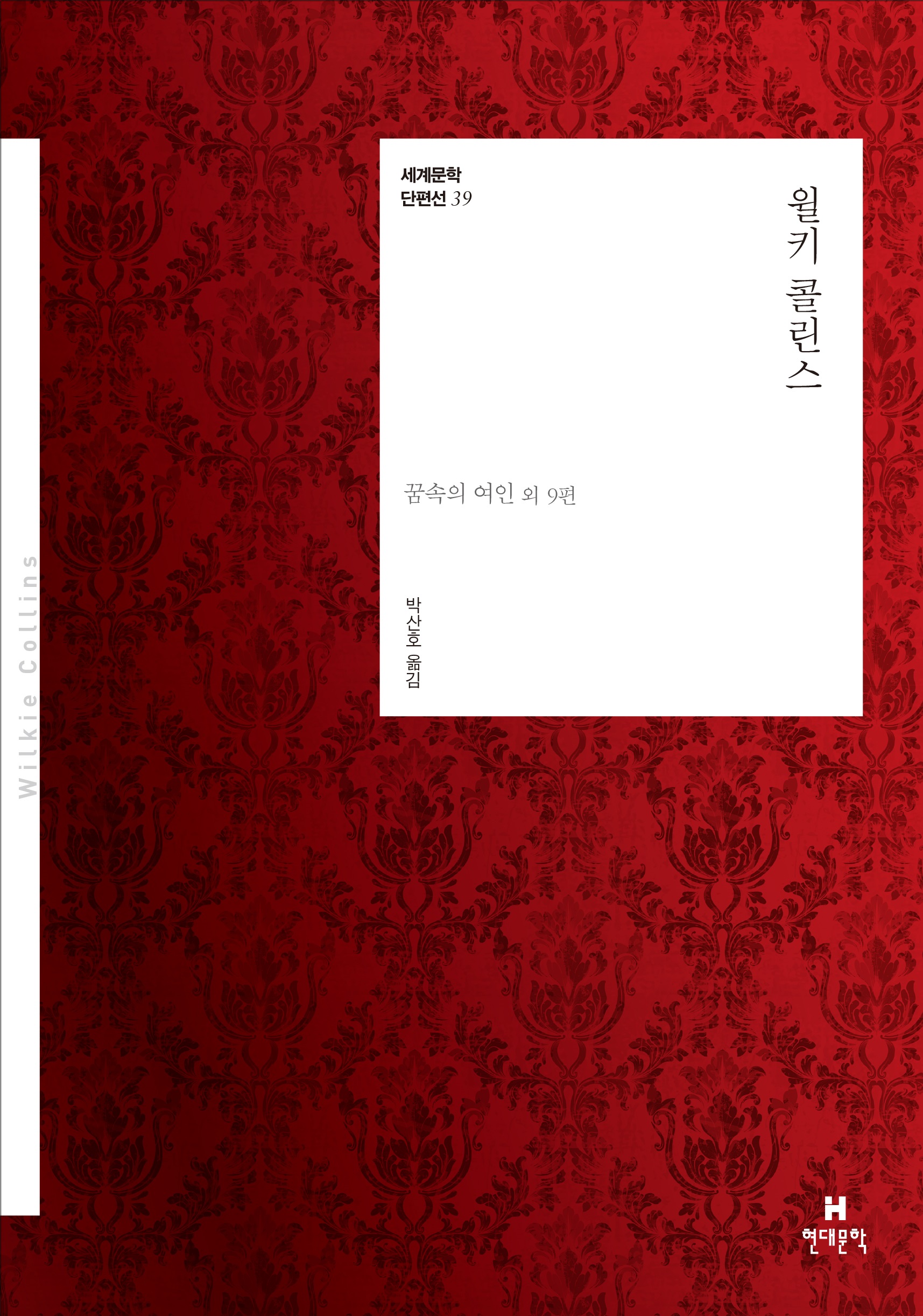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