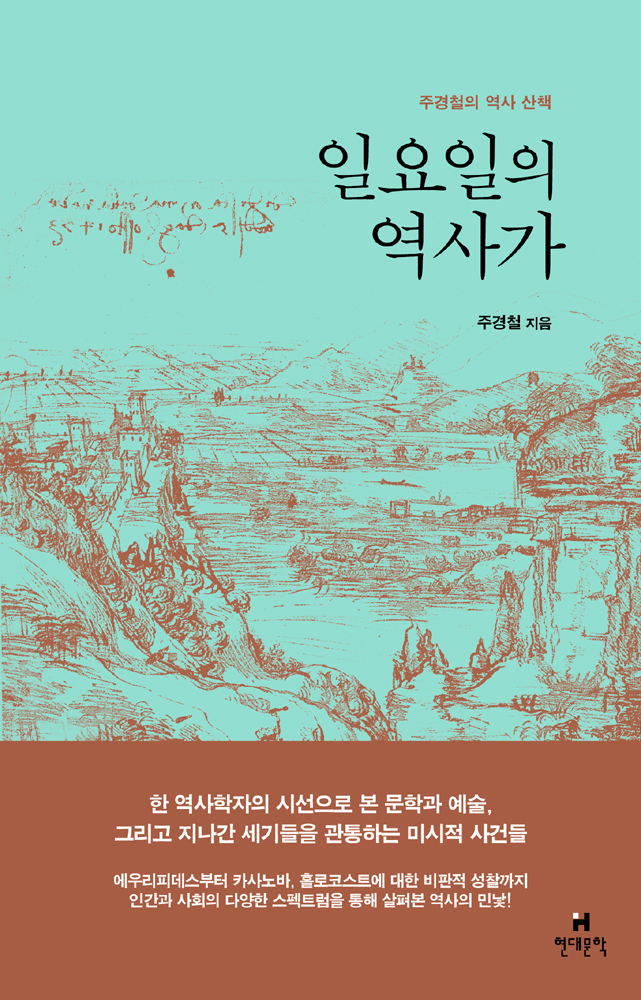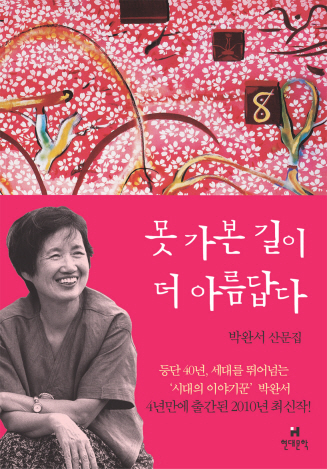고대 도시 바빌론, 잊혀진 폐허의 발굴 현장에서 삶과 죽음의 기원을 파헤치는 허수경 시인의 고고학 기행 에세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 《현대문학》에 연재됐던 것으로, 현재 독일 뮌스터대에서 고대 근동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필자가 고대 폐허 도시들의 발굴 현장의 체험으로 쓴 고고학 에세이다. 삶의 궤적과 흔적들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인류의 거역할 수 없는 '보편적 운명과 열정'에 대한 '근원적 슬픔'이 곳곳에 묻어난다.
작가의 말 6 바빌론 9 글쓰기, 라는 것의 시작 24 아가사 크리스티와 고고학 40 ‘그들’과 ‘신들’, 그리고…… 53 그러나, 뿌리를 위하여 66 몇 개의 순간들 77 타인의 얼굴 89 방아잎, 그리고 해골에게 말 걸기 101 서재 안의 흰 고래 112 늘어진 시계, 20센티미터의 여신 125 기억과 기역, 미음과 미음 139 바다 바깥 151 발견의 편견 혹은 편견의 발견 176 존재할 권리 188 끝이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 198 사원과 꿈 210 니네베 혹은 황성 옛터 222
허수경 1964년 경남 진주 출생. 시인이자 고고학자인 허수경은 스물다섯 나이에 세상을 통달한 듯한 시어로 80년대 시대가 할퀸 인간들의 삶을 담은 첫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로 시인으로 등단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작가로 일하다 어느 날 독일로 떠나 뮌스터 대학에서 고대 근동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방학 동안에는 발굴 현장 땡볕 아래서 유적지를 탐사하고, 학기 중에는 집에서 도서관에서 고대 동방 고고학을 연구했다. 그러다가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게 차오를 때면 램프를 밝히고 단정하게 책상에 앉아 모국어로 글을 썼다. 작품으로 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혼자 가는 먼 집』『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장편소설 『모래도시》, 수필집 『길모퉁이의 중국식당』『모래도시를 찾아서』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끝없는 이야기』 『슬픈 란돌린』 들이 있다.
■ 이 책은 『모래도시를 찾아서』는 총 17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오리엔트의 폐허 도시 바빌론을 중심으로 고대 건축물들의 발굴 과정을 소개하며, 유물이 의미하는 역사적 의의와 정복과 찬탈의 역사로 파괴에 파괴를 거듭한 유적들을 통해 시지프스적 인간의 숙명을 돌아보게 한다. 또한 허수경 시인 특유의 시적 표현으로 역사적 발굴 현장에서 느낀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발굴 현장에 얽힌 뒷이야기들이 읽는 이의 흥미를 돋운다. 특히 헤로도토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격찬한 「바빌론」, 아가사 크리스티의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살인』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발굴 이야기를 「아가사 크리스티와 고고학」에서 만난다. 「‘그들’과 ‘신들’, 그리고……」「니네베 혹은 황성 옛터」 등은 매우 돋보이는 이야기들로, 기원전 1700년경부터 세계의 중심지로,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지배했던 바빌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독일 건축가이며 1899년부터 1917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바빌론을 발굴한 고고학자 콜데바이의 기록과 함께 90여 년 전의 바빌론의 모습들을 다시 볼 수 있다. 여기에 우리는 전 인류의 역사를 막론하고 흔적을 남기고 싶어한 ‘인간의 불멸에의 열망’과 ‘세계와 존재’에 대한 허수경 시인의 진지한 통찰을 읽을 수 있다. 「아가사 크리스티와 고고학」에서는 아가사 크리스티 탐정소설의 기반이 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발굴지 등을 중심으로, 아가사 크리스티를 둘러싼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녀의 소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살인』의 배경이 된 우르의 발굴 과정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죽은 이의 영면(永眠)을 위해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허수경 시인의 개인적 고백에서 시작된 「방아잎, 그리고 해골에게 말 걸기」는 이집트 테베에 있는 투탕카멘이라는 소년 파라오의 묘 발굴 이야기다. 에드워드 카터는 그 무덤을 발굴하기 위해 10여 년 넘게 이집트를 헤매다가 1922년 드디어 파라오의 묘를 발굴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럽을 이집트 고고학의 열기로 뒤덮는다. 그러나 몇 년 후 파라오의 무덤을 발굴한 자들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갖가지 무성한 소문들. 결국 그들의 죽음은 파라오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햇볕과 모기와 더위 때문임이 밝혀진다. 「‘그들’과 ‘신들’, 그리고……」는 수많은 민족 집단의 이주와 기원전 오리엔트에 살았던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다. 기독교의 유일신을 모시는 거대한 종교 체계가 오리엔트를 뒤덮기 전까지 고대 동방의 신들은 그들의 도시국가에서 만신전을 이루며 살았다. 신 엔릴에 의해 만신전 통합이 ‘정치적 의지’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신들의 역사 역시 인간의 역사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기억과 기역, 미음과 미음」에서는 오랜 시간 발굴 작업에 참여하면서 심하게 앓았던 허수경 시인의 이야기를 ‘ㄱ’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빌어 잔잔하게 써내려갔다. 발굴 숙소에서 모어(母語)가 아닌 말로 아픔을 겪어내야 했을 때의 외로움과 향수가 담겨져 있다. 마지막 장 「니네베 혹은 황성 옛터」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난 테러에 의해 희생된 모든 이들과 폐허가 되어버린 유적지들에 대한 허수경 시인의 생각들을 니네베와 바빌론, 그리고 산헤립이라는 신아시리아 왕의 흥망성쇠에 견주어본다. ‘세계 질서’를 위한 살육이 과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를 되물으며, 폐허를 바라보는 시인의 참담한 심경을 쓸쓸함에 드러내고 있다. ■ 본문 중에서 고고학자들이 문화 지층cultural stratum/Kulturschicht이라고 부르는 지층은 이렇게 세대가 지나면서 겹으로 겹으로 두터워지다가 결국은 언덕 모양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기를 포기하고 떠나 버린 오리엔트 도시들을 발굴하는 일은 그러니까 언덕을 파는 일이다. 언덕은 언덕이되 그곳에 살았던 인간의 기억을 궁글게 안고 있는 기억의 언덕을 파내려가는 일이다. 기억의 맨 아래층에는 아마도 폐허 도시가 태어날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위에는 유년이, 또 그 위에는 청년의 시간과 장년의 시간과 노년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은 맨 위에 얹혀져 있다. 폐허 도시의 죽음의 시간은 지금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다. 그러나 놀라워라, 인간의 시간과는 달리 폐허 도시의 시간은 죽음의 순간인 지층을 파내면 순간순간마다 유년과 청년과 장년과 노년이 한 지층 안에 어우러져 숨쉬고 있다. 각각의 지층이 머금고 있는 시간의 스펙트럼. 발굴은 도시의 죽음을 파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 도시의 죽음은 그 도시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서 진행된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아니 살 수 없는 곳. 모두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는 바람과 흙과 우연히 지나다가 터를 잡은 억센 잡초들이 그리고 그 잡초들 사이를 기어다니는 작은 파충류나 지네들이 모여든다. 그런 자연들은 옛날에 이곳에 도시가 있었고 사람들이 살았고, 하는 사실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 더러 그곳에는 무덤이 하나씩 둘씩 들어서기도 한다. 허나 무덤을 그곳에 들어앉힌 사람들은 언젠가 그곳에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이들이다. 그들 역시 도시가 존재했다는 사실과는 무관하다. 폐허 도시는 누군가 오래된 잊혀짐에서 그 도시를 불러내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도시로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으나 폐허 도시라는 이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 p.14~15 고대인은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가, 를 추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감히 고대인을 이해하려고 하다니, 어쩌면 그 생각마저도 가소로운 일이 아닌가 싶다. 유적터에서, 고대인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쓰던 물건들이나 집터를 발굴할 수는 있으되 그들의 마음은 발굴할 수가 없었다. 과거는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나란, 다만 나와 시대의 한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 p.64 도굴로 희생된 유적지는 텔로뿐만이 아니다. 남이라크에 있는 많은 유적지들은 마치 달의 표면 같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구멍들은 도굴꾼들이 만든 것이다. 미술 시장에서는 값을 올리려는 장사꾼들과 값을 낮추려는 구매자들이 팽팽하게 대결을 했고 또한 그 발굴 결과를 시기하던 몇몇 고고학자들은 점토판에는 아무런 연구 가치가 없는 ‘영수증’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다. … 장사꾼과 정치가들이 고고학에 간섭을 하지 않는 세월에 발굴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폐허지에 남겨진 유물들을 폐허가 되던 그 시간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폐허 도시의 문서실, 그 폐허 도시의 심장이 아직 움직일 때 그 피 돌기를 담당하던 문서실. 그러나 모든 문맥이 지워진 채 박물관의 ‘지하층’에 보관되어진 그 흙을 이겨서 만든 고대 문서들은,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실 가운데 부분만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 다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입을 다물 것이다. 아니 그들의 입은 강제로 닫힌 것이다. --- p.114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