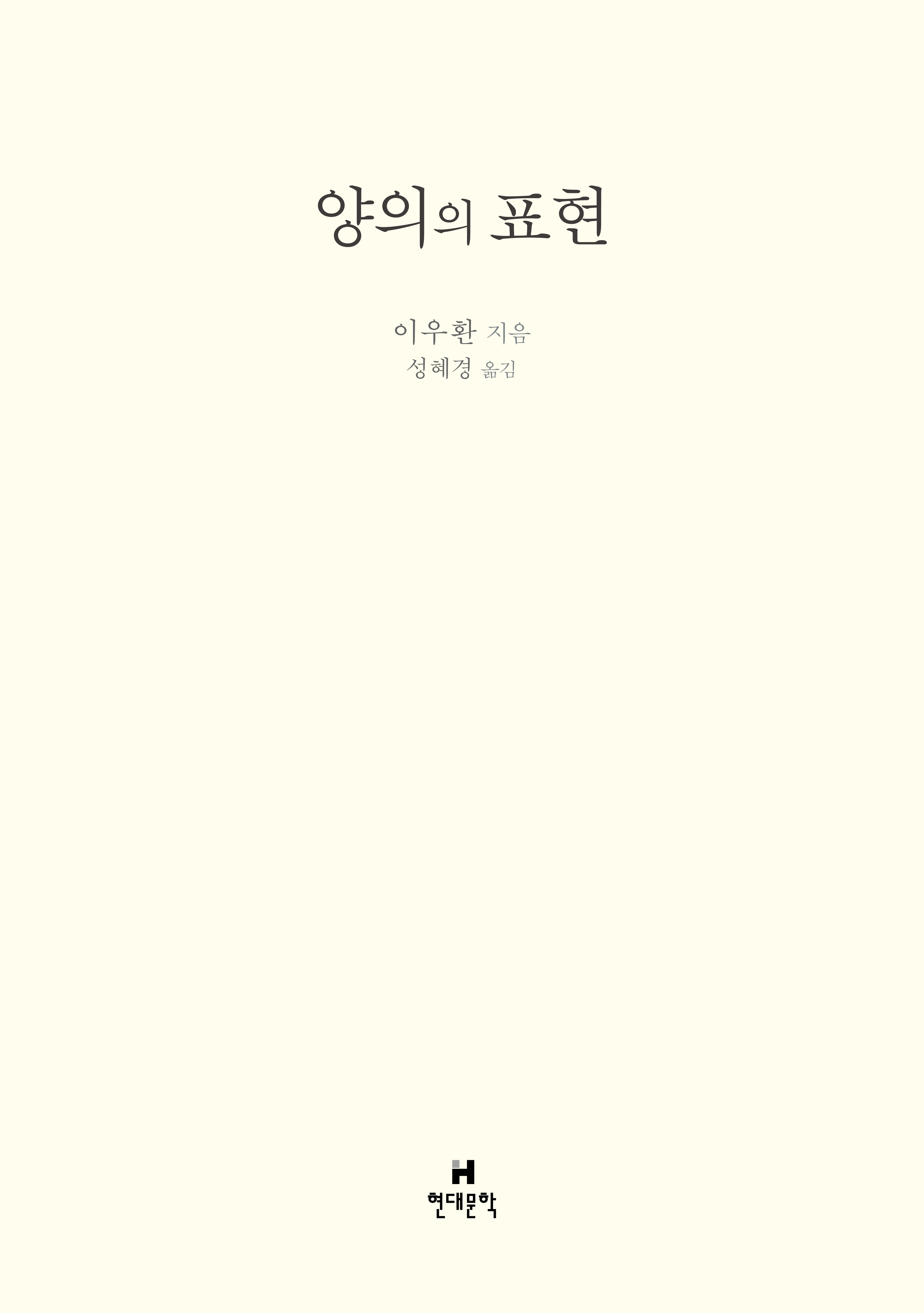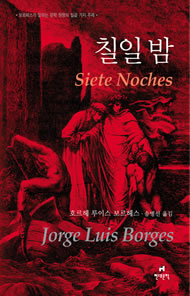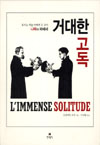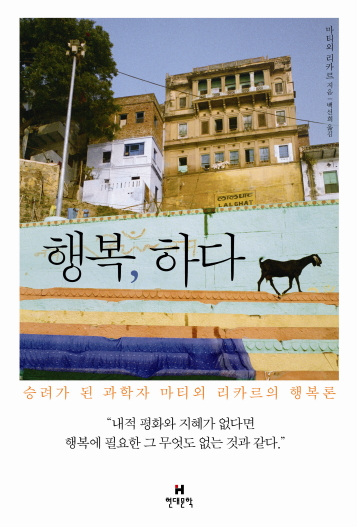■ 이 책에 대하여
영국의 문학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전방위적 지식인으로 불리는 작가, 게리 덱스터의 『왜 시계태엽 바나나가 아니라 시계태엽 오렌지일까?』가 현대문학에서 박중서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50가지 제목으로 읽는 문학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기원전 380년경 고대 그리스 고전부터 1990년대 미국 베스트셀러까지, 50편의 책 제목에 얽힌 비밀을 풀어내는 유쾌한 문학 에세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세상에는 간혹 내용을 읽어도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이해 가지 않는 기이한 책들과 또는 단순히 내용을 묘사한 제목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면 그 뒤에 뜻밖의 일화가 존재하는 책들이 있다고 말한다. 『왜 시계태엽 바나나가 아니라 시계태엽 오렌지일까?』는 이러한 저작들을 문학 작품 위주로 선별해 살펴보는 도서로서, 장당 6~8쪽 내외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의 글 속에 제목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작품과 작가들의 이야기를 담아 하나의 제목 일화에서 확장돼 광활한 책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 이 책의 내용 및 주요 특징
멜빌은 왜 제목을 『고래』에서 『모비 딕』으로 바꿨을까?
『1984』라는 숫자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
헤밍웨이가 다시 떠오르길 간절히 바랐던 ‘태양’은 무엇일까?
『사자와 마녀와 옷장』 속 ‘사자’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상징할까?
총 50개의 장이 연대기순으로 구성된 이 책은 동시대 작가와 작품들이 서로 겹쳐지는 생생한 현장을 보여줌과 동시에 세계 문학사의 궤적을 읽을 수 있게끔 한다. 아울러 그 속에서 드러나는, 제목이 때로 작품과 심지어 그 저자의 운명을 좌우한 사례들은 제목이 문학사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를 가늠케 한다. 이 책에서 볼 수 있듯, 당대 사회적 기준에선 자칫 외설 서적이 될 뻔했으나 제목 덕에 올바른 성 지침서의 고전이 된 『부부의 사랑』, 제목 때문에 극장 관객들이 “저자를 죽여라”라고 외치며 폭동을 일으켰던 희곡 『서쪽 세계의 플레이보이』, 그리고 동명의 시가 존재한 까닭에 표절 논란이 제기된 엘리엇의 『황무지』 등은 그 대표적 예로 꼽을 수 있다.
풍부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제목 탄생의 기원과 어원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이 책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갖가지 정보를 발굴해 보이는 가운데 오랜 논쟁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를 제시하기도 한다. 헤밍웨이가 피츠제럴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혀지는 ‘해’의 상징, 『위니 더 푸』 초판 첫 장에서 발견된 저자 밀른과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의 대화 인용문으로 되짚어보는 ‘위니 더 푸’ 암컷 주장설과, 이 텍스트를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는 익숙한 작품을 새로운 시각 혹은 심미안을 가지고 읽고 싶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한편 이 책에서 다루는 작품 제목은 영어 제명을 기준 삼은 것으로, 이를 통해 일부 우리말 번역 제목의 오류 및 판본에 따라 제목이 달라진 사연까지도 더불어 알 수 있다. 민주주의를 혐오한 플라톤의 저서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유, 존 웹스터의 『The Duchess of Malfi』를 옮긴 번역본 두 종이 ‘말피’와 ‘아말피’라는 다른 지명을 택한 사정과 같이 전승 과정에서 비롯된 오류부터, 제임스 M. 케인의 『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 번역 제목에서 누락되곤 하는 ‘항상Always’이 상징하는 바 등을 바로 이 책에서 알아낼 수 있다.
앉은자리에서 부담 없이 한 편씩 읽을 수 있는 세계 문학 다이제스트이자 흥미진진한 에세이로서, ‘왜’라는 사유의 핵심이자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 책은 또한 각 장 말미의 주석에 상세한 출처 및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문헌을 수록하는 등 인문 교양서의 면모를 보인다. 이번 한국어판은 저자의 주석과 작품 원전 텍스트를 기재한 참고 문헌 목록에 덧붙여 옮긴이의 주석 및 번역 과정에서 참조한 번역서를 추가해 국내 독자들에게 각 작품을 알아가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안내서로 삼을 수 있게 했다.
■ 해외 언론 및 평단의 찬사
★★★★★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을 포함한 갖가지 책들에 관해서 이전까지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그리고 종종 기발하고도 의외의 결론에 도달하는) 50편의 맛깔나는 짧은 에세이. 만약 이 책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여러분이 직접 사서 읽어보시길. _《스펙테이터》
★★★★★ 게리 덱스터의 선물은 제목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를테면 『시계태엽 오렌지』 『황무지』 또는 『고도를 기다리며』와 같은) 문학적 창작품들의 미스터리도 밝혀낸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D. H. 로런스의 『달아난 수탉』을 읽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덱스터의 흥미진진한 에세이 끝에 이르러서 여러분은 로런스가 ‘수탉들cocks’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그 녀석들이 헛간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인지 아니면 바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류인지도 말이다!). _《가디언》
★★★★★ 감칠맛 나게 재치 넘치고 박식한 에세이 선집. 마치 초콜릿 선물 세트를 받았을 때처럼, 나는 그 내용물을 너무 빨리 해치우지 않도록 자제해야만 했다. 게리 덱스터만큼 박식함을 자랑하는 작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_길버트 어데어(소설가)
★★★★★ 유쾌하다! 세상에는 문학을 재미있게 다루려 시도하지만 결코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책이 몇 권 있다. 하지만 덱스터는 언제나 이를 해낸다. 그는 적절한 일화를 만들어내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_니컬러스 리저드(저널리스트)
★★★★★ 문학 애호가라면 누구나 이 책을 좋아할 것이다. _《아이리시 타임스》
■ 본문에서
113~114쪽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 그의 지적 호기심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괴물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창조된 직후에 그는 우연히 누군가 내다 버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비롯해 존 밀턴과 괴테의 책 몇 권을 탐독한다. 독서로 인해 그의 더 섬세한 본능이 일깨워지지만, 창조자 프랑켄슈타인이 그를 경멸하자, 그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기 시작한다. 그는 자기 행동을 현란한 장광설로 정당화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화자 겸 주인공의 발언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내 말을 믿어, 프랑켄슈타인, 나는 너그럽다고. 내 영혼은 사랑과 인간애로 번쩍이지. 하지만 나는 혼자가, 처참하게도 혼자가 아닌가? 당신, 내 창조자는 나를 혐오하지. 그러니 당신의 동료 피조물로부터 내가 어떤 희망을 얻을 수 있겠나? 그들은 내게 아무런 빚도 없는데. 그들은 나를 경멸하고 증오하지. 외딴 산과 황량한 빙하만이 내 안식처야. 나는 여기서 여러 날을 헤매었지. 나 혼자만 두려워하지 않는 얼음 동굴이 내 거처고, 그곳이야말로 유일하게 사람이 아까워하지 않는 장소지. 나는 쓸쓸한 하늘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데, 왜냐하면 당신의 동료들보다는 그쪽이 내게 더 친절하기 때문이지. 설령 인류 가운데 다수가 내 존재를 안다 치더라도, 그들은 당신이 하는 것처럼 할 거고, 나를 파괴하기 위해 무장할 거야. 그렇다면 나를 경멸하는 자들을 나도 증오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모든 대사가 다음과 같은 단 한 마디로 표현된다.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
182~183쪽 「크로이처 소나타」
『크로이처 소나타』는 톨스토이의 영적 생활에서 일어난 재난을 상징한다. 이 재난 때문에 그는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처럼 위대한 중기 작품들로부터 멀어져서 『하느님의 왕국은 그대 안에 있다』와 같이 기독교 아나키즘을 천명한 후기 작품들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행에는 고통도 없지 않았다. 톨스토이가 저 격정적인 프레스토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 때, 과연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그는 관능적 쾌락의 세계가 지닌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세계가 지닌 사악함을, 그리고 선의 불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231쪽 「율리시스」
(……)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율리시스’일까?” 『오디세이아』를 선택한 것은 약간 의외인 느낌이 없지 않다. 차라리 『오이디푸스왕』을 배경 텍스트로 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블룸은 오이디푸스, 몰리는 이오카스테, 디덜러스는 테이레시아스가 (또는 다른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율리시스』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징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는 시계나 컴퓨터 프로그램과도 비슷하다. 그 최종적이고 가시적인 산물 배후에는 (예를 들어 시계의 문자판이나 컴퓨터 화면의 배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계 장치가 (예를 들어 톱니바퀴나 2진수 코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이스는 왜 굳이 『오디세이아』를 자기 코드로 선택한 걸까?
이에 대한 답변은, 그 작품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
266쪽 「해는 또 떠오른다」
피츠제럴드의 아내 젤다는 훗날 이 소설에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했다. “투우, 헛소리, 그리고 허풍.” 다른 사람들도 딱딱한 대사며, 우스꽝스러운 등장인물이며, 과도한 반유대주의와 여성혐오주의를 비판했다. 맥스 퍼킨스조차도 상사인 찰스 스크리브너에게 이 책의 가치를 납득시키느라 한동안 애를 먹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번은 퍼킨스가 헤밍웨이의 원고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을 책상 위의 메모장에 적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중에는 “똥, 씹, 쌍년, 오줌” 같은 단어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그 메모장 맨 위에는 “오늘 할 일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찰스 스크리브너는 퍼킨스의 사무실로 들어왔다가 우연히 그 메모장을 보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 아무래도 과로한 모양이군.”
290~291쪽 「집배원은 항상 초인종을 두 번 누른다」
이 책은 두 가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하나는 남편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아내의 죽음이다. 체임버스는 두 가지 죽음 모두에 한몫을 했지만, 두 번째 죽음 이후에는 “더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 동시에 “숨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다. 그는 첫 번째 초인종 소리는 못 들은 척했지만, 두 번째 초인종 소리에는 내다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집배원’은 곧 운명, 복수의 여신, 죄의 응보, 거룩한 정의인 셈이다. 그리고 프랭크 앞으로 온 우편물은 얼마 후에 예정된 그의 사망이다. 그렇다면 이 집배원은 ‘항상’ 초인종을 두 번 누른다고 말할 수 있다.
313~314쪽 「고도를 기다리며」
제목이라는 문제에서는, 우연의 일치라는 잔혹한 힘이 기묘한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늘 있다. 과연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폰 리히베르크의 「롤리타」를 읽었을까?(본서 제43장을 보라). 과연 조지 오웰은 잭 런던의 『강철 군화』 제21장에 나온 각주를 기억했을까?(본서 제40장을 보라). 이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는 저자의 일기나 기록이 없으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확실한 결론은 예나 지금이나 얻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마련이다. 이렇다 보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심지어 저마다 똑같이 설득력 있고, 그럴싸하고,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 영향력들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되면, 우리는 절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절망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을 자아내는 제목이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이다.
■ 저자 서문
01 전체주의적 텍스트가 민주주의 입문서로 오해받은 사연
플라톤 『공화국』
02 실화로 가장한 위대한 농담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03 고귀한 술꾼들에게 바치는 라블레적 찬가
프랑수아 라블레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04 별을 사랑하는 이가 떠나버린 별을 그리며 지은 소네트
필립 시드니 경 『아스트로필과 스텔라』
05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중인물의 탄생기
크리스토퍼 말로 『파우스투스 박사의 비극』
06 ‘원조 햄릿’이냐 아들 ‘햄닛’이냐, 그것이 의문이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07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장소 ‘말피’에서 벌어진 유혈극
존 웹스터 『말피의 여공작』
08 청교도인 내가 사포와 동일한 ‘뮤즈’라니요!
앤 브래드스트리트 『최근 아메리카에 나타난 열 번째 뮤즈』
09 재투성이 궁둥이는 어쩌다 위험천만한 유리 구두를 신게 됐을까
샤를 페로 『신데렐라, 또는 작은 유리 구두 』
10 처녀의 머리칼을 자른 주인공과 원수의 두레박을 훔친 저자
알렉산더 포프 『머리타래 강탈』
11 영국 최초의 심리소설 『패멀라』를 패러디한 안티 소설
헨리 필딩 『섀멀라』
12 18세기의 고전 혹은 포르노그래피 논쟁
존 클레런드 『패니 힐』
13 ‘로빈슨 가족’이 등장하지 않는 이 소설
요한 다비드 비스 『스위스의 가족 로빈슨』
14 프랑켄슈타인의 모델은 정말로 실존 인물이었을까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15 출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실패, 단 두 권 팔린 시집
브론테 자매 『커러, 엘리스, 액턴 벨 시집』
16 빅토리아 시대 두 시인의 사랑이 낳은 결실
엘리자베스 배럿 브라우닝 『포르투갈인의 소네트』
17 배신과 착취로 스러진 여인의 무덤에 놓인 동백꽃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 『춘희』
18 존재하지 못할 운명을 지녔던 대작, 그 서막
윌리엄 워즈워스 『서곡』
19 출간 한 달 만에 소설 제목이 바뀌다
허먼 멜빌 『모비 딕』
20 8펜스짜리 낡은 노란 책 한 권에서 빚어진 문학 유산
로버트 브라우닝 『반지와 책』
21 원조 필리어스 포그는 대통령을 꿈꾸던 철도왕이었다?!
쥘 베른 『80일간의 세계 일주』
22 홈스 탄생을 둘러싼 표절 논란, 그 진실은?
아서 코난 도일 『주홍색 연구』
23 인간 톨스토이와 기독교인 톨스토이의 투쟁기
레프 톨스토이 『크로이처 소나타』
24 아름다운 청년 존 그레이와의 우정 혹은 사랑의 증거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25 모든 것은 한 마리 새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안톤 체호프 『갈매기』
26 미운 선생을 골탕 먹이려던 악의에서 태어난 부조리극의 원조
알프레드 자리 『위뷔왕』
27 아일랜드인들의 공분을 사고 만 도발적인 제목
존 밀링턴 싱 『서쪽 세계의 플레이보이』
28 결혼 생활 15년간 처녀(?)였던 저자가 쓴 성생활 지침서의 고전
마리 스토프스 『부부의 사랑』
29 우드하우스의 취미가 창조한, 완벽한 집사의 대명사
P. G. 우드하우스 『내 집사 지브스』
30 그는 나의 영웅이자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었다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31 잔인한 편집자 에즈라 파운드, 그리고 완성된 예언자의 목소리
T. S. 엘리엇 『황무지』
32 광인의 ‘그것’이 싹 틔운 현대 정신의학의 새 영역
지크문트 프로이트 『에고와 이드』
33 작가가 원치 않았던 제목이 드러낸 위대한 아이러니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34 곰돌이 푸는 사실 백조였다고?!
A. A. 밀른 『위니 더 푸』
35 치명적 부상을 입었던 헤밍웨이의 간절한 바람― 꼭 다시 일어서라!
어니스트 헤밍웨이 『해는 또 떠오른다』
36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이 쾌락을 제게서 숨기셨나이까
D. H. 로런스 『달아난 수탉』
37 호텔 지배인의 못된 버릇이 낳은 걸작
너새니얼 웨스트 『미스 론리하츠』
38 위대한 원작은 때로 우연히 지어진 제목이 만들어낸다
제임스 M. 케인 『집배원은 항상 초인종을 두 번 누른다』
39 이 책을 퇴짜 놓아주신 출판사들에게 바칩니다
E. E. 커밍스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40 수십 년간 인류를 공포에 잠기게 한 숫자 이야기
조지 오웰 『1984』
41 내 머릿속 그림, 동화 속 여행, 그리고 꿈속의 그이
C. S. 루이스 『사자와 마녀와 옷장』
42 그래서 도대체 ‘고도’는 누구인가
사뮈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43 『롤리타』 이전에 또 하나의 롤리타가 있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롤리타』
44 왜 ‘캐치-21’이 아니라 ‘캐치-22’일까
조지프 헬러 『캐치-22』
45 올비도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에드워드 올비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46 아무래도 버지스의 해명이 “시계태엽 오렌지만큼이나 기묘하다”
앤서니 버지스 『시계태엽 오렌지』
47 무책임한 친구에게서 영감을 얻은, 핀터식 ‘탕자의 귀향’?!
해럴드 핀터 『귀향』
48 수컷이라는 성별을 파괴하길 요구한다
밸러리 솔라나스 『SCUM 선언서』
49 천인의 쇠퇴를 드러내는 다섯 가지 징후
미시마 유키오 『천인오쇠』
50 아메리칸드림이라는 환상을 고발하다
데이비드 매밋 『올레아나』
옮긴이의 말 | 책 제목으로 본 짧은 세계 문학사
참고 문헌 및 더 읽을거리
찾아보기
지은이 _ 게리 덱스터Gary Dexter
영국의 작가이자 문학 전문 칼럼니스트.
《가디언》 《선데이 텔레그래프》 《스펙테이터》에 정기적으로 서평을 기고하고 있으며, 《타임스》 등에서 칼럼을 연재했다.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갖춘 작가로,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이어가는 그는 전 세계 각 분야의 저명인사 1만여 명을 망라한 『체임버스 간략 전기 사전Chambers Concise Biographical Dictionary』(2003)의 편찬 책임을 맡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왜 시계태엽 바나나가 아니라 시계태엽 오렌지일까?』(2007)를 비롯해서 이 책의 속편인 『제목 짓기Title Deeds: The Hidden Stories Behind 50 Books』(2010), 작가들에 관한 비평 선집 『독이 든 펜Poisoned Pens: Literary Invective from Amis to Zola』(2009), 직접 거리에 나가 인터뷰를 해 모은 독특한 시 선집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The People’s Favourite Poems: Streets Performing Them to the Great British Public』(2018)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옥스퍼드 약탈자The Oxford Despoiler: And Other Mysteries from the Case Book of Henry St Liver』(2012), 『한밤의 축제를 위한 모든 재료들All the Materials for a Midnight Feast』(2012), 그리고 마리 스토프스의 삶과 1920년대 여성들의 피임권 운동을 다룬 『건강한 여성의 자연스러운 욕망Natural Desire in Healthy Women』(2014) 등의 소설들이 있다.
옮긴이 _ 박중서
한국저작권센터(KCC)에서 근무했고, 출판기획가 및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문학으로의 모험』 『풀의 죽음』 『트리피드의 날』, 필립 K. 딕 걸작선 『발리스』 『성스러운 침입』 『흘러라 내 눈물, 경관은 말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와 배트맨 그래픽노블 『킬링 조크』 『아캄 어사일럼』 『허쉬』 『롱 할로윈』 『다크 빅토리』 『헌티드 나이트』 외 다수가 있다.
■ 장별 요약
01 공화국 The Republic
‘공화국’이라는 제목에는 뭔가 좀 기이한 면이 있다. 이 제목 때문에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이 그리스에서 태동한 민주주의를 다루는 내용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혐오했으며 이 책 또한 민주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
02 유토피아 Utopia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으로, 오늘날 ‘이상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유토피아’. 한 여행자의 보고로 진술되는 이 액자식 소설에서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이상 세계가 그려지면서, 훗날 모어는 원조 공산주의자로 불리게 되는데…… 정말로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일까?
03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Gargantua and Pantagruel
두 부자父子 거인의 그로테스크한 영웅담이 가득한 이 책으로 인해 ‘라블레적’이라는 표현은 추잡함이나 상스러움을 가리킨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프랑수아 라블레가 이 책에서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 제목이자 두 주인공 거인의 이름에 들어 있으니, 그것은 폭음의 즐거움이었다.
04 아스트로필과 스텔라 Astrophil and Stella
영어 소네트 연작의 선구적 작품인 이 책은 저자 필립 시드니 경의 사후에야 세상에 나왔는데, ‘아스트로필’과 ‘스텔라’가 각각 저자와 그의 옛 약혼녀 ‘퍼넬러피 양’을 지칭했기 때문이다. 당시 퍼넬러피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였으니, 즉 이 소네트는 불륜의 사랑을 노래한 암호화 텍스트였다.
05 파우스투스 박사의 비극 The Tragical History of Doctor Faustus
실존 인물 ‘파우스투스(파우스트)’에 관한 기록은 1507년에 처음 나온다. 이후 파우스트 이야기는 점점 신화적인 내용으로 변모했고, 1588년경 크리스토퍼 말로가 쓴 희곡 『파우스투스 박사의 비극』 이후, ‘파우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중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06 햄릿 Hamlet
『햄릿』은 13세기 덴마크 전설 속 ‘암레트Amleth’ 왕자의 이야기를 모델로 삼았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그 기원과 관련해서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바로 『원조 햄릿Ur-Hamlet』이라고 불리는 작품의 유무와,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아들 이름이 ‘햄닛Hamnet’이었다는 사실이다.
07 말피의 여공작 The Duchess of Malfi
17세기 복수 비극의 대표작인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 세기 전 무렵, 이탈리아 ‘아말피 공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에 기원한다. ‘아말피’가 ‘말피’로 변형된 사연, 그리고 존 웹스터가 『말피의 여공작』을 쓸 때 진정으로 말하고 싶어 한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놓는다.
08 최근 아메리카에 나타난 열 번째 뮤즈 The Tenth Muse Lately Sprung Up in America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출간된 이 시집의 저자는 앤 브래드스트리트라는 가정주부로, 제부가 저자 몰래 출판사로 원고를 가져가 간행한 것이었다. 게다가 제목 또한 저자의 동의 없이 지어진 것으로, 이 장에서 볼 수 있듯 시집의 내용은 제목과는 전혀 무관했다.
09 신데렐라, 또는 작은 유리 구두 Cinderella, or the Little Glass Slipper
신데렐라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소재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제목부터 ‘유리 구두’를 언급한 샤를 페로 버전으로, 문제의 신발에 관해서는 ‘털가죽vair’을 ‘유리verre’로 오해한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 장에서는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
10 머리타래 강탈 The Rape of the Lock
알렉산더 포프의 모방 서사시인 이 작품은 18세기 양대 가톨릭 가문 사이에 벌어졌던 처녀 머리칼 강탈 사건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포프가 이 작품을 쓰기 전에 그의 경쟁자인 존 오젤이 타소니의 모방 서사시를 이탈리아어에서 영어로 번역했으니, 그 작품 제목은 『두레박 강탈』이었다.
11 섀멀라 Shamela
헨리 필딩의 『섀멀라』는 새뮤얼 리처드슨의 베스트셀러 『패멀라, 미덕의 보답』의 노골적인 패러디로, 이른바 ‘안티 패멀라’ 장르에 속하는 소설이었다. 한편, 『섀멀라』의 표적은 『패멀라』만이 아니었으니, 바로 당대의 계관시인 콜리 시버에 대한 조롱의 의미도 담고 있었다.
12 패니 힐 Fanny Hill
18세기 중반 영국의 유곽과 뒷골목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 악명 높은 도색 소설은 그 제목부터 음부와 치구를 뜻하는, ‘패니 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주인공을 내세운다. 이로 인해 저자는 외설죄로 구금되었으나, 사실 이 소설의 원제는 평범(?)하게도 『어느 매춘 여성의 회고록』이었다.
13 스위스의 가족 로빈슨 The Swiss Family Robinson
경건한 스위스인 가족의 표류기인 이 소설에서 주인공 가족의 성씨는 ‘로빈슨’이 아니며 심지어 이 가족의 성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19세기 유럽 출판계에서는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서 차용한, 일명 ‘로빈슨계 소설’을 수백여 권 간행했는데, 그중에서도 『스위스의 가족 로빈슨』은 가장 이례적으로 성공한 사례였다!
14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오늘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1931년 작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원작은 이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또한 이 책은 실존 인물에 근거했다는 설이 제기되는데, 메리 셸리가 유부남이었던 퍼시 셸리와 도피 여행을 떠났을 때, ‘프랑켄슈타인성’ 근처에 머물렀던 것이다.
15 커러, 엘리스, 액턴 벨 시집 Poems by Currer, Ellis and Acton Bell
1846년, 출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실패 사례 하나가 일어났으니, 야심만만한 젊은 작가 샬럿, 에밀리, 앤 브론테 자매가 ‘커러, 엘리스, 액턴 벨’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얇은 시집이 단 두 권 팔린 것이다. 각각의 가명은 자매의 실명 머리글자와 똑같이 (즉 CB, EB, AB로) 지어진 것이었는데, 이들이 이러한 가명을 선택한 것 그리고 가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16 포르투갈인의 소네트 Sonnets from the Portuguese
엘리자베스 배럿 브라우닝의 이 시집은 그녀의 남편 로버트 브라우닝과의 저 유명한 연애담 덕분에 오늘날까지 그녀의 대표작으로 남아 있다. 엘리자베스는 ‘창작’이 아니라 ‘번역’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제목을 붙였는데, 그녀가 최초에 제안한 제목은 ‘포르투갈인’이 아니라 ‘보스니아인의 작품을 번역한 소네트Sonnets translated from the Bosnian’였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