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김화영 교수의 번역으로 현대문학에서 새로 선보이는 아름다운 소설『하루하루가 작별의 나날』은 잊고 있었던 흑백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추억에 잠기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이 작품의 나레이터이기도 한 주인공은 열 남매 중 여덟째. 부모까지 열두 명이나 되는 그의 식구가 가난하지만 단란하게 살아가던 시절을 추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전적인 성격이 물씬 풍기는 이 작품의 제목은 주인공이 읽은 샤토브리앙의 글 중 한 구절. 살아간다는 건 익숙한 사람이나 장소와 끊임없이 작별인사를 나누는 것이라는 쓸쓸한 깨달음이 드러나는 제목처럼 50대에 들어선 주인공은 그 동안의 슬픈 작별들을 떠올린다.
저자 : 알랭 레몽Alain Remond
프랑스의 유명 주간지『텔레라마(Telerama)』의 편집국장으로 이 잡지에 이라는 제목의 고정란을 집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사랑에 대하여, 밤에 대하여』(1971)『이브 몽탕』(1977)『내 눈의 기억들』(1993)『당신의 말을 막지 않았어!』(1994)『이미지들』(1997)『하루하루가 작별의 나날』(2000) 등이 있다.
역자 :
김화영 문학평론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문학 상상력의 연구』『행복의 충격』『바람을 담는 집』『소설의 꽃과 뿌리』『시간의 파도로 지은 집』『어린 왕자를 찾아서』 등 10여 권의 저서 외에 미셸 투르니에, 르클레지오, 파트릭 모디아노, 장 그르니에, 로제 그르니에, 레몽 장, 크리스토프 바타이유, 실비 제르멩 등 프랑스 주요 작가들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였고, 『알베르 카뮈 전집』(전18권) 『섬』『뒷모습』『율리시즈의 눈물』『내 생애의 아이들』『걷기 예찬』『마담 보바리』『지상의 양식』 등 다수의 역서를 내놓았다.
책 속으로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내 친구들의 아버지들을 보는 것이 그것이다. 어쩌다가 내 친구들 중 하나를 그의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것 말이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친밀감을 상상한다. 그들은 둘 다 젊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함께 보낸 그 모든 세월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세월을 생각한다. 나는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스무 살, 스물다섯 살에 아버지가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이건 고통이라기보다 오히려 어떤 놀라움이다. 나는 그들이 마치 어떤 영화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본다. 그들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들 두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진다. 삶은, 진짜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다. 그런 삶이 아닌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버지 없이 혼자 사는 것 말이다.--- pp.130-131
나는 하마터면 가질 뻔했던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을 애도한다. 나는 그 부당함이 억울해서 이세상 전체를 저주한다.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니 말이다. 모든것이 너무 늦게 왔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마치 그런 상처가 없기라도 하다는 듯이 행돌하려 할 것이니 말이다. 마치 그런 상처가 없는척, 침묵을 지키면서.
나란히 마련된 그 무덤 셋은 너무나 많은 사랑과 너무나 못다 한 사랑이다. 이제 트랑의 묘지에는 이름셋이 새겨져 있다..... 그 무덤앞에 서서 세 사람의 이름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을 저주한다, 나는 무덤을 저주한다.--- p. 99 / --- p. 164
나는 샤토브리앙이 쓴 그 유명한 [무덤 저 너머의 회상]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대목을 읽는 적이 있었다. 어린 샤토브리앙이 성의 탑실에서 겁에 질려 떠는 장면, 유령 이야기와 나무로 만든 의족 이야기. 정원 저쪽에 있는 성을 너무나 많이 보고 지낸 탓으로 나는 약간 한 가족이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 스스로가 샤토브리앙이라고 느끼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나처럼 디낭에서 공부를 했었다. 나처럼 코르들리에에서 말이다. 나는 그의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읽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콩부르의 숲을 떠나야만 했을 때의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을 표현한 대목이었다. 왜 어린 시절부터 사람은 사랑하는 모든 것과 작별을 해야 하는 것일까? 왜 모든 것들은 허물어지고 마는 것일까? 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일까?--- p.88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나를 괴롭혔던 그것에 비긴다면 그 정도의 우울쯤이야 무엇이겠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게 마련. 트랑에서의 행복, 내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던 그 행복은 거짓이었다. 그 행복의 내부에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적절한 말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 지상낙원의 지옥을 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나는 우리가 트랑에 이사와서 자리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날 두 가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아버지가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죽음이었다. 그것은 작동 중의 죽음이었다.
나는 이제부터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지금 심연의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 아주 오래 전에 쓴 다음과 같은 몇 줄의 글을 내 서류들 속에서 찾아냈다. 그때 나는 그 이야기를 글로 옳겨보라고 노력했으나 오늘까지 한번도 제대로 완결하지 못했다.--- pp.73~74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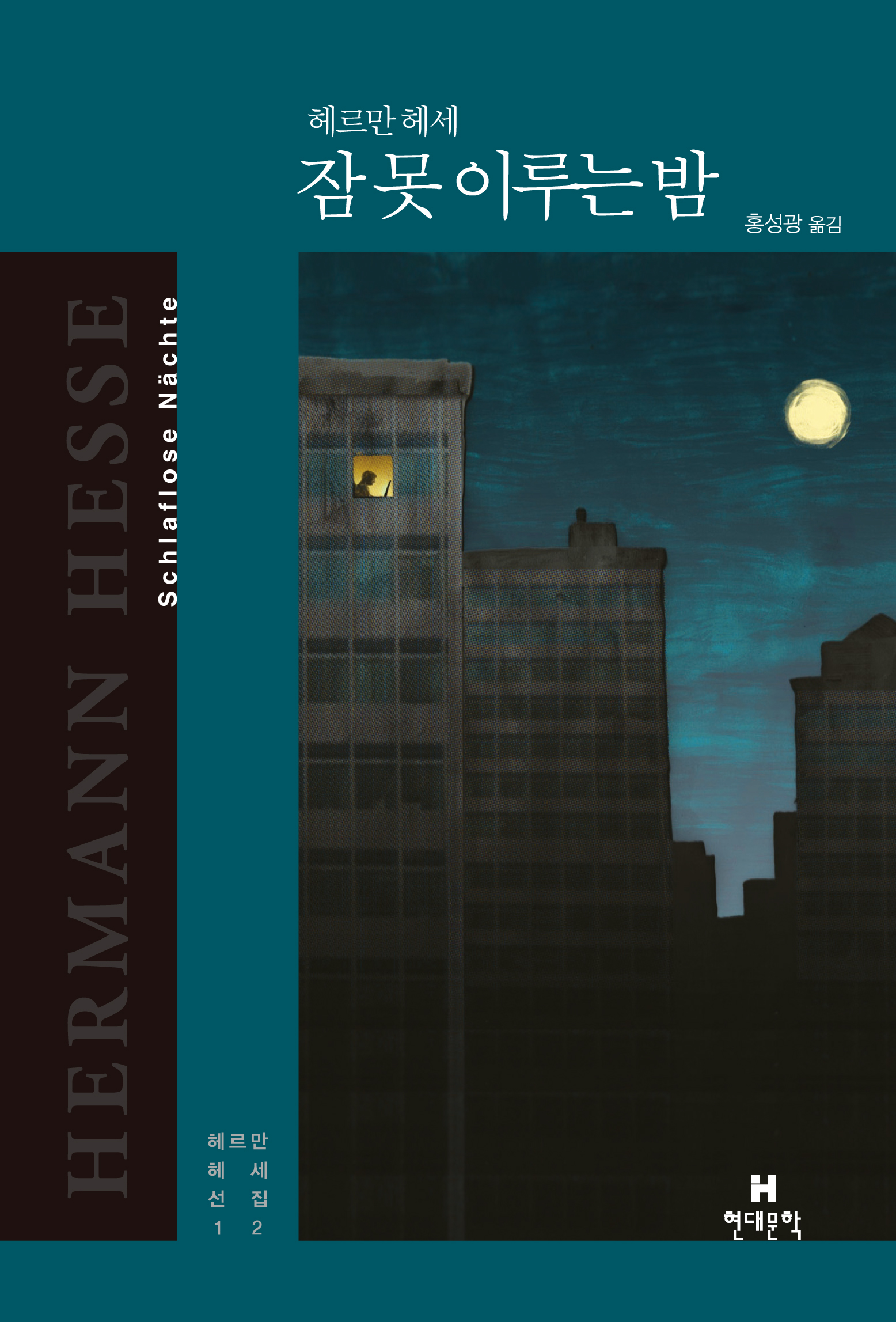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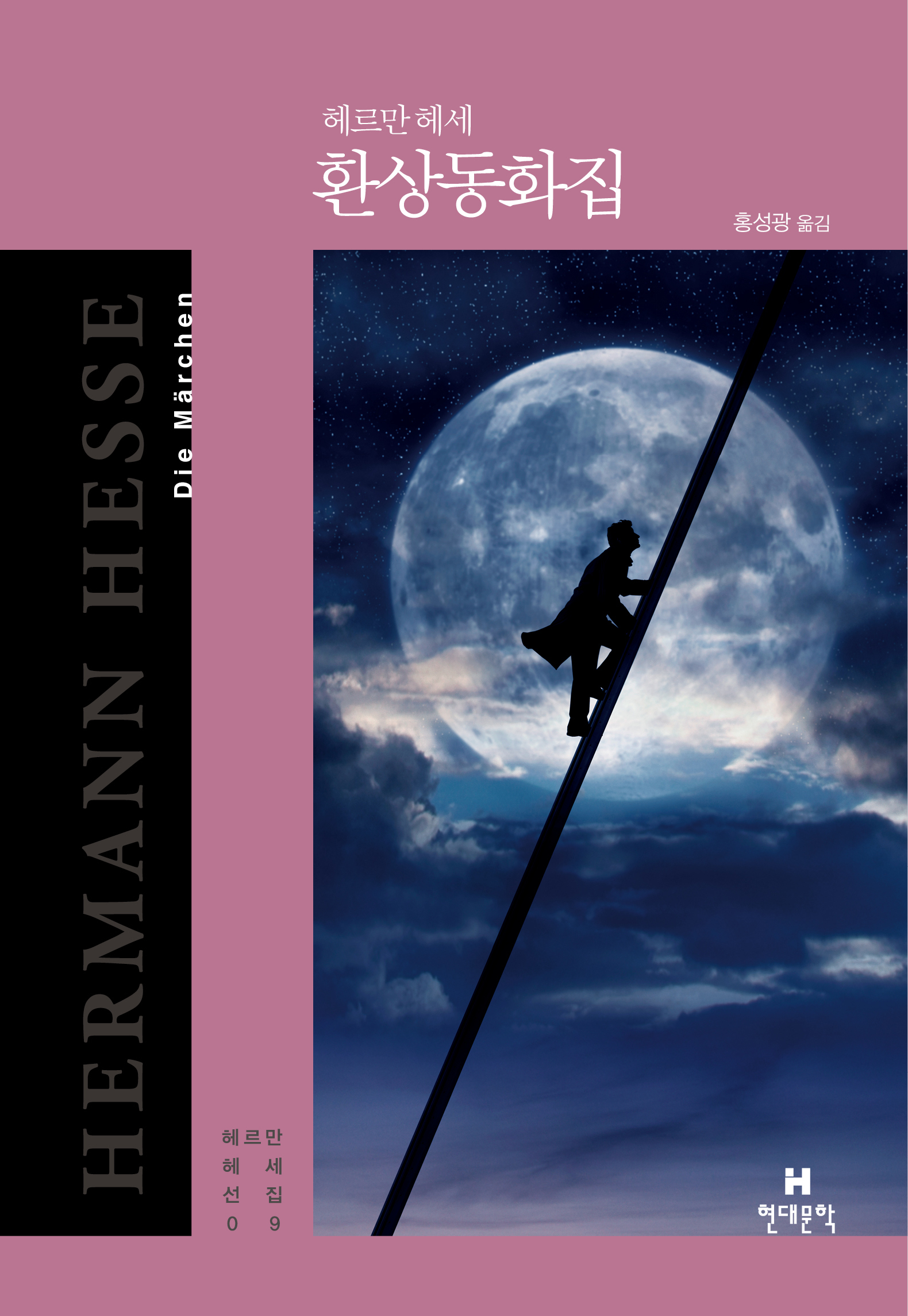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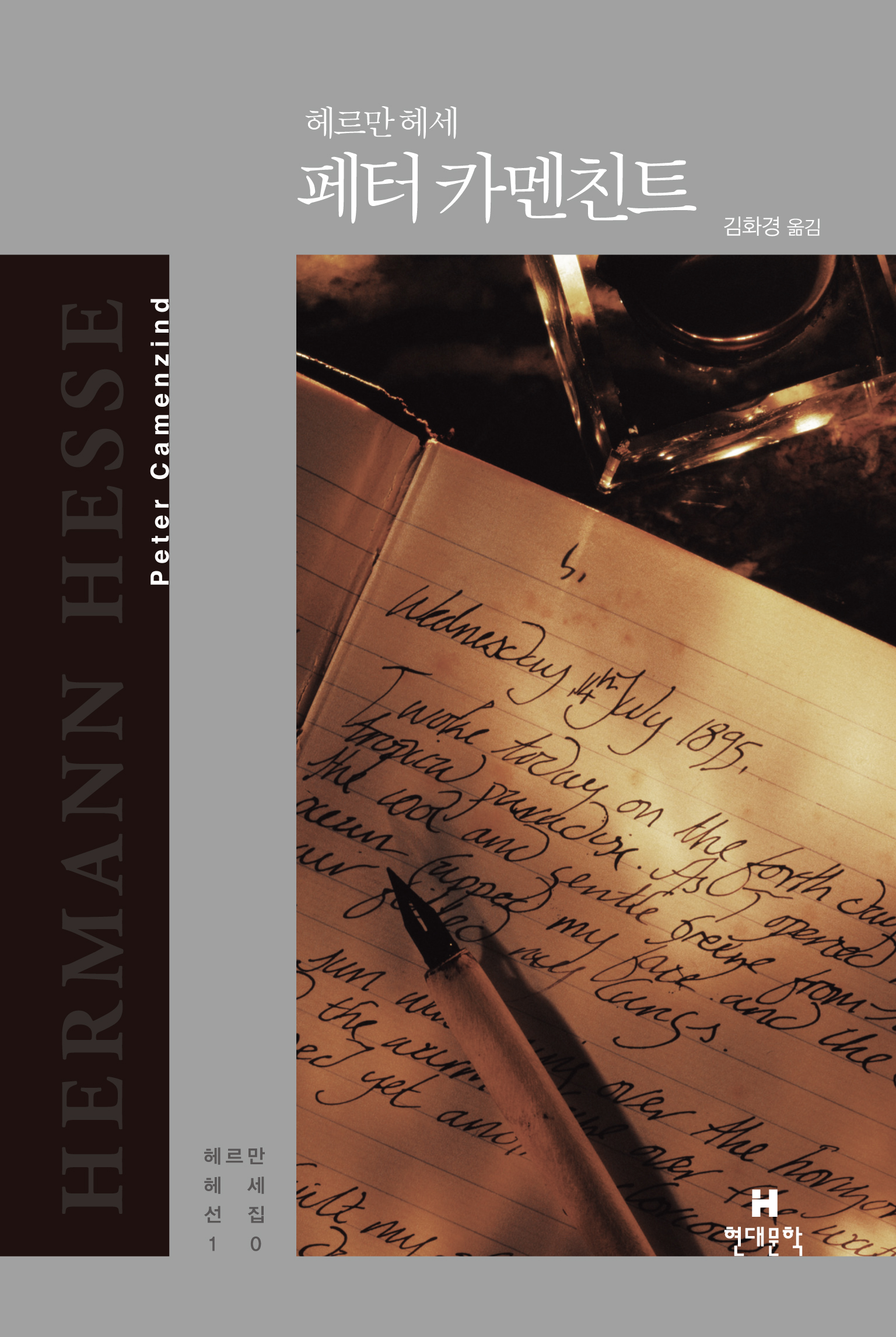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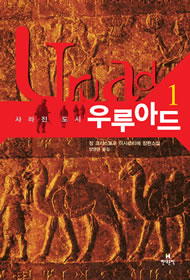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