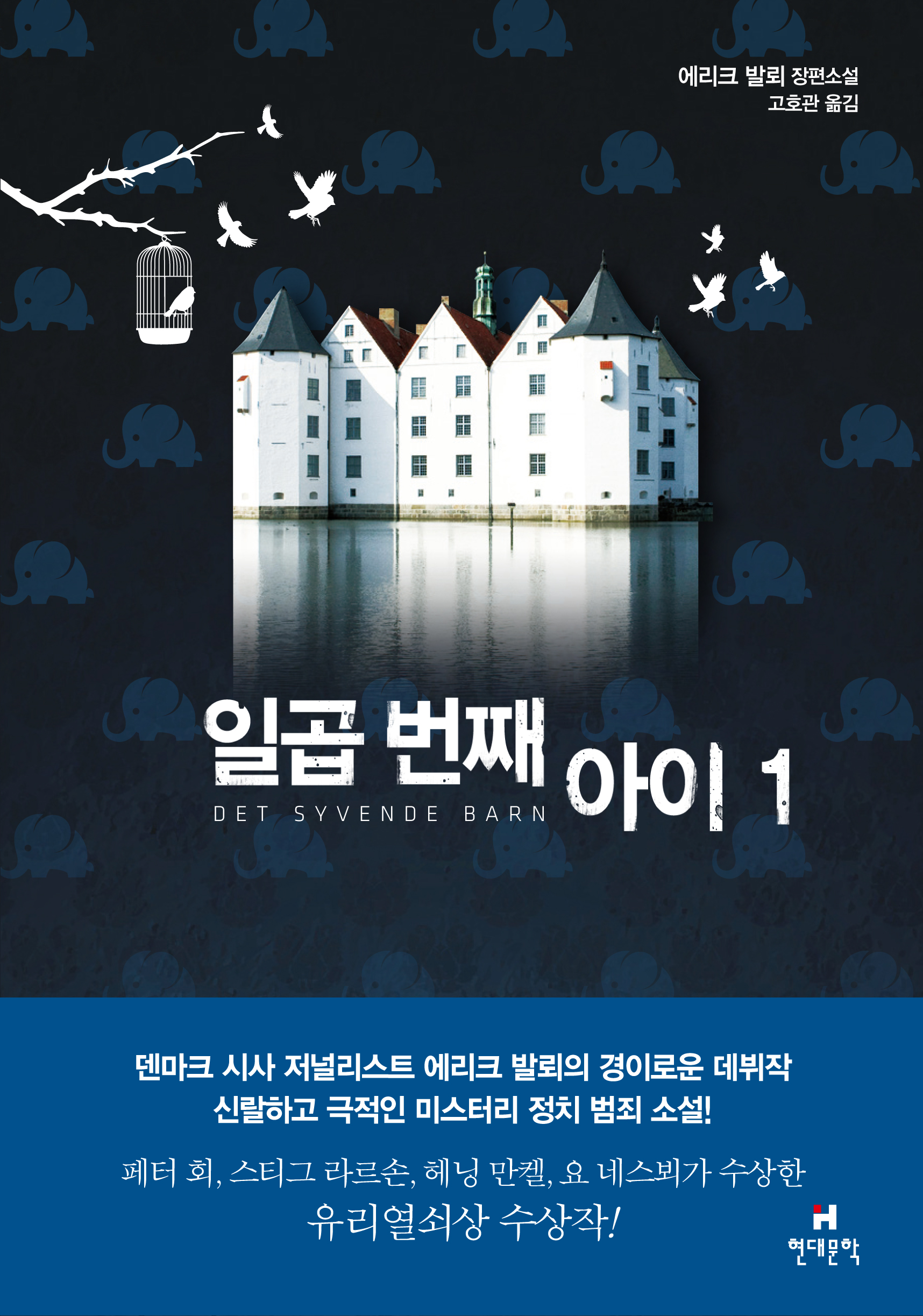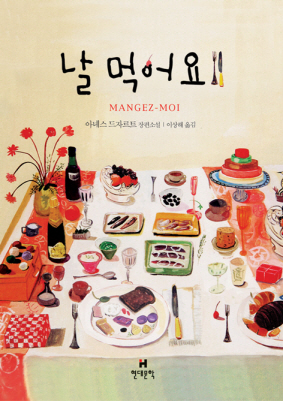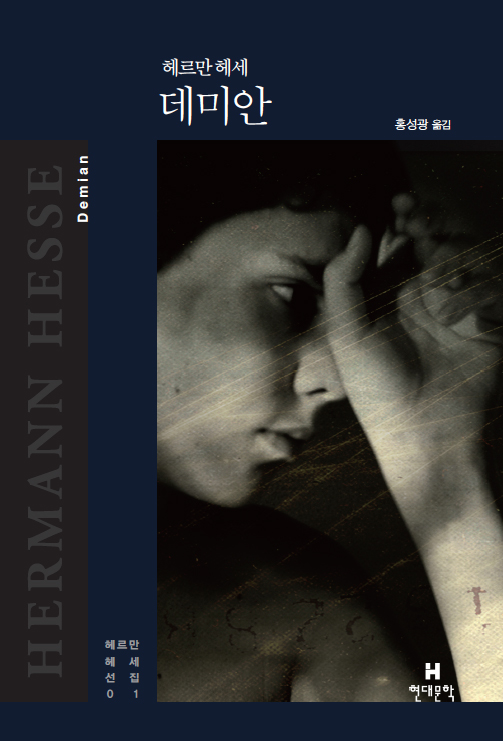나는 물이 밀려들기 전에 벌써 조류를 감지하고 육지로 도망가는 동물처럼 부엌을 나왔다. 본능적이었다. 속이 메스껍지는 않았지만, 돌연 화장실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지난 몇 주 동안 끈적거리는 리놀륨 바닥에 들러붙은 더께를 손가락으로 긁었다. 그것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나보다 더 강력했다.
칠레 이후로는 겪지 못했던 격렬함과 함께 내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공장 냄새가 나는 담즙을 토악질하는 동안, 뒤에서는 방송 시그널 음악의 트럼펫 부는 소리, 진행자가 ‘r’ 발음을 길게 굴리는 소리가 들렸다. 충격파가 새로 밀려와 내 몸은 욕지거리가 속사포처럼 쏟아지듯이 독을 짜냈다. 누가 여기 브리크의 더러운 변기에 머리를 박고 있었나? 누가, 손가락이 미끄러지며 브리크가 아침에 눈 오줌이 튀어 말라붙은 것이 틀림없는 자국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나? 누구인가? 그렇다. 필립 더프리스가 아니라. 프리소 더포스다.
_1부 제1세계, 본문 86-87쪽
‘만납시다.’ 왜? 그가 원하는 게 뭔가? 친구가 되자? 나와 함께 요시프 브리크 팬클럽이라도 창립하고 싶었나? 나는 그 전화에 신경이 곤두섰고 그냥 싫었다. 근본적인 ‘아니요’, 본능적인 거부감이 솟아 나왔고, 감당할 수가 없었다―오래전 헤어진 생부가 전화를 걸어와 내 생일에 당장 오고 싶어 하며,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고, 같이 내 신발을 사러 가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형제였다―그와 내가 같다고, 우리는 같은 ‘브리키언’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구분이 있었다. 단계들. 모두가 늘 브리크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모두는 거리가 다른 여러 편대로 세분되어 있었다―훈타 junta는 동료와 친구, 편집자, 프로듀서, 기자, 박사 학위 과정생, 그리고 하나같이 브리크의 옆에 가겠다고 밀치며 나아가고 있는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는 총사령관으로서 언제 누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주 잘 알았다. 그리고 내게는 무릇 필립 더프리스가 함께 행군했었는지 확실하지도 않았다. 퍽 인기 있는 TV 방송에서 최악으로 선택된 출연자였다는 점 말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치 독일 용어로 빗대면, 나는 그래도 마르틴 보어만이었고, 더프리스는 그래봐야 고작 영화 <서바이벌 런>의 러시아 변소에서 폭사하는 그 네덜란드의 나치 친위대일 터였다.
_1부 제1세계, 본문 130쪽
“아이히만의 재판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치에 관한 개념을 가질 수 있었겠소? 아이히만 없이 우리는 악의 평범성을 알지 못했을 테고, 게다가 한나 아렌트의 그 구절이 비록 번번이 잘못 이해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동적 참여에 대해 알지 못했을 거요. 말랑한 아이히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현란한 악인인 멩겔레만 있는 거지. 목적 없이, 순전히 피학적으로, 자신의 명령에 따라 극악무도한 실험을 했던 의사 멩겔레. 그러고 나서 아이히만처럼 ‘사회의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남미로 가서, 알려진 것만 해도 소녀 두 명이 죽은 불법 낙태 시술에 전념한 남자. 멩겔레 때문에 우리는 국민 감정이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 그리고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그렇게 손쉽고 저항 없이 체계적 범죄를 넘어서는 일에 일부분이 되어 가담할 수 있는지 전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
_2부 필립&프리소, 본문 248-249쪽
나는 내가 말똥말똥 보고 있는 것도 잊은 채, 그렇게 얼마간 앉아 있었다. 어쨌거나 시간이 잠시 흘렀고 호텔 방의 정적이 내게 젖어 들기에 넉넉할 만큼 앉아 있었다. 마취제 같은 평온함.
분명 잠이 든 것은 아닌데도 가물가물 아득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새삼 딴사람인 것처럼, 필립의 침대에서 브리크의 유골을 품에 안고 앉은 모습이 보이다가, 느닷없이 브리크의 흐로닝언 시골집에서 브리크의 유골을 품에 안고 앉은 모습이 보였다. 어찌 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갑자기 그 집 부엌에 있던 나무로 만든 교실 의자에 브리크의 유골을 지니고 앉은 모습을 제대로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정원에 빼곡하게 서 있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들의 시선을 끌며 앞에서 걷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다.
_3부 맥거핀, 본문 365쪽
■ 차례
프롤로그
1부 제1세계
2부 필립&프리소
3부 맥거핀
에필로그
참고 문헌
도판 판권
■ 지은이_요스트 더프리스 Joost de Vries
네덜란드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요스트 더프리스는 1983년 알크마르에서 태어났다. 위트레흐트대학교에서 언론학과 역사학을 공부했으며, 143년 전통의 주간지 《더흐루너 암스터르다머르》에서 2007년부터 문학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해 2009년부터는 예술분야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소설 『클라우제비츠』를 발표, “네덜란드 문학의 전환점”이라는 호평과 함께 안톤바흐터상과 셀렉시즈 데뷔상 후보에 오르며 이름을 각인시켰다. 2013년 발표한 두 번째 소설 『공화국』은 BNG문학상과 리브리스문학상 후보에 올랐으며, 플랑드르 지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황금책부엉이상을 수상했다. 더프리스는 2014년 문학비평 에세이집 『전투회고록』을 발표, 현재는 다음 소설을 집필 중이다.
■ 옮긴이_금경숙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후, 10여 년 동안 도시를 계획하고 집 짓는 일을 했다. 2006년부터 네덜란드 남부 작은 도시 루르몬트에 살면서, 북해 연안 저지대의 다양한 모습을 글로 기록하고, 네덜란드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말로 옮기고 있다. 지은 책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 화가들의 이야기 『플랑드르 화가들』과 네덜란드 생활기 『루르몬트의 정원』이 있고, 옮긴 책으로 『터키 과자』, 『유목민 호텔』이 있다.
네덜란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요스트 더프리스의 장편소설 『공화국』이 현대문학에서 출간되었다. 요스트 더프리스는 2009년 26세에 143년 전통의 주간지 《더흐루너 암스타머르》의 예술 분야 편집장을 맡아 네덜란드 문화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듬해 발표한 첫 소설 『클라우제비츠』가 “네덜란드 문학의 전환점”을 이뤄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소설가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2013년 발표한 두 번째 장편소설 『공화국』은 한 히틀러 연구자의 죽음이 촉발한 한바탕의 소동을 그린다. 스승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후계자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주인공 프리소 더포스는 질투에 사로잡혀 복수를 결심하는데,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한 젊은이의 과감하면서도 사적인 복수극은 거대한 산사태가 되어 여러 사람을 곤란에 빠트린다.
『공화국』은 실존 인물과 허구의 인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이 뒤섞인 한 편의 거대한 농담이다.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둘러싼 유치한 농담과 진지한 연구들, 서로에 대한 시기와 자기애로 가득한 괴짜 연구자들의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현대 지식인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소설의 안과 밖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반된 것들을 어우러지게 하고, 자신의 책이 그 어떤 소설보다 ‘픽션’임을 자각시키는 작가의 글쓰기 스타일은 전 세계 출판 관계자와 평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화국』은 2014년 플랑드르 지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황금책부엉이상’을 수상했으며, 미국과 유럽,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에서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 작품 소개
“사상이 격돌하고 동료와 충돌하는, 지적 싸움으로 가득한 책.
작가는 현재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외양과 실제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접근을 시도한다”_황금책부엉이상 심사평
히틀러 연구학의 독보적인 권위자 요시프 브리크가 갑자기 사망한 후, 잡지 『몽유병자』의 편집장이자 브리크의 정통 후계자임을 자처하던 프리소 더포스는 실의에 빠진다. 브리크가 사망할 당시 칠레의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던 프리소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유일한 멘토이자 친구를 잃은 상실감에 괴로워한다. 학계와 언론은 브리크의 업적을 재조명하며 그의 후계자에 주목하는데, 스포트라이트가 비춘 곳은 프리소가 아닌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필립 더프리스라는 청년이었다. 강렬한 질투에 사로잡힌 프리소는 필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전 세계 히틀러 학자들이 모이는 학회 ‘역사의 종말’에서 필립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로 결심한다.
『공화국』의 주 무대가 되는 ‘역사의 종말’은 히틀러를 연구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히틀러의 식습관부터 콧수염의 모양과 길이, 화가로서의 실력 등 사소한 것부터, 멩겔스와 아이히만, 네오 나치 등 심각한 이슈까지 두루 다루는 그들의 모습은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괴짜에 가깝다. 그들은 지적 유희와 학문적 성취를 구별하지 않으며 히틀러라는 인물이 가진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의 매력과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주저하지 않는다. 요시프 브리크가 세상을 떠난 그해, ‘괴짜들의 축제’로 평범하게 끝날 뻔했던 ‘역사의 종말’ 학회는 가짜 필립 행세를 하는 프리소로 인해 엉망이 된다. 필립의 이름으로 친구를 부추기고, 적을 도발하고, 가짜 약속을 남발하며 불필요한 주목을 끄는 식이다. 여기에 브리크의 유산에 주목한 이스라엘 첩보부의 접근, 나치로부터 오른팔 경례를 되찾으려는 과격파 시민단체가 난입하며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작가 더프리스는 『공화국』을 통해 낭자한 선혈이나 요란한 총성 없이도 스릴 넘치는, ‘지적이고 학술적인 스릴러’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요스트 더프리스의 『공화국』은 하나의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밝고 어두운 면을 풍자하면서, 독재자를 조롱하고 희화하는 과정에서 정작 히틀러가 대중에게 친근한 캐릭터로서 불멸성을 갖게 된 아이러니를 꼬집는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유망한 젊은이가 시행착오를 거쳐 스스로 우뚝 서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펼쳐낸다. 스승 브리크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프리소의 모습, “하나의 왕조가 몰락해야만 성립할 수 있기에 서글픈 공화국”이라는 대사는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혁명을 통해 세워진 공화국의 시작은 한 왕조의 끝을 의미하지만, 결국 공화국의 주인 역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이전 세대 전부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방법 말고는 사랑하는 스승을 떠나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젊은 지식인의 고뇌는 독자의 마음에 묘한 공감을 준다. 현학적이면서 장난스럽고, 묵직한 주제의식을 버텨내는 소설적 재미가 뛰어난 책. 『공화국』은 현대 네덜란드 문학과 젊은 세대 작가들의 저력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추천사
역사, 정치, 학계에 대한 놀라운 풍자. 별난 구석이 있지만 유익하고 매력적인 책이다.
_《리터러리 리뷰>
회오리바람처럼 몰아치는 소설. 짓궂은 스파이 소설에서 사나운 캠퍼스 소설까지 장르를 넘나든다.
_《드모르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지적인 소설이자 견줄 곳 없는 소셜 코미디.
_《낵 포커스》
이 책을 쓰면서 요스트 더프리스가 낄낄거렸을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독자를 미리 파악하고, 그들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알고 있다. 그리고 어디서 끝을 맺어야 하는지도. 그가 이긴다. 『공화국』은 독자를 완전히 사로잡는다.
_《프리 네덜란드》
요스트 더프리스의 책은 거대하고 대담한 스케일의 퍼즐이다. 사색적이고 섬세하며, 명쾌하면서도 신비롭다.
_쾰러 장학금 심사평
사상이 격돌하고 동료와 충돌하는, 지적 싸움으로 가득한 책. 현재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외양과 실제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접근을 시도한다.
_황금책부엉이상 심사평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