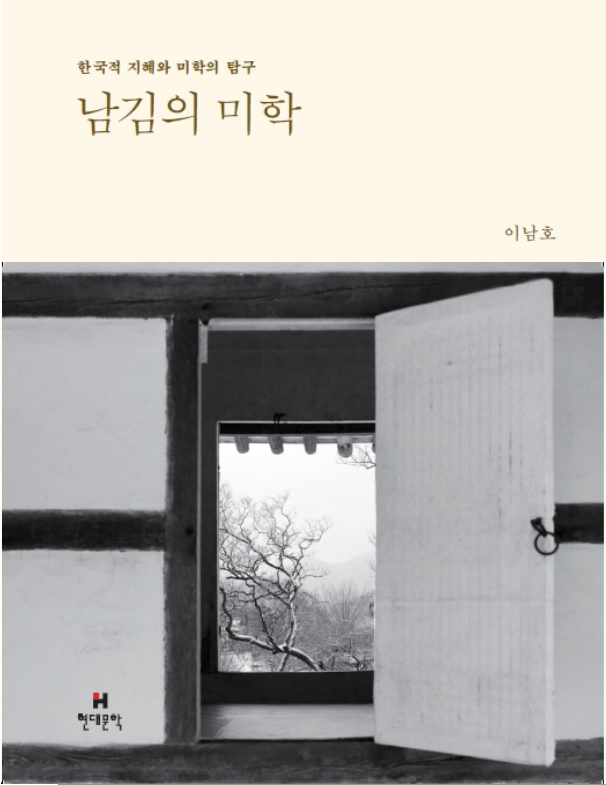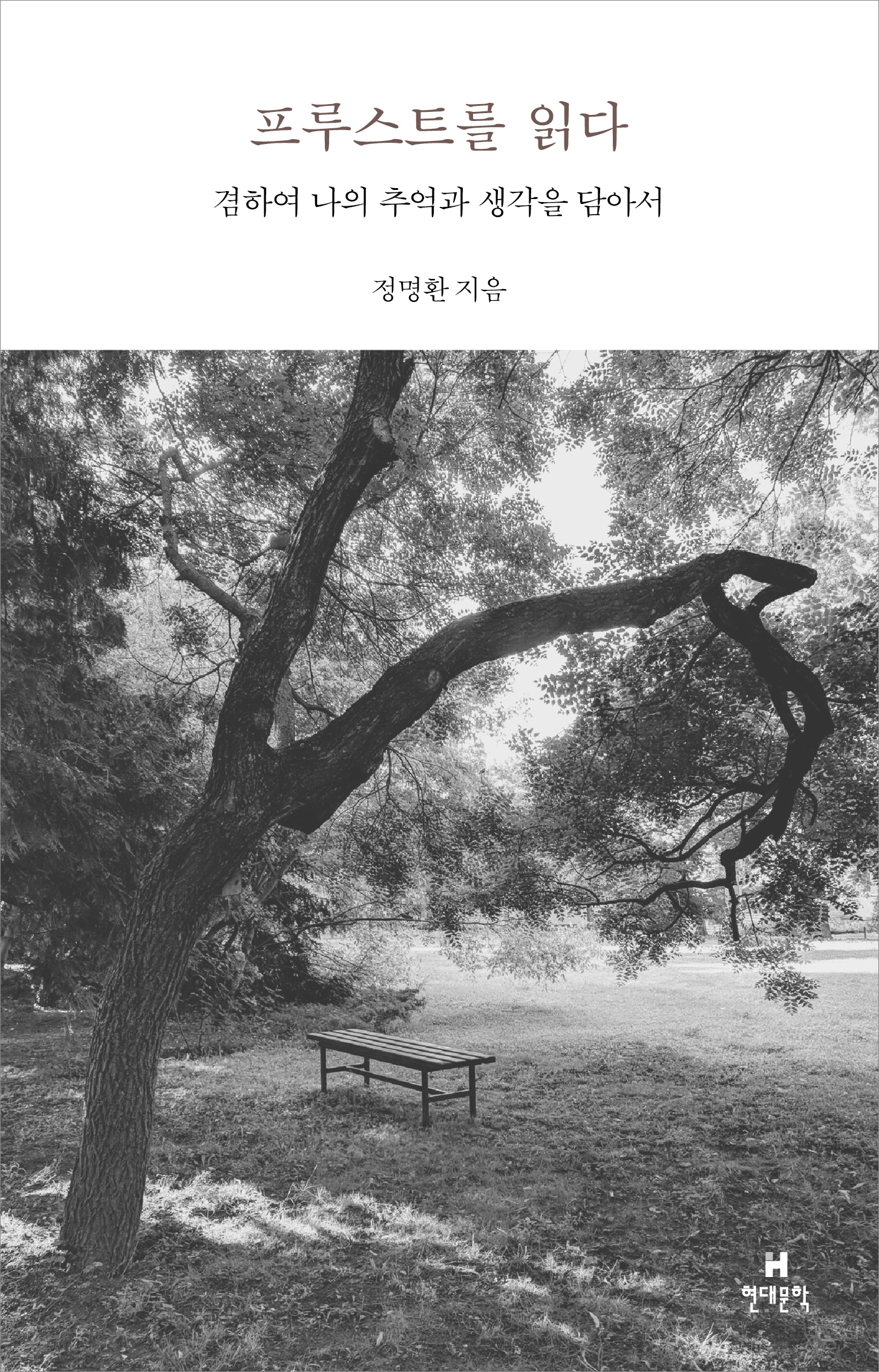바라봄의 치열함을 언어로 바꿔 그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이성복 시인의 사진에세이. 수록된 사진은 제주관광대학 사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오랫동안 제주 오름을 주제로 사진작업을 해오고 있는 고남수의 작품들이다. 저자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름들의 독특한 형상을 담은 스물 네 장의 사진을 통해 사물, 기억, 존재의 비밀을 풀어가고 있다. 오름은 화산 폭발 후 용암이 굳어지며 만들어지는 모양이 완곡하고 단순한 산을 가리킨다. 저자는 이러한 오름의 이미지를 둥금과 여인의 이미지로 표현하며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하는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있다. 사진과 존재들의 숨겨진 부분, 가리워진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카메라 렌즈가 닿지 못하는 부분을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보여준다.
■ 지은이 이성복
1952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1977년 『문학과지성』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뒹구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남해 금산』『그 여름의 끝』『호랑가시나무의 기억』『아, 입이 없는 것들』『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 등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나는 왜 비에 젖은 석류 꽃잎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했는가』『프루스트와 지드에서의 사랑이라는 환상』 등이 있다.
■ 사진작가 고남수
1969년 제주에서 태어나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사진영상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제주관광대학 사진영상학과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사진작업실 '꿈을 찍는 방'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 갤러리 룩스(서울)와 제주아트(제주)에서 <오름 오르다〉로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3 년 벨기에(Brussel)와 네덜란드(Gorinchem)에서 Moving Korea Project 〈Oreum〉전을 가졌으며, 10여 차례의 국내 그룹전을 가졌다.
■ 이 책은 ‘바라봄’의 치열함을 언어로 바꿔 내면세계를 인화해내는 이성복 시인의 사진에세이 『오름 오르다』가 현대문학에서 출간되었다. 책에 실린 스물넉 장의 사진은 현재 제주관광대학 사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오랫동안 제주 오름을 주제로 사진작업을 해오고 있는 고남수 씨의 작품들이다. 스물네 편의 글 중 열두 편은 월간 [현대문학]에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글이고, 나머지 열두 편은 미발표작이다. 오름은 화산 폭발 이후 생겨나는 용암이 굳어지며 만들어지는 산을 가리킨다. 때문에 오름은 산세가 완곡하며 단순하다. 시인은 이 책의 집필을 위해 그런 오름 사진 앞에서 처음에는 막연히 ‘추상’ ‘도형’ ‘물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다가 제주로 직접 가서 몇몇 오름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사진 속의 오름을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오름에 대한 첫인상을 “둥금”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그 둥금에는 “얇다란 종잇장처럼 손가락을 베이게 만드는 금”과 “아귀를 굳게 다문 피조개나 대합조개의 고전주의적 과묵함”이 있다고 말한 뒤, 오름의 그런 정지동작은 오름의 검은 표면에 풀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한 순간의 확인과 동시에... [ 출판사 서평 더보기 ] ‘바라봄’의 치열함을 언어로 바꿔 내면세계를 인화해내는 이성복 시인의 사진에세이 『오름 오르다』가 현대문학에서 출간되었다. 책에 실린 스물넉 장의 사진은 현재 제주관광대학 사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오랫동안 제주 오름을 주제로 사진작업을 해오고 있는 고남수 씨의 작품들이다. 스물네 편의 글 중 열두 편은 월간 [현대문학]에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글이고, 나머지 열두 편은 미발표작이다. 오름은 화산 폭발 이후 생겨나는 용암이 굳어지며 만들어지는 산을 가리킨다. 때문에 오름은 산세가 완곡하며 단순하다. 시인은 이 책의 집필을 위해 그런 오름 사진 앞에서 처음에는 막연히 ‘추상’ ‘도형’ ‘물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다가 제주로 직접 가서 몇몇 오름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사진 속의 오름을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오름에 대한 첫인상을 “둥금”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그 둥금에는 “얇다란 종잇장처럼 손가락을 베이게 만드는 금”과 “아귀를 굳게 다문 피조개나 대합조개의 고전주의적 과묵함”이 있다고 말한 뒤, 오름의 그런 정지동작은 오름의 검은 표면에 풀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한 순간의 확인과 동시에 “오름은 오름이라는 말에서 벗어나 실제의 오름이 된다”며 의미를 반전시킨다. 시인에게 오름의 모습은 여인의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구비진 능선은 한껏 가랑이를 벌린 여인”으로, “붕긋한 배와 처진 가슴을 드러내놓고 잠자는 중년 여인”으로, “부푼 배와 젖가슴 사이로 끼어드는 검은 나무 행렬”로 비쳐진다. 그리고 그것은 “부드럽고 느린 지느러미를 해묵은 슬픔처럼 늘어뜨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오름의 이미지가 이처럼 여성성을 갖는 이유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고통과 함께” 있기 때문이며, 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산고의 고통 없이는 자연이든 예술이든 탄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름을 지나는 외줄기 길의 사진에서 시인은 “차안과 피안”을 본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념 자체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애초에 인간이 구획과 분리의 수단”으로 생각지 않았다면 “피안도 차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구불구불한 또 다른 길의 사진에서는 검은 화면의 그 흰 빛의 길을 “잿빛에 맞서 생명의 눈부심을 지켜내는” “안간힘”의 은유로 읽으면서 “생명의 본질”을 묵상케 한다. 시인은 또한 예술가란 “숨은 그림을 회임할 수 있는 남다른 개방성과 수용성”을 가진 존재라고 정의하면서, “예술가는 숨은 그림의 최적의 숙주”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 말만큼 이 책은 사진과 존재들의 숨겨진 부분, 가리워진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카메라 렌즈의 메커니즘이 닿지 못하는 부분을 언어로 절묘하게 인화해내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입으로 힘껏 고무풍선을 불 때 돌연 의외의 모양이 부풀어오르듯이, 압축된 소리들이 새를 닮은 나무, 나무를 닮은 바위의 모습으로 가까스로 자신을 내밀 때, 둥근 빵처럼 멎어 있던 오름의 평화는 순간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평화의 깨어짐이라기보다는 평화의 일렁거림, 평화의 찰랑거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으리라. ― 본문 18p
평화가 있는 곳 어딘가에는 희생이 숨어 있다. 비유컨대 앞으로 떨어지는 공을 몸을 밀어넣어 잡아내는 야구선수처럼, 높은 데서 떨어지는 아이를 온몸으로 받아안아 뼈가 으스러지는 엄마처럼, 희생은 넘어지는 것과 함께 넘어지는 것이며 무너지는 것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다. 만약 화면 오른편으로 뒤의 오름이 쏠려내려오는 순간, 평탄한 앞의 오름이 함께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화면은 얼마나 단조롭고 쓸쓸할 것인가. 사실 앞의 오름은 뒤의 오름이 쏠려내려오기 전부터, 즉 솟구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받아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 본문 74p
길은 순간적인 숨음과 사라짐을 통해 저 자신과 주위 풍경들에게 숨쉴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마치 아름다운 말이 말과 침묵의 대화이듯이, 아름다운 길은 길과 보이지 않음의 대화이다. 말이 침묵을 통해 깊어지듯이, 길은 보이지 않음을 통해 아늑함과 아득함을 얻는다. ― 본문 97p
결핍이라는 환상 없이 어찌 꿈꿀 수 있으며, 꿈꿀 수 없어 아름다움까지 없는 천국에서 누가 살려 하겠는가. 누가 시체와 공동묘지의 평화를 바라겠는가. 비록 고통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아름다움은 언제나 고통과 함께 있다는 점이다. 환상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환상이 깨지는 순간의 고통 또한 아름다울 수 있으니, 고통과 아름다움은 환상의 배를 찢고 나온 일란성 쌍둥이라 할 만하다. 환상에게서 태어난 그것들은 다시 제 배로 환상을 낳기도 해서, 고통이 낳은 환상과 아름다움이 낳은 환상이 결합하여 또 다른 고통과 아름다움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 지상의 짧은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코 고통과 헤어질 수 없다. ― 본문 117p
모든 인간, 모든 사물을 포괄하는 신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개개의 신비의 오지랍은 그리 넓지 못해서, 갖가지 천 조각으로 이어 붙인 누더기 옷처럼 온 세계는 신비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진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 위해 인간의 육신이 옷을 필요로 하듯이, 고통에 민감한 인간의 영혼에게는 신비의 보호막이 필요하다. 좋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그 투명한 보호막으로 인해 인간은 어두운 밤 그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잠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그러나 그 보호막은 인간의 확신 이상으로 질기고 든든하지는 못해서 인간보다 먼저, 기껏해야 인간과 더불어 사라져버린다. ― 본문 22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