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총총 星々たち
- 저자 사쿠라기 시노 지음
- 역자 양윤옥
- ISBN 978-89-7275-968-3
- 출간일 2019년 02월 20일
- 사양 344쪽 | 127*188
- 정가 13,000원
“일그러졌어도 너무 슬퍼도 인간은 살아간다”
나오키상 수상 작가 사쿠라기 시노의 서정적 매력이 응축된 걸작
■ 책 속으로
지하루가 사키코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가 돌아오는 건, 안 돼?”
자신이 본가에 돌아가는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딸이 물어볼 때까지 알지 못했다. 말로 하고 보니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데 전혀 생각도 안 했었다. 본가에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마음이 든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딸과의 며칠 동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리라. 아빠 없는 아이에게 엄마까지 없는 생활을 여태까지 밀어붙여왔다. 다정한 엄마가 될 순 없어도 말이 통하는 여자는 될 수 있을 듯한 마음이 들었다.
_ 「나 홀로 왈츠」, 42쪽
반찬통을 받아 드는 손가락이 이상한 방향으로 휘어져 있었다. 최근 몇 년 새 관절염이 부쩍 악화되었다. 딸 사키코를 낳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여자 손 하나로 딸과 손녀를 키우며 무리를 했던 게 병의 원인일 것이다. 이제 겨우 환갑을 넘긴 나이일 텐데 뺨이며 손이며 머리칼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나이보다 더 늙은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딸, 그리고 손녀. 옆집에 얽힌 여자들의 나날이 오랜 세월 이쿠코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나마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이웃이었다.
_ 「바닷가의 사람」, 55~59쪽
감쪽같이 어머니의 작전에 걸려들어 이것저것 대답하는 지하루를 보며 식사를 함께했다. 붕붕 들떴다가 착 가라앉았다 하는 연애 기분 따위, 이제 자신에게는 지겨운 짓거리일 뿐이었다.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나, 하고 내심 놀라면서 지하루를 슬쩍슬쩍 훔쳐보았다. 하루히코로서는 자신이 이 여자를 딱하게 여기거나 재회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이상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착착 짜둔 계획에 말려드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남았지만, 그래도 하루히코는 이따금 내보이는 지하루의 웃는 얼굴에 숨을 죽이곤 했다. 어쩌다 한순간, 웃고 있는데도 우는 얼굴처럼 보이곤 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상상해볼 때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이 더해갔다.
_ 「달맞이 고개」, 149~150쪽
야야코의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씻어주면서 기리코는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속담, 엉터리네”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지하루에게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낳은 아이까지 밉다는 느낌은 없었다. 정이라는 감정이 희박한 덕분에 구원을 받는 때도 있다. 성격이 불러들이는 불행이 있는가 하면 행복도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박정한 것은 내 쪽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극적인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었던 듯한 지난 20여 년을 되돌아봤더니 그때그때 나름대로 풍파가 있었던 것 같은 마음도 들었다. 아이를 보고 있으니 지나간 하루하루가 그 색감을 되찾았다. 이 아이에게는 말할 상대가 없다는 이유로 떠나버린 엄마가 있는가 하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반가운 할미도 있다.
_ 「트리콜로르」, 186~187쪽
“지하루 씨, 왜 시를 써보기로 했어요?”
“짧으니까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짧은 편이, 네에, 오히려 어렵지요. 소설은 죄다 설명뿐이잖아요. 시는 응축의 문학이에요. 지하루 씨, 혹시 소설을 써보고 싶은 건가요?”
“네, 가능하다면.”
겸연쩍어할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에게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망설였다.
이 여자, 정말로 소설을 써낼지도 모른다. 느닷없이 도모에의 코앞에 들이닥친 감정은, 공포였다.
_ 「도망쳐 왔습니다」, 222~223쪽
뼈가 도드라진 어깨 끝으로 주지의 팔을 툭 치면서 사키코가 웃었다. 목이 쉰 듯한 웃음소리였다.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건강하게 지내는지 어떤지, 그것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
“저 배우?”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다. 사키코는 아니, 아니, 라면서 뼈와 가죽만 남은 손을 하늘하늘 흔들었다.
“딱 한 번 내가 아이를 낳았었어. 엄마다운 짓은 하나도 못 해줘서 얼굴 마주할 염치도 없어. 그러니까…….”
영화가 끝날 때까지 주지가 알아낸 것은 사키코는 열여덟 살에 낳은 딸이 있다는 것, 그 딸이 같은 동해 쪽인 오타루에서 사는 모양이라는 것이었다.
“도동에서 잠깐 함께 산 적이 있어. 근데 그 애 카드로 대출을 받고 그 길로 도망쳤어.”
그 뒤로 일절 연락도 못 했다고 한다.
_ 「겨울 해바라기」, 241~242쪽
야스노리는 하나둘, 예전에 갈고닦은 인터뷰 질문법을 구사하여 그녀가 걸어온 길을 물어보았다. 여자도 왜 자신에 대해 그토록 궁금해하는지 의아해하는 일도 없이 찬찬히 대답해나갔다.
그때그때 여자와 관계를 맺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야스노리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상像으로 나타나고 언어와 함께 흘러나왔다. 문득 깨달은 것은 여자가 모든 일을 지극히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건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미심쩍을 만큼 그녀는 담담히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았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댄서 시절에 만난 선배네 카페에서 일했어요.”
“결혼은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 딸을 낳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과거라기보다 그 모든 것은 단지 ‘정보’일 뿐이었다. 그동안 접해온 사람과의 관계를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지금 즉시 메모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태연한 척하면서 여자의 요점 정리 같은 과거를 귀에 새기고 가슴속에 차곡차곡 담았다.
_ 「허수아비」, 291~292쪽
별이 총총, 이라고 표지에 적힌 제목을 입 속에서 중얼거리며 하늘에 가득한 별을 떠올렸다. 야야코의 가슴 안쪽에서 별들은 모두 똑같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났다. 몇몇은 흘러가고, 그리고 몇몇은 사라진다. 사라진 별에도 한창 빛나던 날들이 있었다.
어제보다 숨쉬기가 편해졌다.
나 또한 작은 별 중의 하나.
야야코에게는 표지의 파란색이 맑은 밤하늘로 보였다. 미더운 데라고는 없는 공기 방울 같은 별들을 하나하나 이어가면 한 여자의 상이 떠오른다. 그이도 저이도 목숨 있는 별이었다. 밤하늘에 깜빡이는 이름도 없는 별들이었다.
_ 「야야코」, 327~328쪽























.jpg)

.jpg)
.jpg)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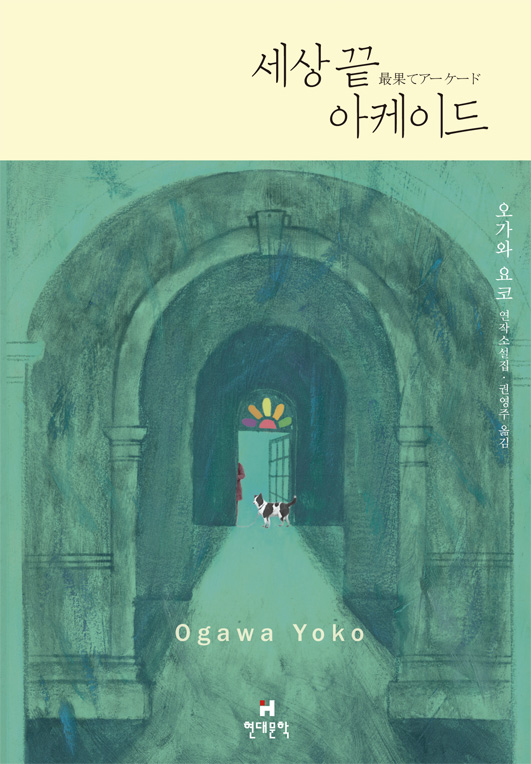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