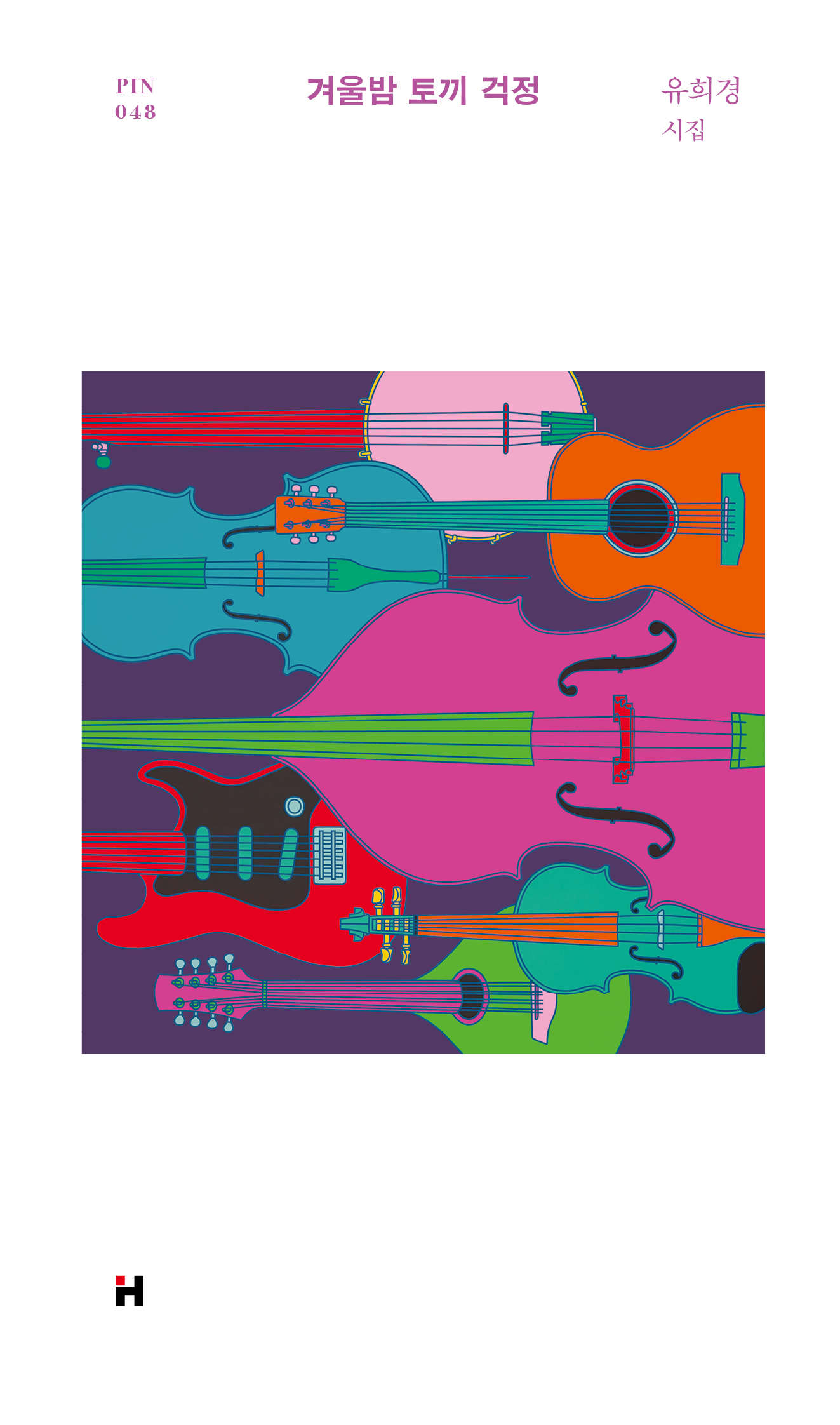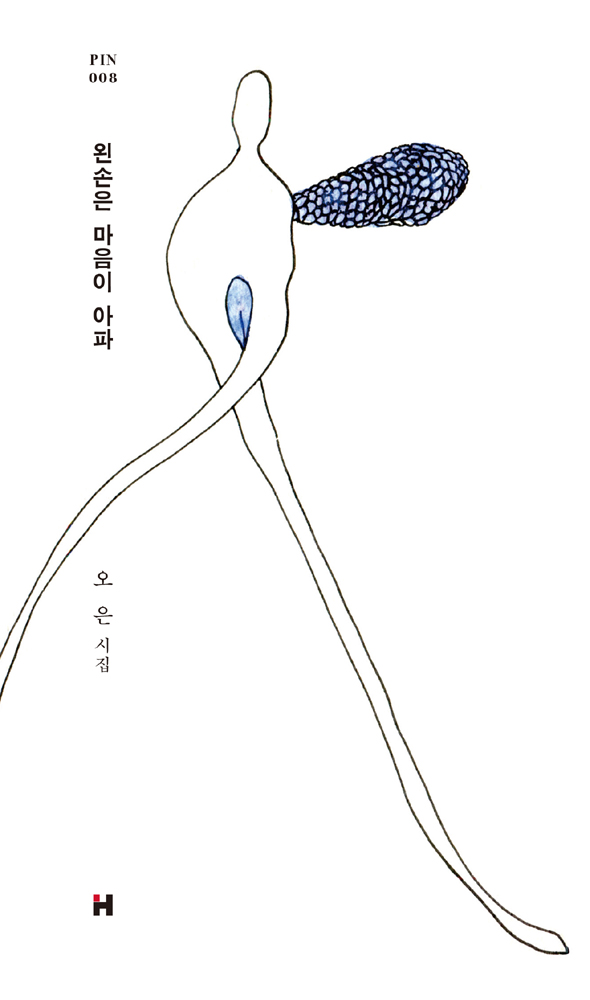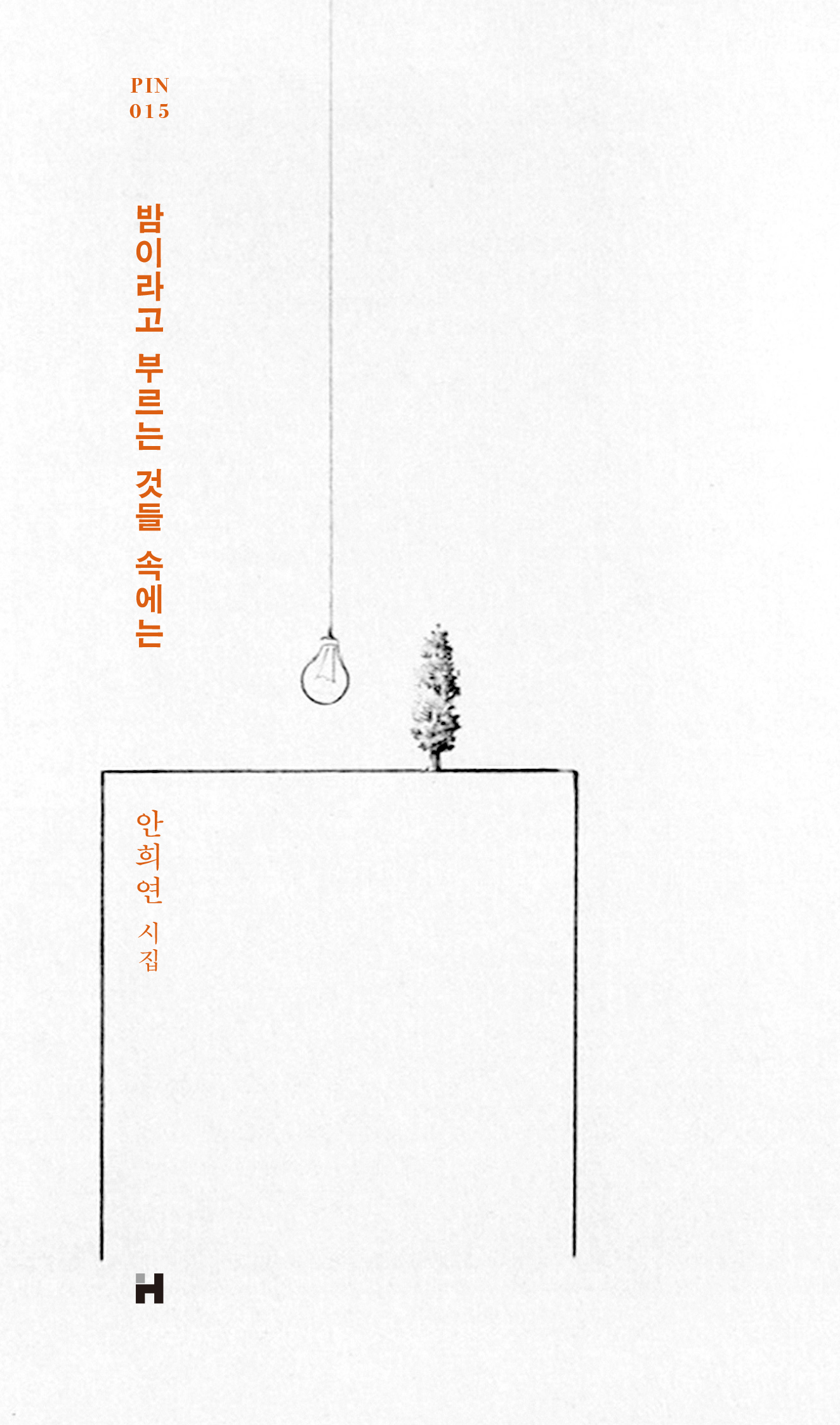문학을 잇고 문학을 조명하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한국 문학 시리즈인 <현대문학 핀 시리즈> 시인선 마흔여덟 번째 시집으로 유희경의 『겨울밤 토끼 걱정』을 출간한다. 낯선 감정을 섬세하게 노래한 시 37편과 이야기를 지어내는 괴벽과 미몽이 불러내는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이야기’에 관한 에세이 「이야기, 나의 반려伴侶」를 싣는다. 유희경 시인의 이번 시집은 2년 만에 선보이는 다섯 번째 신작이다.
I
이야기─원형
이야기─겨울밤 토끼 걱정
이야기─겨울의 모자
이야기─벽돌이 많은 커피숍
이야기─너는 단지 네 불행만을 알 뿐이다
이야기─금
이야기─피를로에 대하여
이야기─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특별한 모습의 희생자다
이야기─차선 긋는 사람들
이야기─水紋
이야기─조용히, 심지어 아름답게 무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삼월 밤
이야기─사월 사 일
이야기─손바닥만 한 사진 한 장
이야기─지독하게 추웠던 어느 밤 토끼와 고슴도치─이야기
이야기─떨어진 것은 동전이다 그것은 좁은 소리를 따라 굴러갔으며 동그랗고 부드럽게 흔들리다가 마침내 멈추었다
II
이야기─사월 만월
이야기─확장
이야기─밤의 운동장
이야기─이야기
이야기─늙은 몸
이야기─감기
이야기─꾀꼬리 인형
이야기─나의 오후
이야기─한밤의 택시
이야기─믿음
이야기─늦여름 아니면 초가을
이야기─대가
이야기─그것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
이야기─책에 파묻힌 사람
이야기─반복이 아닌 반복 이전에 반복 없이 존재하는 반복의 기원 같은 것
긴 사이─이야기
이야기─우리는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에 휩쓸려 다닐 뿐이지요.
이야기─겨울 숲의 이야기들
이야기─만단정회萬端情懷
이야기─해제
에세이: 이야기, 나의 반려伴侶
유희경 시집 『겨울밤 토끼 걱정』
유희경 시인의 이번 시집은 모든 시에 ‘이야기’라는 하나의 제목을 부여하며 부제로 각각의 이야기에 설명을 덧붙이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무수한 이야기를 상상하고 기억을 끌어내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가닿으려 노력하는 시인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유발하는 낯선 감정을 섬세하게 발견”하고, ‘나’라는 주어를 앞세워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거나 숨어 있으면서 그 발견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증명하기 힘들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세상의 일들을 유희경 시인은 선뜻 공감하기 힘든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나간다”(김복희)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희경 시인의 ‘이야기’는 할머니가 타래에서 실을 뽑으며 노래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할머니의 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나’는 할머니의 노래를 되새기며 아득한 추억을 떠올려본다. ‘나’는 늙은 나무가 “가을이 되면 저 위태로운 각도의 잎들을 모두 벗고 중심의 방향을 드러”(「이야기─원형」)내기를 기다린다. 화자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불러준 노래처럼 생경하고도 선명한 장면을 불러일으키며 이야기의 중심으로 나아간다.
시집에는 기억, 상실, 그리움의 심상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 화자는 창밖을 보며 가로등 아래에 토끼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뜻 보기에 버려진 빵 봉투 같은 토끼에 대고 “저것은 토끼가 아닙니다 저것은 토끼가 아니에요”라고 외쳐보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결국 ‘나’는 “너무 추운 것은 아닐까 토끼는 무사한 것일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토끼를 걱정하게”(「이야기─겨울밤 토끼 걱정」) 된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시에서도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 때문에” 생긴다. 그 전모를 알거나 운다고 해서 해결될 리 없는데도 화자는 운동장 한복판에 서서 기울어지는 사방을 확인하며 사건을 더듬어본다. 너무나 사소한 일로 생겨난 사건은 점점 축소되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사실도 알 길이 없다. “그러니 누구도 전모를 알 수 없는 것이다.”(「이야기─밤의 운동장」)
이야기는 불완전한 기억, 이해, 언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화자는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란다. 저기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기 위해, 사실과는 다르지만 자신이 바라는 내부의 모습을 이해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도 나의 어깨를 툭 치지 않았으므로 내게 무슨 일이냐 묻지 않았으므로”(「이야기─지독하게 추웠던 어느 밤」) 겨울밤의 간절함만이 남아 상상을 거듭하게 된다. 유희경 시인의 ‘이야기’는 꿈속 사람이 실을 푸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꿈속 사람은 “그것이 시름인지 감탄인지 알 수 없어서 감고 감고 또 감고 있었다.”(「이야기─만단정회」) 화자는 그것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가위를 건네, 이야기를 여기서 툭, 끊어지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가 끊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유희경 시인의 이번 시집은 모든 사건이 시와 마주치는 순간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며 끊임없는 자기 고백을 통해 이야기와 하나 되는 경험을 전달한다. “이 시집 속 시들이 당신 어딘가를 어둑하게 만든다면” 그저 어둑함 위에 “하얀 점 하나를 밝혀둔다면 기쁘겠”다는 유희경 시인의 바람처럼 그의 작품은 우리의 마음에 환한 빛을 밝혀줄 것이다.
핀 시리즈 공통 테마 <에세이>_‘반려’
유희경 시인은 에세이 「이야기, 나의 반려」에서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괴벽”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한낮에 미몽과 같은 상태에 빠질 때마다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가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린다. 가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어머니, 낡은 카메라를 물려준 외조부, 독특한 별명을 지녔던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구멍이 존재한다. 유희경 시인은 그 구멍들을 상상으로 채우며 낮을 보내고, 밤에는 혼자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듬는다. 그에게 밤은 온전히 이야기를 위한 시간이며 “오직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상상한다.
유희경 시인은 시를 쓸 때 자신의 “이야기를 소진해가고 있다”고 느낀다. “첫 문장은 언제나 쥐어짜낸 어떤 것”이라고 여길 정도로 형체가 없고 앙상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마르지 않고 앞의 이야기가 뒤의 이야기를, 그다음 이야기를 끌어준다. 이야기를 다 소진하고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말한다. 사건이 펼쳐질 당시에 존재했으나, 놓치고 상상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재구성하며 문학의 본령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마지막 이야기를 상상하는” 사람이다. 에세이 「이야기, 나의 반려」는 서정적인 언어로 특별함을 기록하는 그의 시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주는 아름다운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