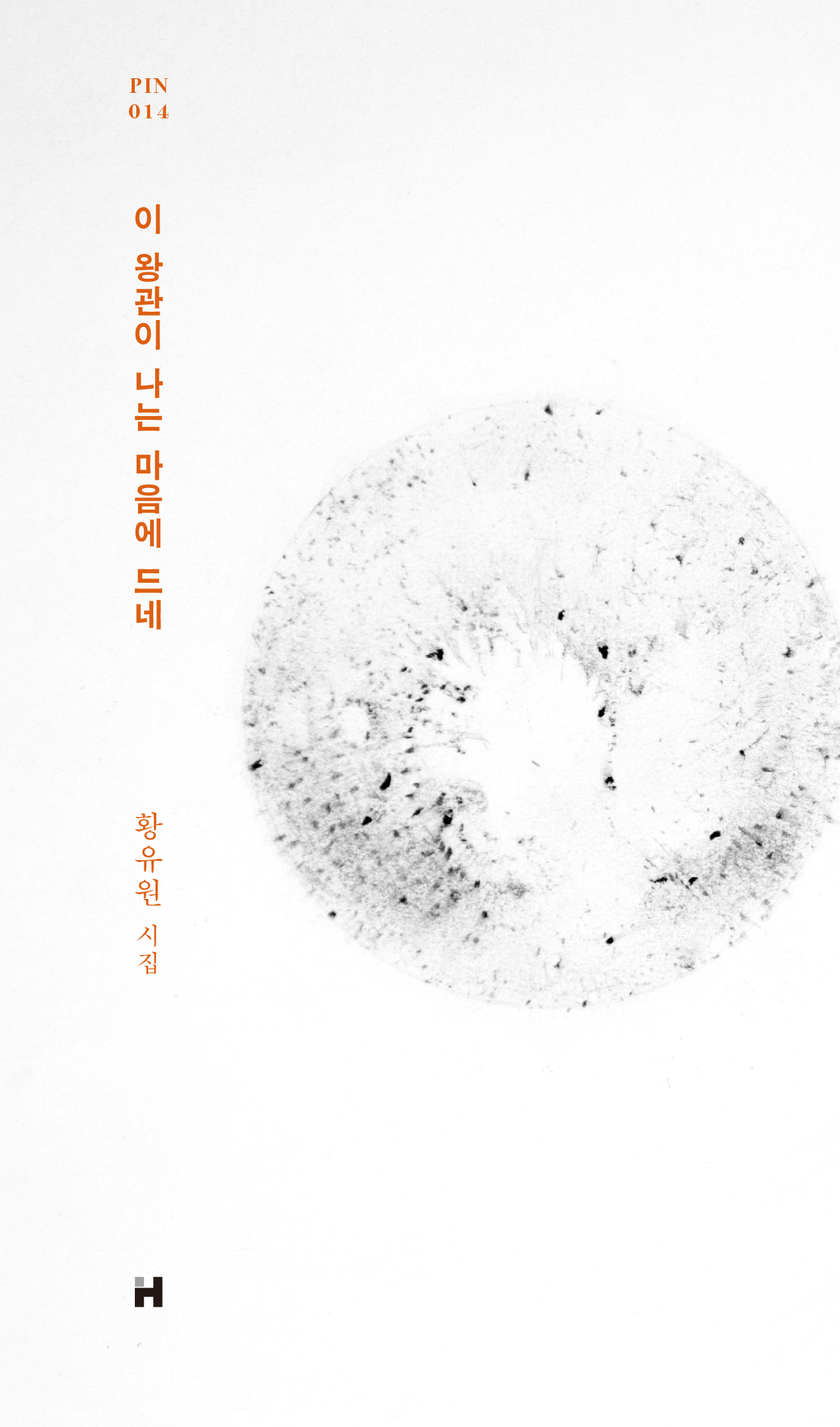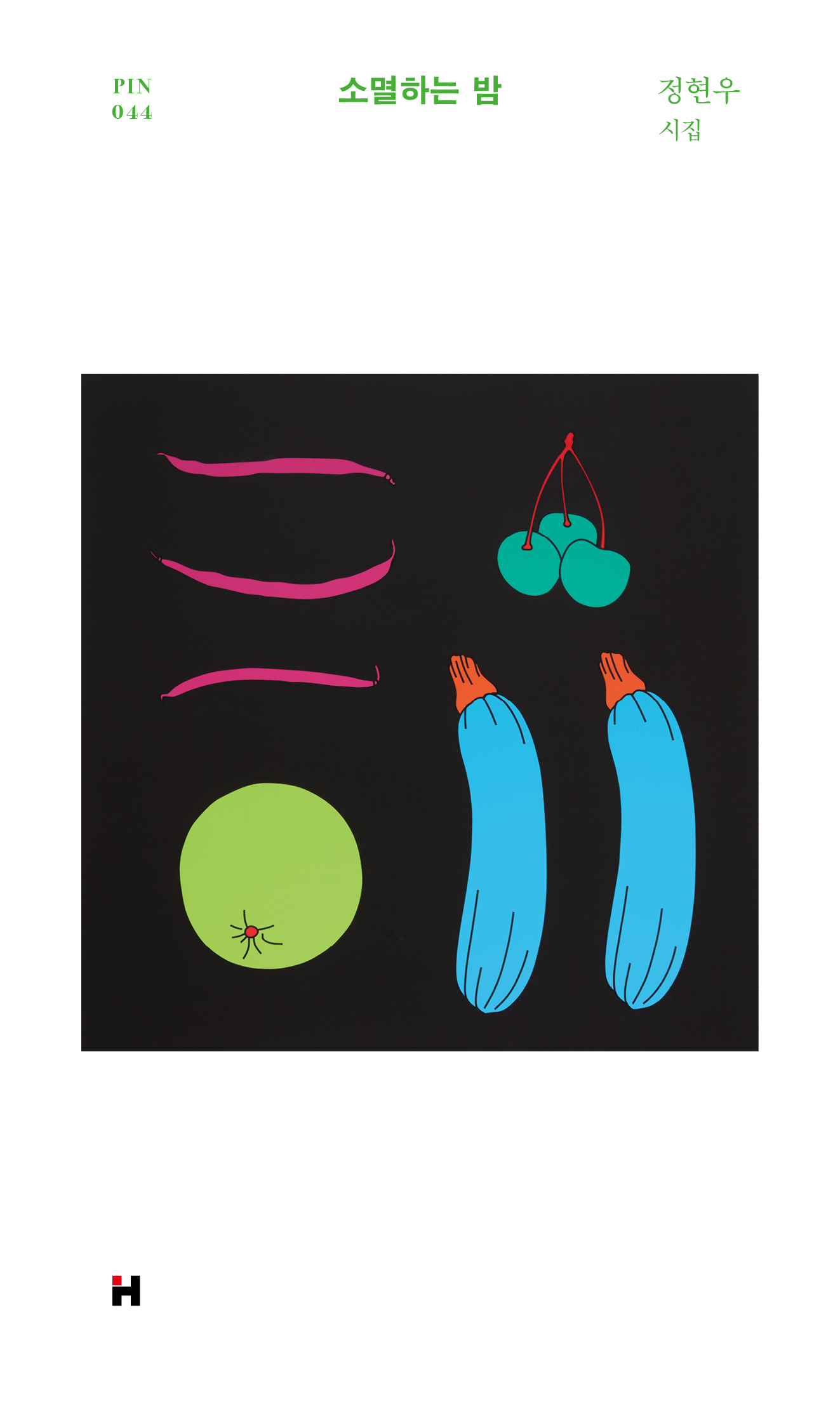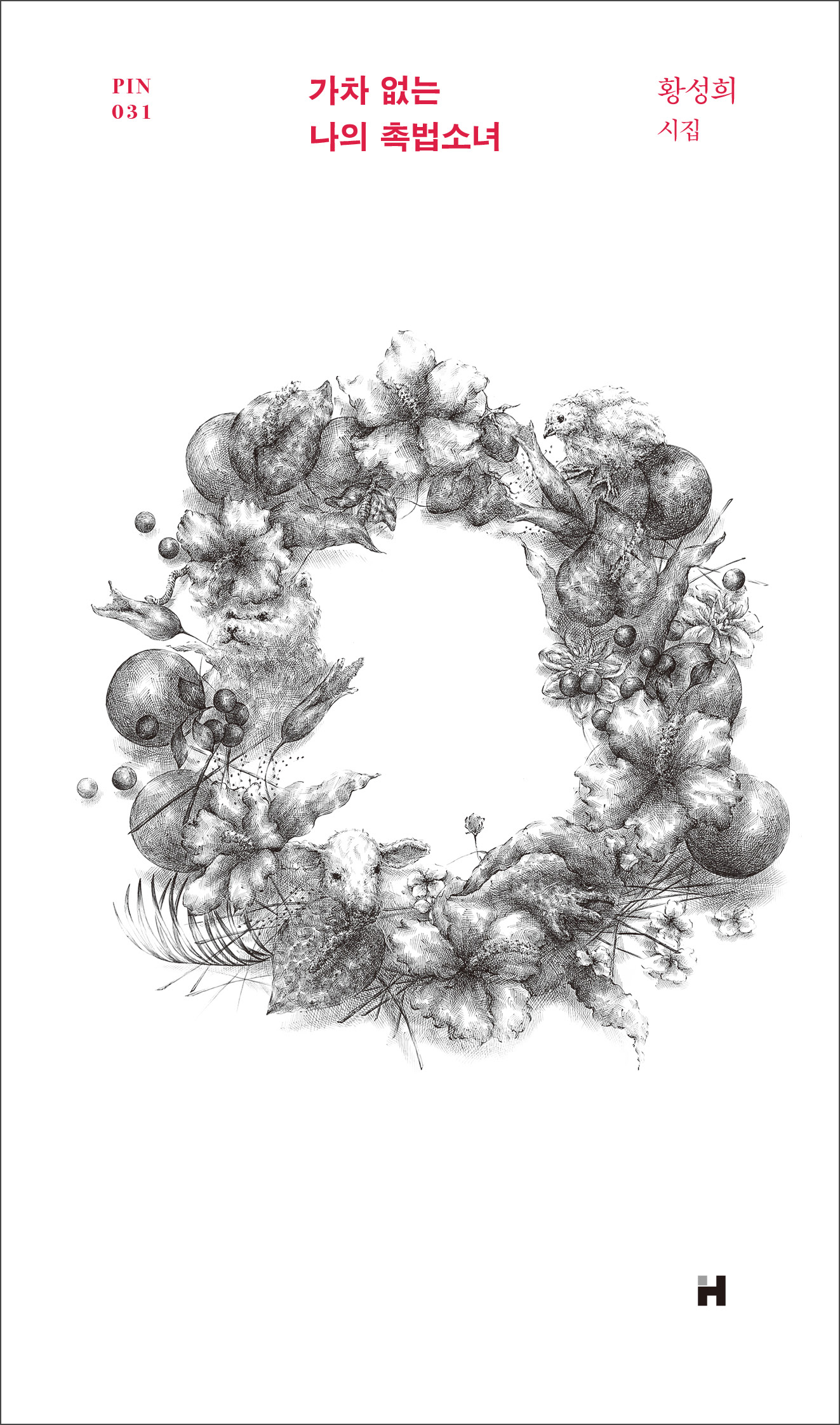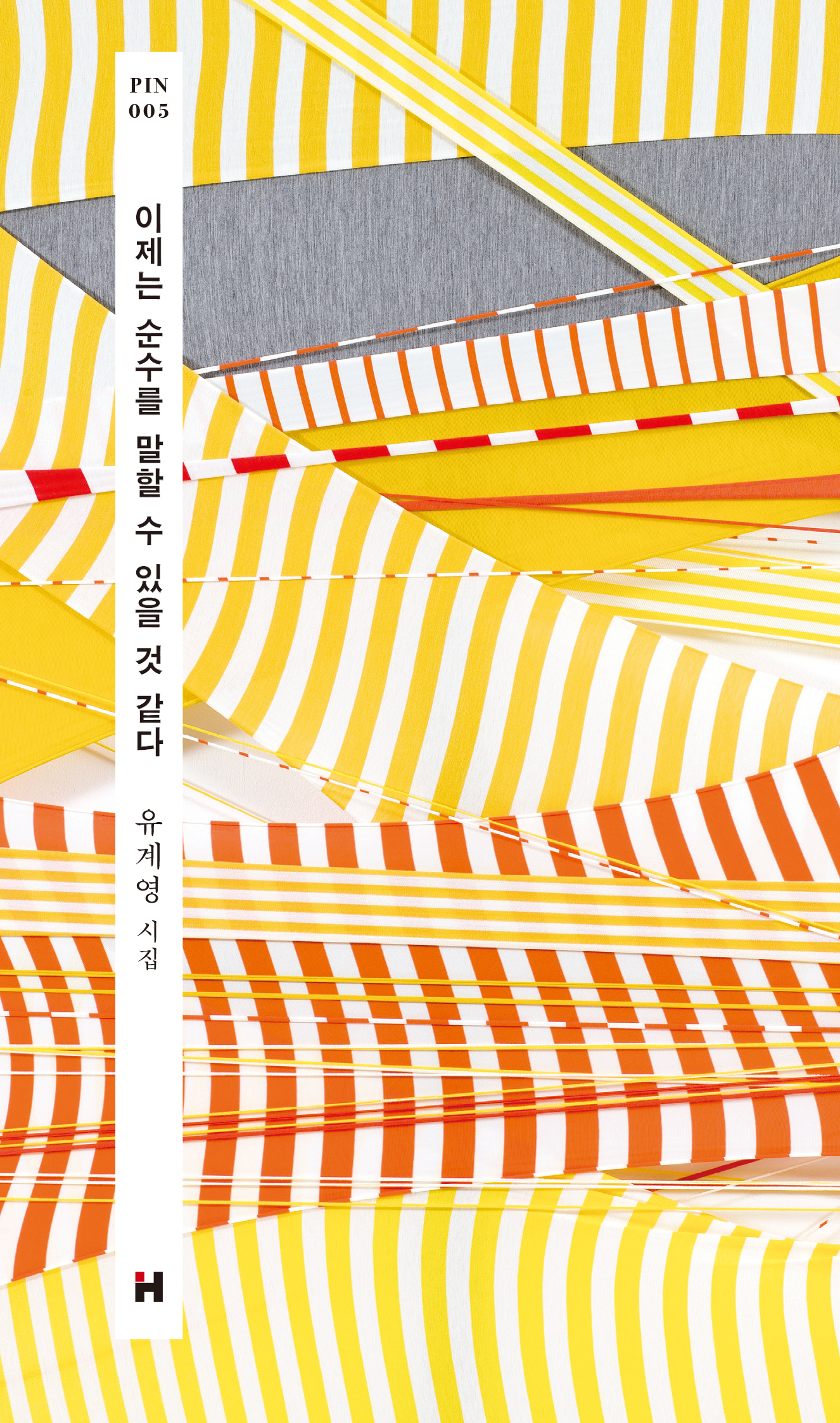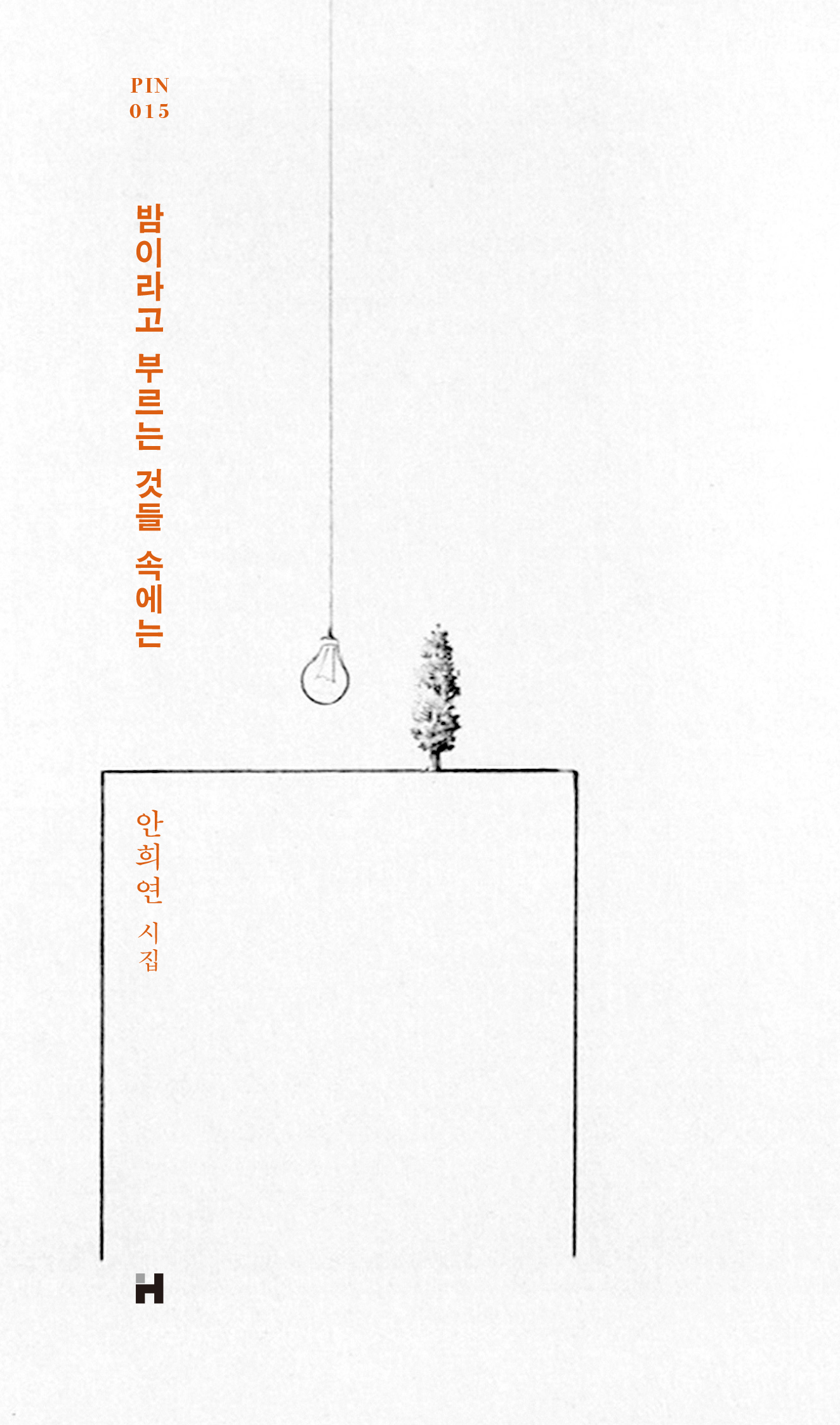문학을 잇고 문학을 조명하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한국 문학 시리즈인 <현대문학 핀 시리즈> 시인선 쉰두 번째 시집으로 김이강의 『경의선 숲길을 걷고 있어』를 출간한다. 2006년 『시와세계』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이강 시인이 네 번째로 묶어낸 이번 시집에는 도시 산책자가 보고 느낀 풍경을 간결한 언어로 빚어낸 시 17편과 느슨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두 사람의 우정을 그린 에세이 1편이 담겨 있다.
세계적인 ‘숯의 화가’ 이배 작가의 표지 작업과 함께해 예술의 지평을 넓혀간 『현대문학 핀 시리즈 VOL. Ⅷ』은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한국 시 문학이 지닌 진폭을 담아낸 민구, 구현우, 이서하에 이어 김이강의 개성을 담은 이번 시집으로 마무리 된다.
시간과 공간, 기억까지도 초월하는
산책자의 걸음걸이
김이강의 네 번째 시집 『경의선 숲길을 걷고 있어』는 도시의 산책자가 거니는 발걸음을 천천히 따라가는 산책 시집이다. 김이강의 산책자들을 따라 시를 읽다 보면 우리 역시 시인이 이끄는 풍경 속의 산책자가 되어 여정 없는 길을 걷게 된다. 걷다 보면 우리의 발자국 위로 돌연 기묘하고 낯선 무늬가 새겨진다. 익숙한 풍경에 실금이 가고, 그 균열이 점점 커져가고 깊어질 때쯤 어두운 틈 속으로 한줄기 빛이 든다. 그리고 시인이 초대한 빛 속에서 우리는 “해가 근사하게 들어오는 카페”(「로터리에서 7시 방향」)를 향해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기억은 홀로 증명되지 않는다”
“증거가 있다면 너와 나, 서로일 뿐이겠지”
시인에게 ‘걸음’은 시의 근간을 이루는 특별한 행위이며, ‘걷는다’는 행위는 자연스레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으로 연결되는데 시인은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걸으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시적 장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한파 때문에 한산한 이대 앞 거리”에서 “여름의 셔츠들”을 구경하는 이상한 계절. 겨울과 여름이 한 문장에 나란히 놓이자 익숙한 “이대 앞 거리”는 돌연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장소가 된다. (「우리 어째서 한 번에 23초까지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그곳에 가져갔을까?」) 「서점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문제」에서도 “바다”에서 “서점”을 거쳐 바다가 없는 “은평구”로 이동하는 화자의 여정이 마치 ‘순간이동’처럼 예측 불가능하다. 그 예측 불가능성이 “‘서점’에서 ‘출발’하여 ‘마을’에 ‘닿는다’라는 네 낱말 사이의 결속을 비집고 들어서면서” (최가은)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솔직담백한 시어로 ‘시와 일기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는 평을 받은 시인은 이번에도 특유의 일상적인 요소와 사적 언어로 내밀한 마음을 표현한다. 일기를 쓸 때 자신이 기억한 것만 일기장에 쓰듯 시 속의 등장인물들도 제각기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 「그건 바람이었어」 「로터리에서 7시 방향에서」등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배반하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객관적 진실’로 독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실에 구속당하지 않는 시. 그의 시에서 서사의 객관적 진실은 중요치 않다. ‘진실 아님’은 ‘거짓’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이강의 시는 그런 이분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화자는 대신 “나는 네가 너인 것을 알면서/천사라고 생각해”라며 너를 천사로 오해하고 싶어하는 진심을 말하고 “죽은 애들이 뛰어 노는 것”을 보며 “믿기지 않아서 더 강렬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착각을 고백한다. (「패티 스미스」)
이처럼 다양한 오해와 착각의 스펙트럼이 때로는 하나의 진실보다 믿음과 진심에 더 가깝게 닿는 순간이 온다고, 우리는 이 시편들을 하나하나 감싸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핀 시리즈 공통 테마 <에세이>_‘친구’
<현대문학 핀 시리즈> 시인선에 붙인 에세이는, 시인의 내면 읽기와 다름없는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로 출발한다. 이로써 독자들이 시를 통해서만 느꼈던 시인의 내밀한 세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가설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이 에세이가 ‘공통 테마’라는 특별한 연결고리로 시인들의 자유로운 사유공간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자신만의 고유한 정서를 서로 다른 색채로, 서로 다른 개성으로 보여주는, 깊숙한 내면으로의 초대라는 점은 핀 시인선에서만 볼 수 있는 매혹적인 부분이다. 새로운 감각으로 네 시인이 풀어나가는 이번 볼륨의 에세이 주제는 ‘친구’이다.
에세이 「경의선 숲길을 걷고 있어」에는 느슨하지만 끈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지만 “반갑다고는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치 멀리서부터 서로의 모습을 보며 걷던 중인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다. “화분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더라도 “어디야? 물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건 신기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이. “위스키 한 모금만큼” 조금씩 흘러가는 시간 속에 느긋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켜켜이 쌓인다. 비록 “우린 다시 수년 만큼 헤어지게” 되더라도. 지금은 함께 “언덕을 넘게 될 새벽을 이제 막 오르는 참이다.” ‘언덕’이 아닌 ‘새벽’을 오르는 것. 이 역시 모호하지만 아름다운 착각의 풍경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