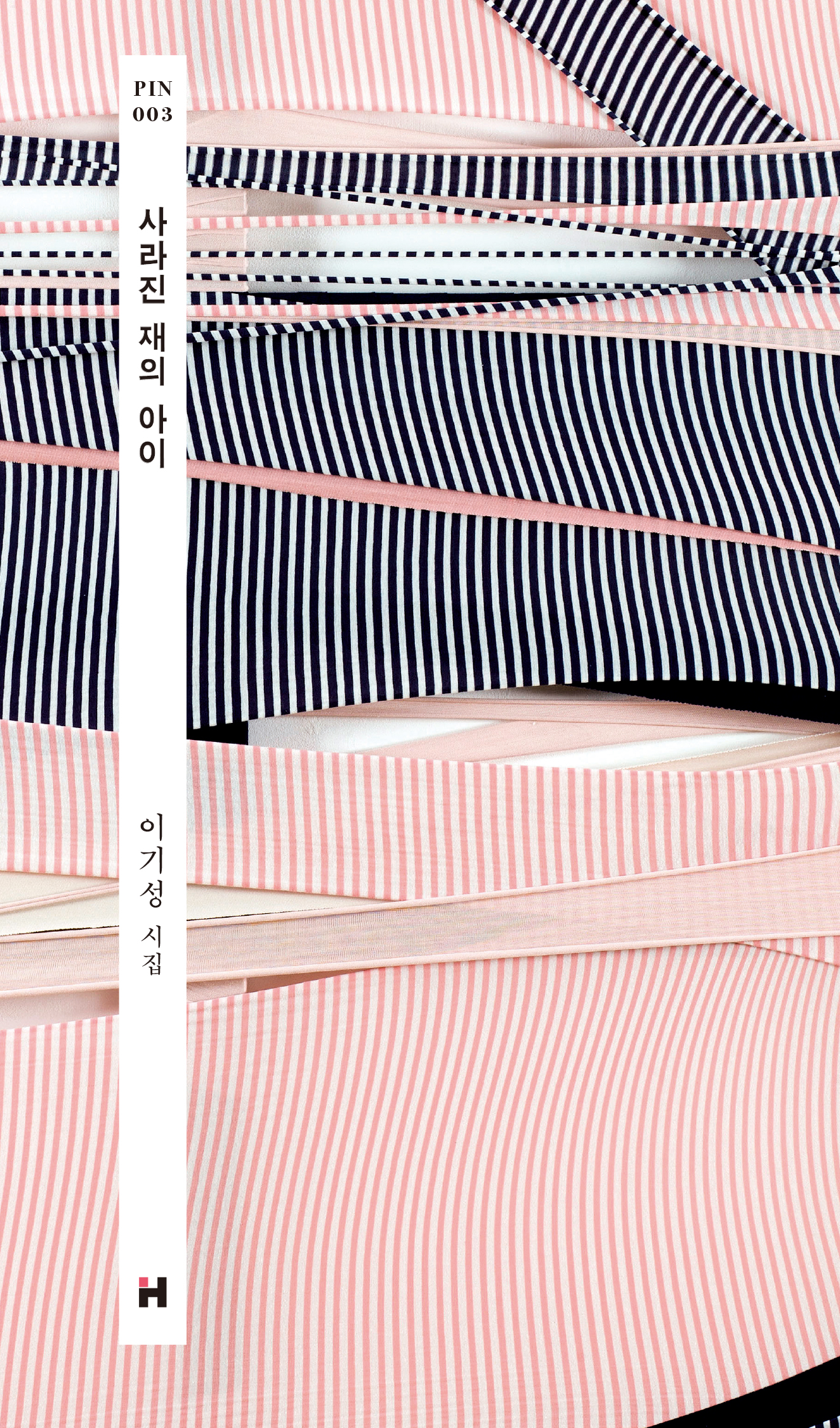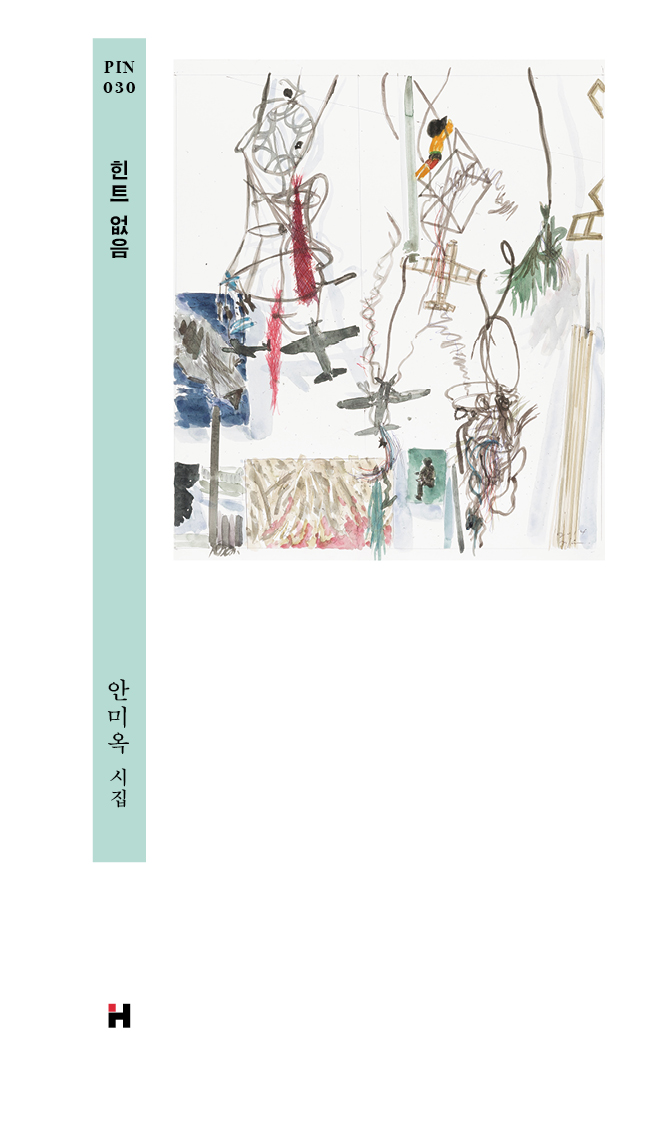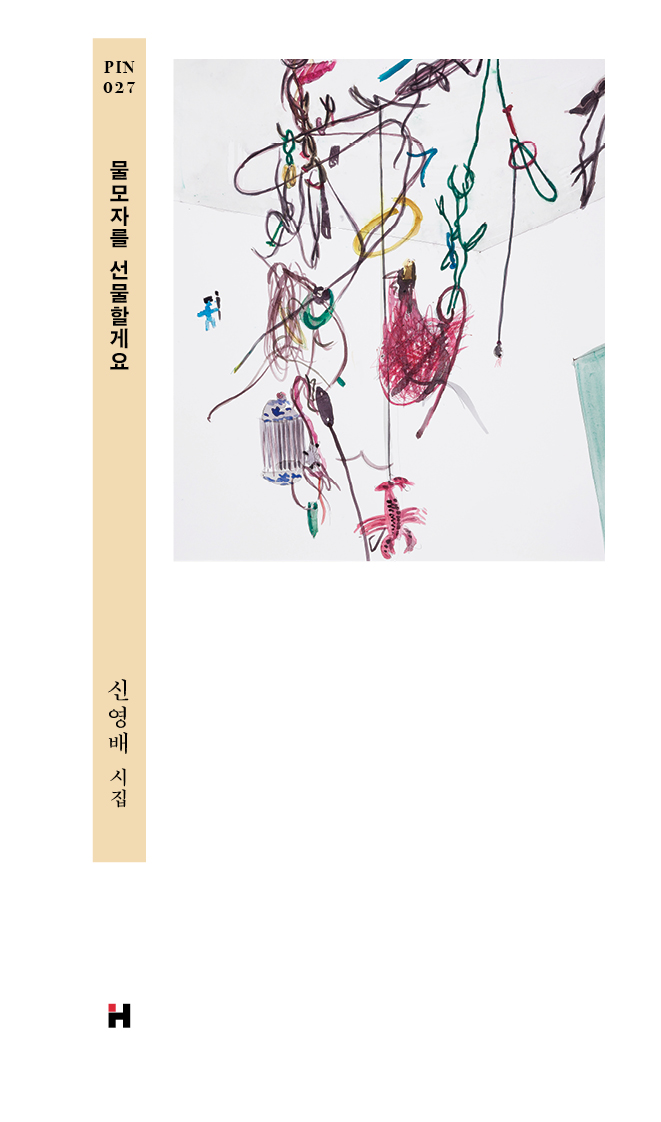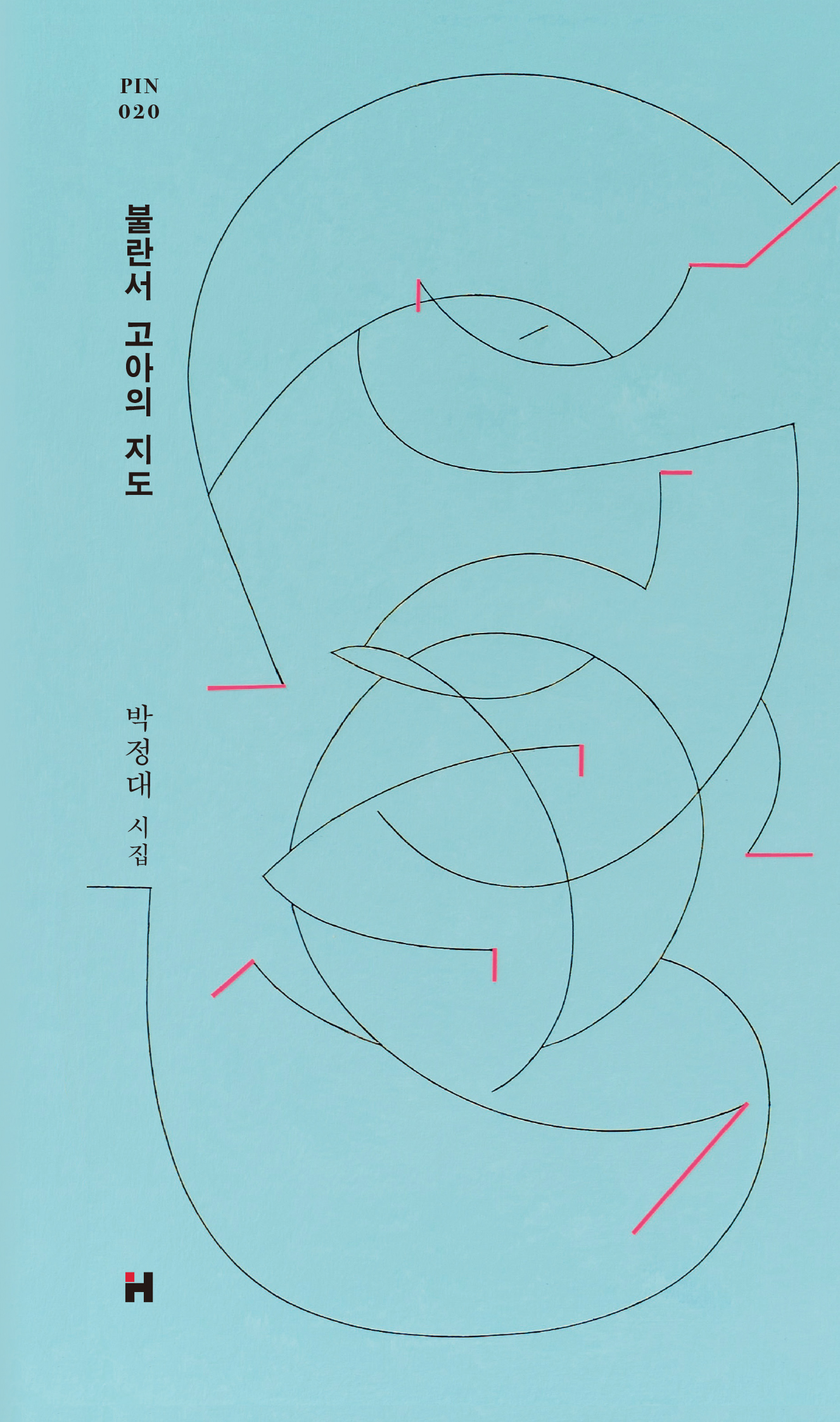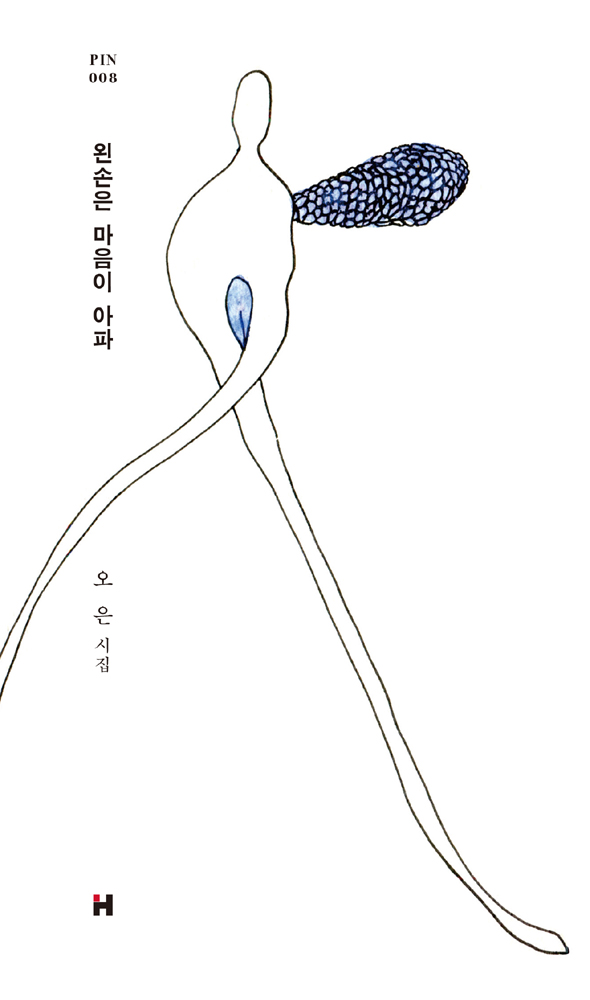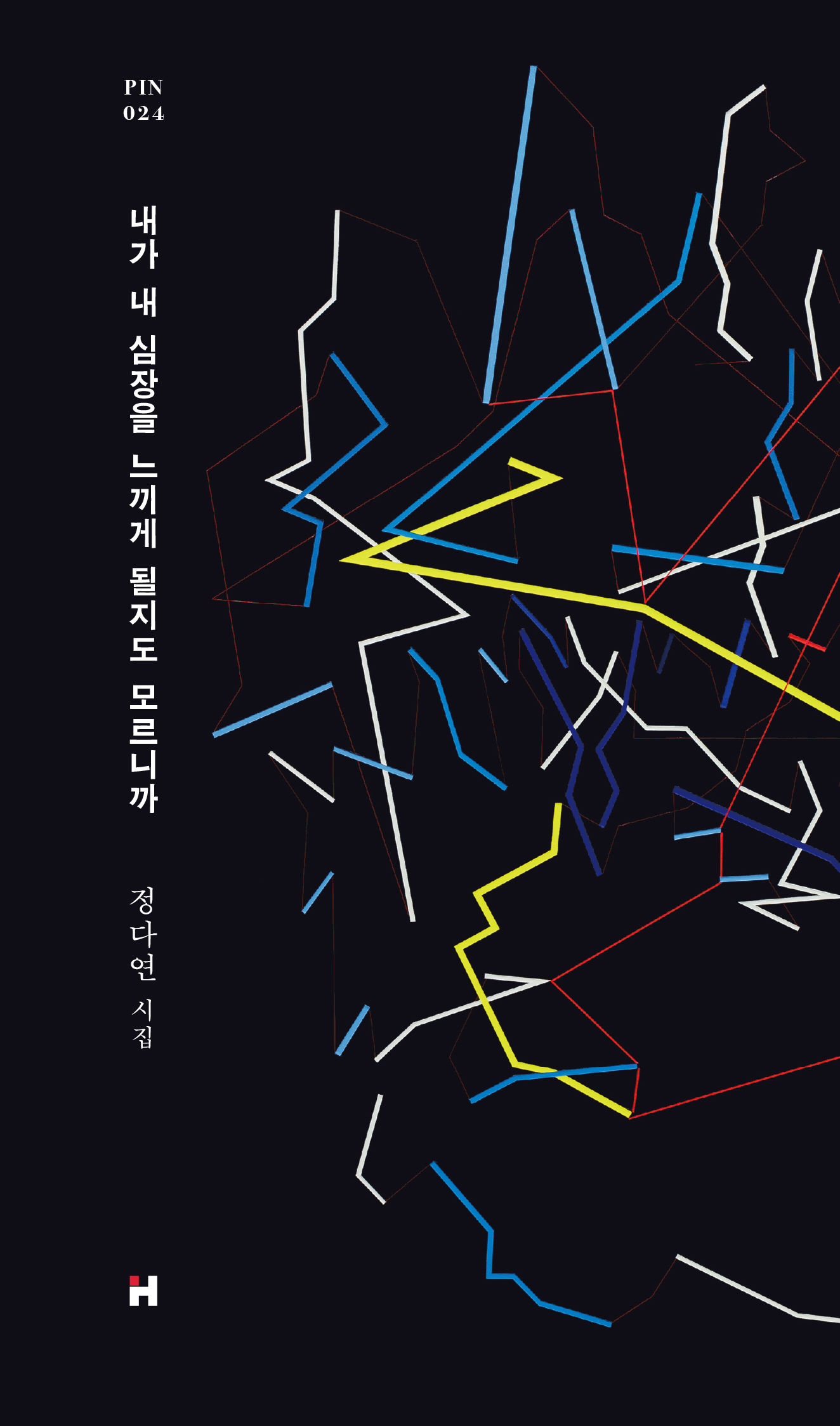이기성 시집 『사라진 재의 아이』
무선 시집과 작가들의 친필사인이 담긴 한정판 양장세트 별도 발매
아트 컬래버레이션, 핀 라이브 등 다양한 특색들
반년간마다 새롭게 출간되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의 2018년 상반기를 책임질 『현대문학 핀 시리즈 VOL. Ⅰ』의 시인들은 박상순, 이장욱, 이기성, 김경후, 유계영, 양안다 6인이다. 한국 시단의 든든한 허리를 이루는 중견부터 이제 막 첫 시집을 펴내는 신인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은 『현대문학 핀 시리즈 VOL. Ⅰ』을 통해 현재 한국의 시의 현주소를 살피고 그 방향성을 짐작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면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는 셈이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 VOL. Ⅰ』의 세 번째 시집은 이기성 시인의 『사라진 재의 아이』이다. 올해 등단 17년 차를 맞이하는 중견 시인 이기성의 네 번째 시집으로, 일상의 황폐한 풍경들을 조용하고도 신뢰감 가는 시선으로 그려내는 시인의 목소리가 인상 깊게 다가온다. “나는 소년을 보았어. 그 애가 유리문을 통과하려고 애쓰는 것을. 그건 마치 막 날개를 펴려고 애쓰는 나비와 같았지. (……) 만약 내게 손이 있다면 그 애의 옷깃을 잡아당겼을 거야.”(「나비」) 절제된 언어들로 수립해가는 시어는 결코 품위를 잃는 법이 없으며, 고된 생활상을 묘사하면서도 비극적이나 어딘가 환상적인 어조로 그것을 시로 옮기는 이기성의 작업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시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이 몽환적이고 섬세한 어조로 자식도 죽고 병중에 있는 아내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늙은 경비원의 모습을 그리며 노동과 생활, 죽음의 문제를 어둠에서 끌어올리려는 에세이 「화염의 박물관」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여섯 시인의 여섯 권 신작 소시집’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만큼이나 시집의 판형이나 구성에도 차별화된 특색을 갖췄다. 가로 104센티 세로 182센티의 판형은 보통의 시집보다 가로 폭을 좁히고 휴대성을 극대화해 말 그대로 독자들의 손안에 ‘시가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제작되었다. 시편이 끝나고 나오는 오른쪽 면은 여백으로 남겨 시와 시 사이의 숨을 고를 수 있도록 가독성 또한 높였다. 관행처럼 되어 있던 시집의 해설이나 작가의 말 대신 20여 편의 시편과 함께 같은 테마로 한 에세이를 수록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할 점이다. 이번 6인의 시인들은 ‘공간’이라는 공통된 테마 아래 ‘카페’ ‘동물원’ ‘박물관’ ‘매점’ ‘공장’ ‘극장’이라는 각각 다른 장소들을 택해 써 내려간 에세이들이 시집 말미에 수록되어 시인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선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 VOL. Ⅰ』은 시리즈 론칭을 기념하여 6인 시인의 낭독회 행사와 함께 독자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500질 한정으로 발매되는 6인 시인의 친필사인과 메시지가 담긴 양장본 세트(전 6권)가 그것이다. 일반 무선 제본으로 제작되는 낱권 소시집과 동시에 출간된다.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첨예한 작가들과 함께하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
핀, 문학을 잇고 문학을 조명하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 첫 번째 컬렉션북 출간!
현대문학의 새로운 한국 문학 시리즈인 <현대문학 핀 시리즈>가 첫 선을 보인다. 2017년 7월호 월간 『현대문학』에서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는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첨예한 작가들을 선정, 그들의 신작을 집중 조명하는 작가 특집란이다.
그동안 전통적 의미의 문학이 맞닥뜨린 위기 속에서 문학 작품을 향한 보다 다양해진 변화의 목소리 속에 『현대문학』이 내린 결론은 오히려 문학, 그 본질을 향한 집중이었다. 갈수록 줄어드는 문예지의 창작 지면을 오히려 대폭 늘려 시의 경우 신작 시와 테마가 있는 에세이를, 소설의 경우 중편 내지 경장편을 수록해 가장 『현대문학』다운 방식으로 독자 대중과 조금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작품을 통해 작가를 충분히 조명하는 취지의 <현대문학 핀 시리즈>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그 결과물로서 월간 『현대문학』 2017년 7월호부터 12월호까지 실린 시인 6인―박상순, 이장욱, 이기성, 김경후, 유계영, 양안다의 작품들을 시리즈의 신호탄이자 첫 번째 컬렉션북 『현대문학 핀 시리즈 VOL. Ⅰ』으로 가장 먼저 출간한다. 이는 현대문학의 새로운 시리즈의 출발점인 동시에 1955년 창간 이래 유수한 시인들을 배출해온 현대문학이 다시금 시인선을 출발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핀pin’이란 주로 사물을 여미거나 연결하는 데 쓰는 뾰족한 물건을 의미이지만, 또는 꽃이나 웃음 등이 개화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흔히 무대 위의 피사체나 세밀한 일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쏘아주는 빛도 ‘핀’ 조명이라 하는데, 우리가 표방하는 ‘핀pin’은 이 모두를 함축하는, 정곡을 찌르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 VOL. Ⅰ』의 작가들은 단행본 발간과 동시에 여섯 명이 ‘한 시리즈’를 이루어 큐레이션된다. 현대문학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인선인 만큼, 개별 소시집이 이루어내는 성취는 그것 그대로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에세이의 테마 선정과 표지화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동반한 개성적인 6권 세트는 서로 조응하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세트로 독자들에게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문학과 독자를 이어주는 ‘핀’이 되려는 새로운 플랫폼 <현대문학 핀 시리즈>. 현대문학은 이 시리즈가 가지는 진지함이 ‘핀’이라는 단어의 섬세한 경쾌함과 아이러니하게 결합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문학*ARTIST-정다운
현대문학 핀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는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탄생된 시집 표지이다. 각각 개별의 시집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도 볼 수 있는 이번 VOL Ⅰ 시집들의 표지는 패브릭 드로잉 작가 정다운(b. 1987)의 작품들로 장식하게 되었다.
동덕여대 회화가 출신의 정다운 작가는 신진 시각예술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기획프로젝트 ‘2017 아티커버리(articovery)’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TOP 1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중국, 홍콩,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임의의 구성에서 우연의 결과를 얻고, 이렇게 반복되는 행위들은 규칙성을 갖고 하나의 화면을 완성하는 정다운 작가의 작업 방식은 한 권 한 권의 소시집이나 여섯 권 세트로 큐레이션되는 핀 시리즈와도 그 의미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의 첫 시리즈 시집 첫 번째 협업 아티스트로 정다운 작가를 선정했다.
▲ 작가의 말
나는 그녀를 보기 위해서 그 도시의 박물관에 가곤 했다. 내가 알기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누런 삼베에 감싸인 그녀는 곧 잠에서 깨어날 듯하고, 어쩌면 굳게 잠긴 잠의 저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플라스틱 관 옆에 나무 조각이 붙어 있다. ‘사막의 무녀’. 이것이 그녀의 이름이다.
―에세이 「화염의 박물관」 중에서
▲ 본문 중에서
당신은 감자를 보고 있는 것. 작고 둥글고 움푹팬 자리마다 검은 싹이 나는 것. 뭉툭하게 잘린 발처럼 썩어가는 것. 당신은 물끄러미 감자를 보는 것. 고아처럼 희고 딱딱한 감자. 꿈속처럼 몽롱한 감자. 한없이 감자를 보는 것. 당신은 멈추지 않는 것. 그러다 문득 목이 메는 것. 햇빛이 손끝에서 식어가는 것. 식당의 내부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 당신은 더 이상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감자를 보는 것」 전문
잿빛, 생각하면 재의 마을이 떠올라요. 그 마을엔 잿빛 여자들이 살았어요. 여자들은 커다란 드럼통에 시멘트를 반죽해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깨진 창문에 탁자에 낡은 접시에 잿빛이 내려앉고 하얀 팔꿈치에도 눈꺼풀에도 수북이 쌓였어요. 밤이나 낮이나 아기들은 재를 뱉어내며 울었어요. 잿빛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건 참 멀군요. 잿빛은 구름보다는 바닥에 가깝기 때문일까요? 그러니 누가 알겠어요? 사라진 재의 아이를. 친구들아, 나는 자라서 재
의 아이가 되었단다, 벽돌 속에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는 거대한 반죽통 속에서 천천히 잿빛이 되었어요.
―「잿빛」 전문
나는 소년을 보았어. 그 애가 유리문을 통과하려고 애쓰는 것을. 그건 마치 막 날개를 펴려고 애쓰는 나비와 같았지. 하지만 나비라니? 지하도의 매캐한 먼지 속에서 사람들이 매일 그 애를 밟고 지나갔어. 사람들이 지나가면 납작해진 아이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났지. 노란 작업복은 그 애의 교복이야. 그 애는 작은 가방에 은빛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다녔지. 그건 나비의 자존심 같은 것이라고. 그럴 때 그 애의 얼굴에 휙 지나가는 서늘한 웃음 같은 것. 사실 그건 소년의 할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지. 나비야, 어린 나비야, 할머니는 소년을 그렇게 불렀을지도. 지하도의 벤치는 꿈을 꾸기 좋은 곳. 그 애가 벤치에 앉아서 신문지 쪼가리를 더듬더듬 읽을 때, 그 애의 목덜미에 하얀 먼지가 내려앉는 게 보였어. 만약 내게 손이 있다면 그 애의 옷깃을 잡아당겼을 거야. 마지막에 그 애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건 어떤 음악 소리보다 작았거나 너무 컸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촛농처럼 꽉 틀어막았어. 아아아, 유리문을 통과한 그 애는 정말 나비가 된 걸까. 검은 파도처럼 통로를 떠밀려 가던 사람들 멍하게 소년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
―「소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