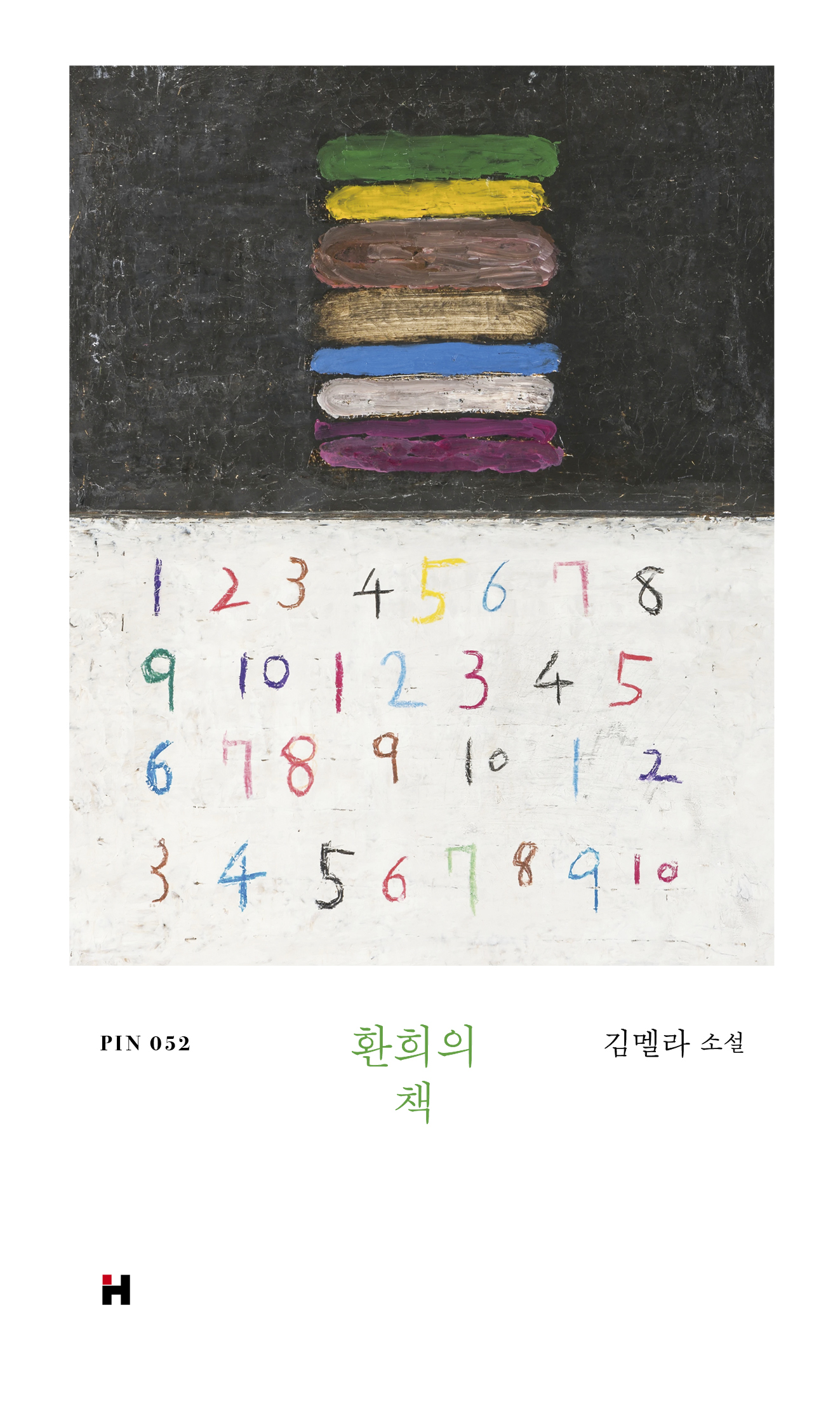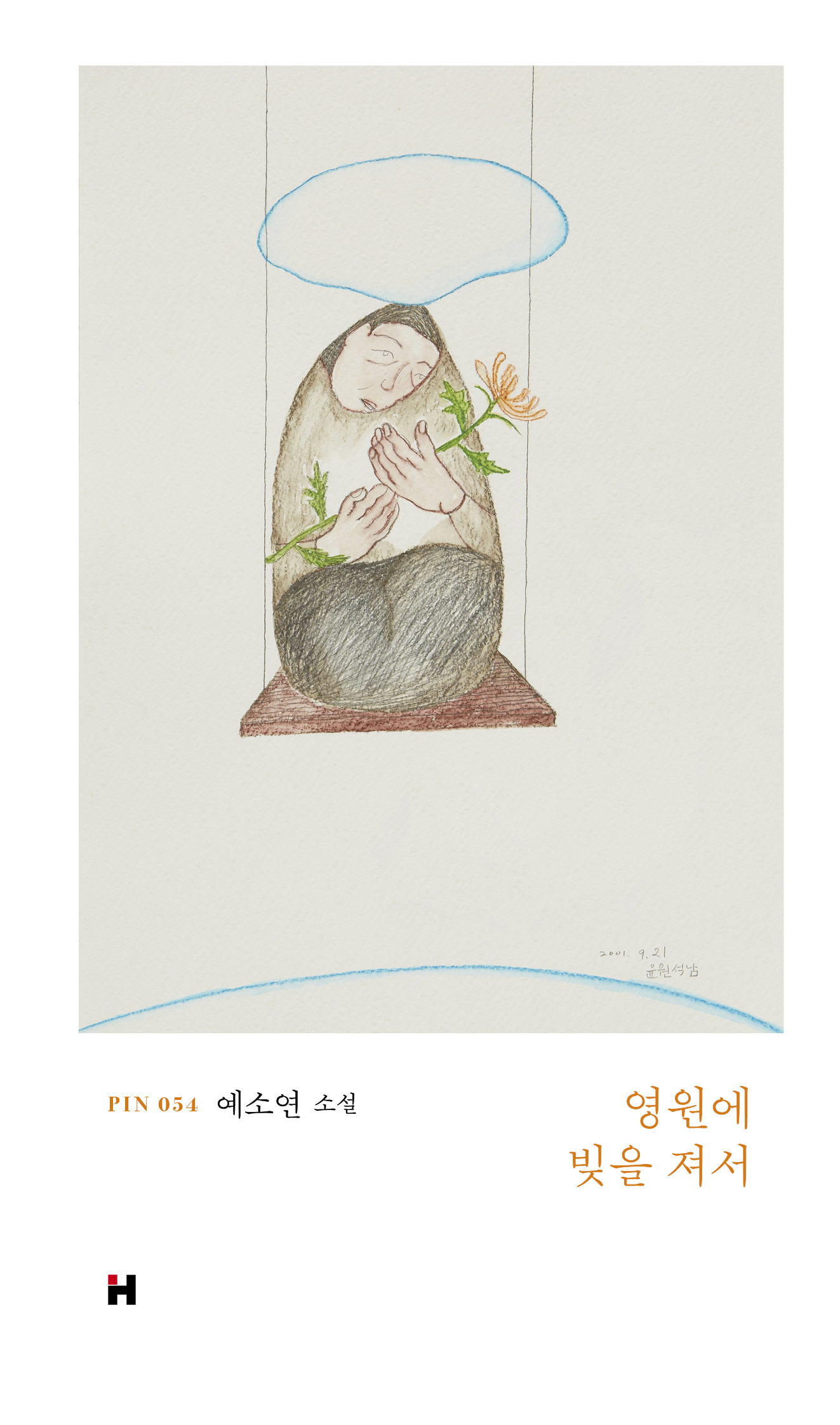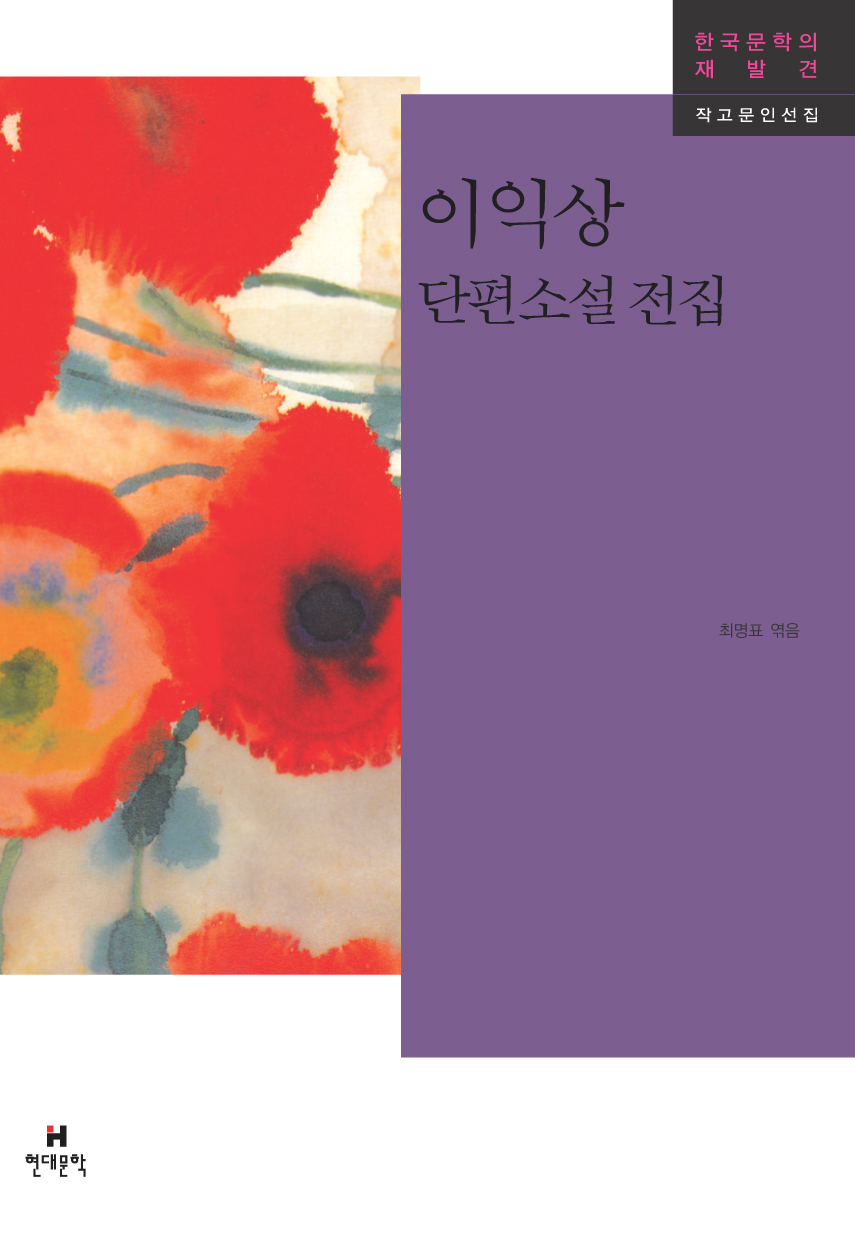■ 이 책은 한국문학의 독보적인 작가 박상륭의 다섯 번째 창작집 『小說法』이 ‘현대문학 창간 50주년 기념사업 도서’로 최일남, 김채원, 서정인에 이어 출간되었다. 2002년 창작집 『잠의 열매를 매단 나무는 뿌리로 꿈을 꾼다』와 2003년 장편소설 『神을 죽인 자의 행로는 쓸쓸했도다』의 출간 후 2, 3년만의 일이다. 박상륭은 한국문학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세계 신화와 종교를 밑걸음으로 한 독자성을 확보해오며, 일군의 독자들로부터 존경을 넘어선 난공불락이자 외경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창작집으로 꾸미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려 완성시켜놓은 미발표작이자 표제작 「小說法」은 이번 창작집의 핵심이다.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 박상륭은 이번 창작집에서 그 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이제 박상륭은 한국문단에 던지는 메시지이듯 ‘이것은 소설이다’를 전제하며 궁극적인 ‘소설 쓰는 법이 무엇인가를 그만의 철학과 종교적 해석을 기초로 한 설법으로 소설의 기승전결 형식을 갖추어 보여주고 있다. 작품해설을 쓴 김윤식 역시 이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며, 이 『小說法』이야말로 박상륭 각설이 타령의 정점이며 최신품이자 도달점이고, 박상륭의 고전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장엄 화려한 글모음 결정판이라고 평하고 있다. 『小說法』은 박상륭의 전작들처럼 신화와 종교를 재해석하며 일상 어법을 깨뜨리는 난해함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설조의 문체로 점철된, 자신의 일관된 화두인 인류의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 진화와 역진화의 문제들을 각별히 장자의 『남화경(南華經)』의 구성법에 따라 아홉 편으로 <內篇〉〈外篇〉〈雜編〉을 구성해놓았다.「無所有」, 「小說法」, 「逆增加」 3편으로 구성된 〈內篇〉은 박상륭의 근본사상이 함축된 것이다. 〈外篇〉은 〈內篇〉에 대한 주석들인 셈으로 「雜想 둘」을 비롯한 3편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雜篇〉은 〈外篇〉을 다시 친절하게 해설해놓은 것으로 2편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박상륭 작품에서 그래왔듯, 소설과 산문의 구분이 없다. 본문의 어떤 부분은 단지 주석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도 하다는 작가의 귀띔처럼 박상륭 문학에서 주석은 때로는 본문보다 큰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번 창작집에서는 주석을 각 장 맨 끝에 두었다. 이번 창작집의 제목 ‘小說法’은 두 가지 뜻을 지닌다. 하나는 작은 설법이란 뜻의 小, 說法이고 다른 하나는 기승전결, 육하원칙으로 이루어진 ‘소설 쓰는 법’이란 뜻의로의 小說法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뜻은 「小說法」의 내용과 형식을 이끌어나가는 모체가 된다. 「小說法」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미 소개했듯이, 起 ? 承 ? 轉 ? 結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잠자는 공주’, ‘개구리왕자’, ‘금당나귀’, ‘아킬레스’라는 작은 부제가 붙어 있다. 50여 년 동안 고독하게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온 박상륭은 신화, 종교, 문화, 철학, 인류사, 진화론에 관한 담론과 해석으로 엄밀히 말해서 소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해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있다. 잡탕처럼 어지럽게 혼합된 한국문단에 이것이야말로 소설이라고 일침을 가한 셈이다. ‘쓰여져 본 적이 없는 얘기의 줄거리’란 부제가 달려 있는 「無所有」는 어부왕 전설을 소재로 한 것으로, 성적 불구자 어부왕, 시동(侍童), 패관인 박씨가 등장한다. 구성은 본문과 주석, 시동(侍童)의 삼각형 도식으로, 박상륭은 자신의 조어(造語)인 소유와 존재가 동일하다는 뜻의 ‘곳+것= ’을 고안해내고, ‘無所有’란, ‘소유한 것이 없다’, 즉 ‘無, 所有’의 뜻이기 보다는, ‘존재치 않는다’, 즉 ‘無所,有’에 대한 산스크리트적인, 곧 원론적인 無所有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逆增加」는 2004년 현대문학 2월호에 「두 집 사이」란 제목으로 게재되었던 것이다. 이 소설은 박상륭의 초기 단편 「아겔다마」에서의 ‘유다’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비극적인 운명의 인간의 전형으로 꼽히는 ‘카인’을 신화적, 종교적 특성 위에서 우주적 리얼리티를 통해 보여준다. 생명의 윤회를 ‘갈마의 중현(重現)으로써가 아니라, 분열을 통해서 복회(復回)한다’는 전제 아래 작가가 미뤄두었던 명료한 주제, 죽음과 회생에 대한 ‘갈마逆분열’이라는, 즉 인구의 ‘감소/감축’에 대한 관점을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자 했다. 절망하는 오늘의 현대인과 다를 바 없는 이 두 인간의 구원이 ‘우리 인간들의 몫’이라고 말하는 작가의 이 소설은 어떤 구도적(求道的), 종교적 패러디의 차원을 넘어선 작가의 생명에 대한 사랑과 사유의 궤적이라고 비추어진다. 〈外篇〉에 묶인 「雜想 둘」, 「漫想 둘」, 「爲想 둘」, 「誤想 둘」은 대산문화재단에 네 차례 연재되었던 작품들이고, <雜篇>에 묶인 「깃털이 성긴 늙은 白鳥 / 깃털이 성긴 어린 白鳥」「A RETURN TO THE HUMANET」은 환경에 대한 작가의 철학적 사유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것 역시 각각 대산문화재단과 문학동네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작품들이다. 여기서 「A RETURN TO THE HUMANET」을 살펴보면, ‘HUMANET'은 박상륭의 조어(造語)로 어간을 Humamity에 두고 ‘Planet'이라는 어휘에 운(Rhyme)을 맞추기 위해, 만든 단어 Human(人) - Planet(間)을 뜻하는 것으로서, 박상륭은 인간을 하나의 우주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책 속에서 시동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고치고, ‘僧推月下門’, ‘僧敲月下門’, 推, 敲, 推-敲, 열번을 고치고 스무번을 바꿨는데, ‘운명’인지 뭣인지,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당자인지 누군지가, 흐흐흐, 이 한 대목의 시동의 삶을 ‘퇴고’하고 있었다. 그러는 짓은, 허기야, 열길을 파도 동전 한잎 나올 일 없는 자갈밭 파기 보다도 곤할 노릇이었겠다, 피곤이 엄습했던지, 그 자리 비그르 무너지는가 하고 있자니 시동은, 코를 곯기 시작한다. 사자 따위, 육식동물들을 보면, 배부른 대로 잔다. 그래야 들이 좀 평온해 질게 아닌가. 아직도 ‘사람’보다 ‘짐승’이 많아, 저 나이또래는 그래서 잠도 많은 게다. - 「無所有」 3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