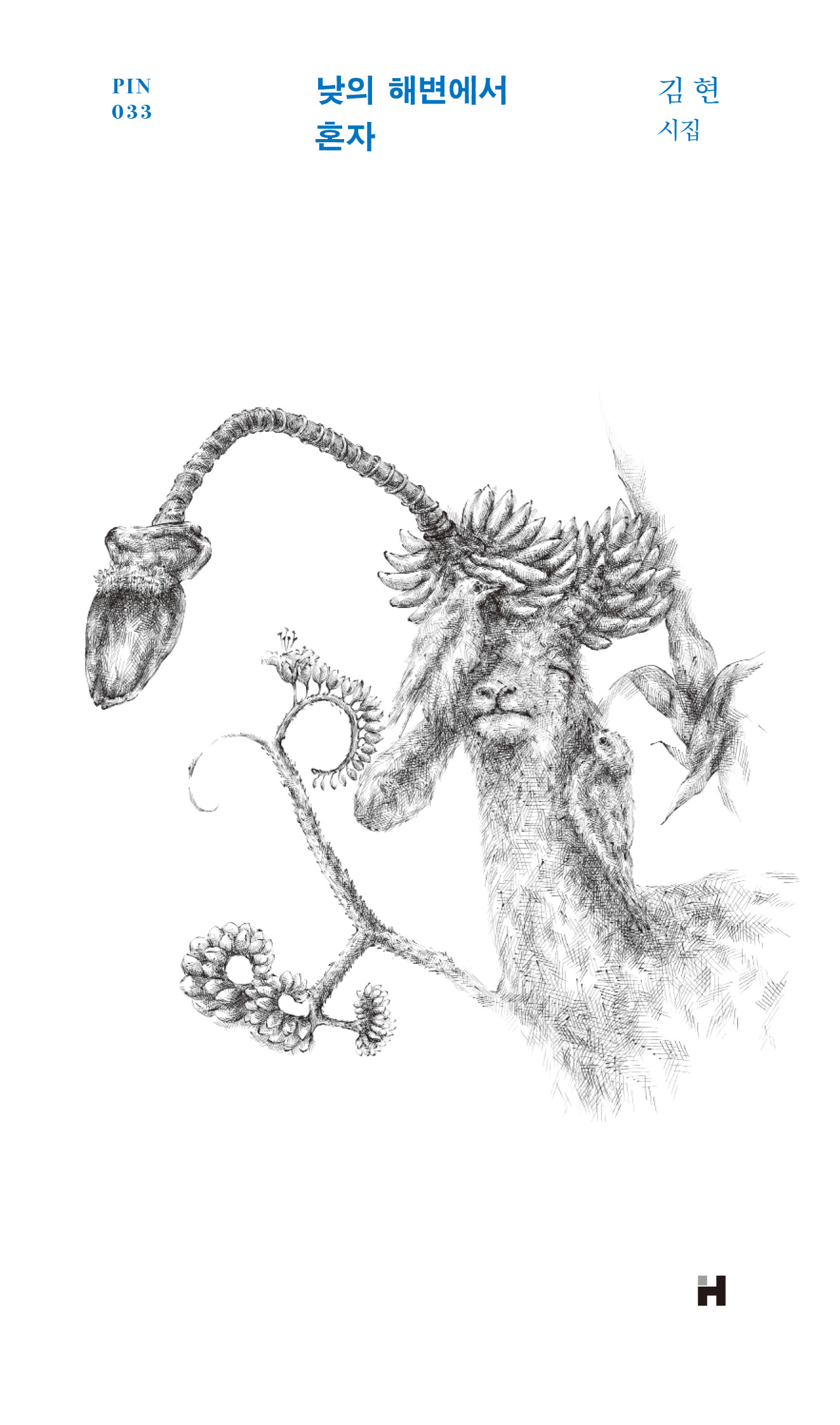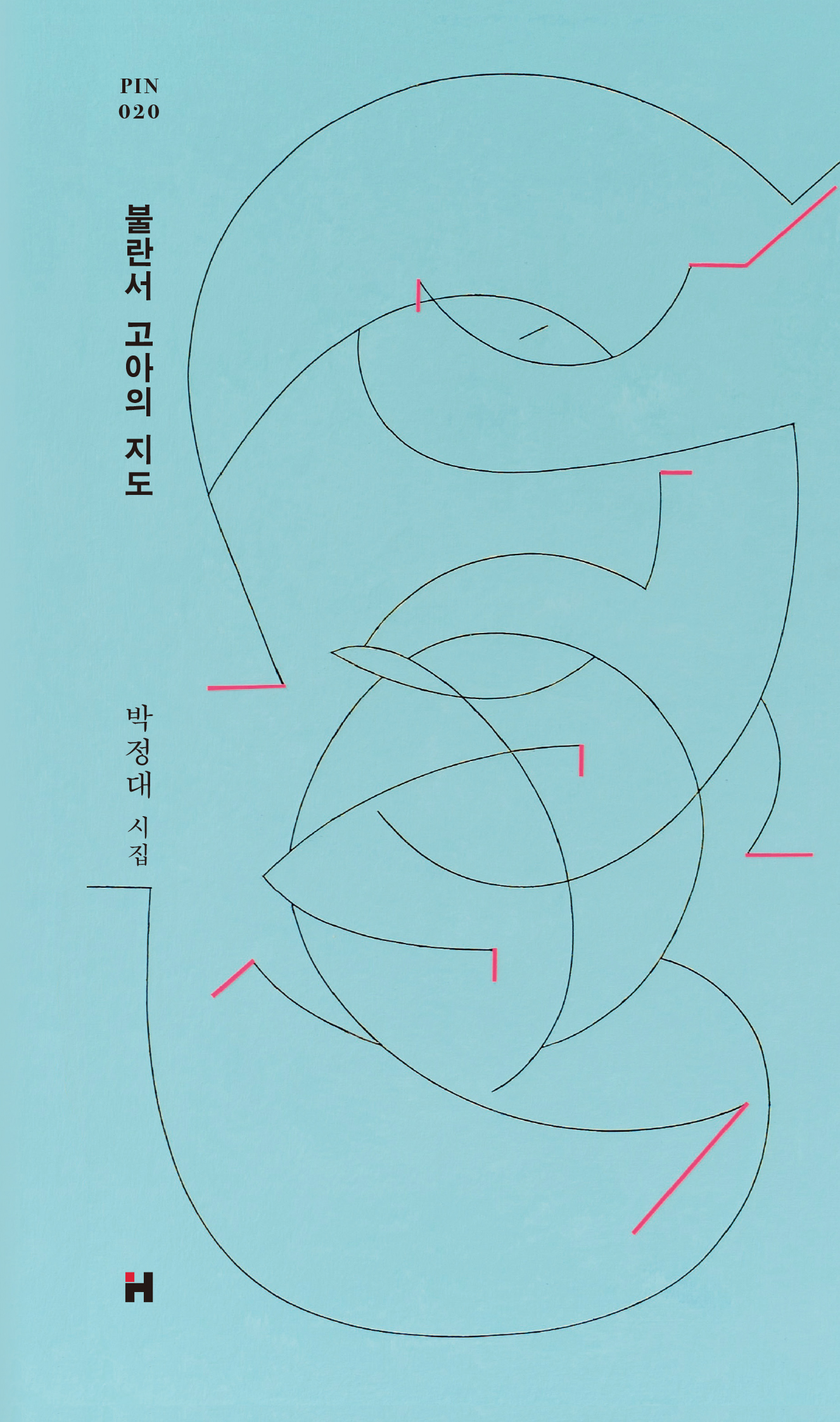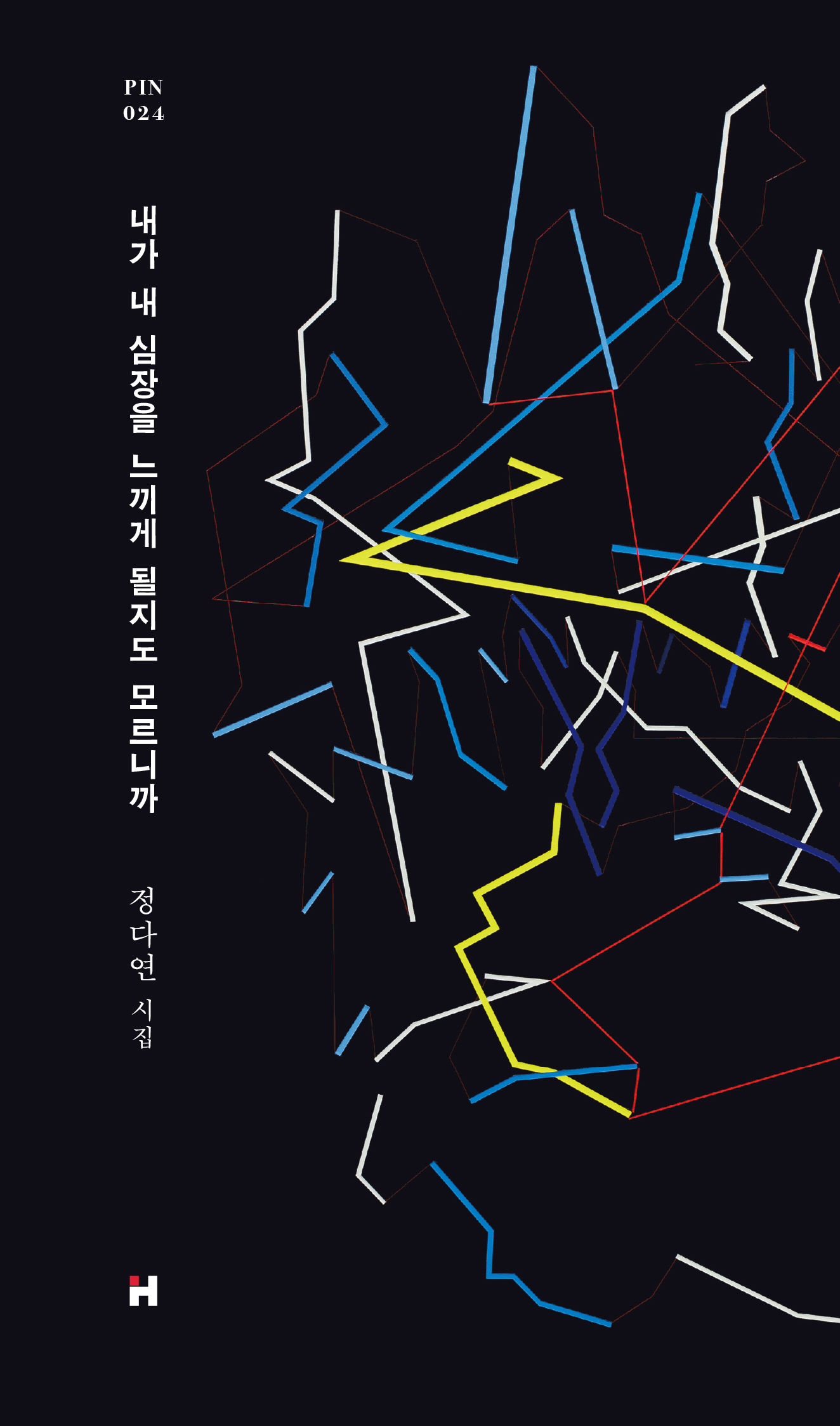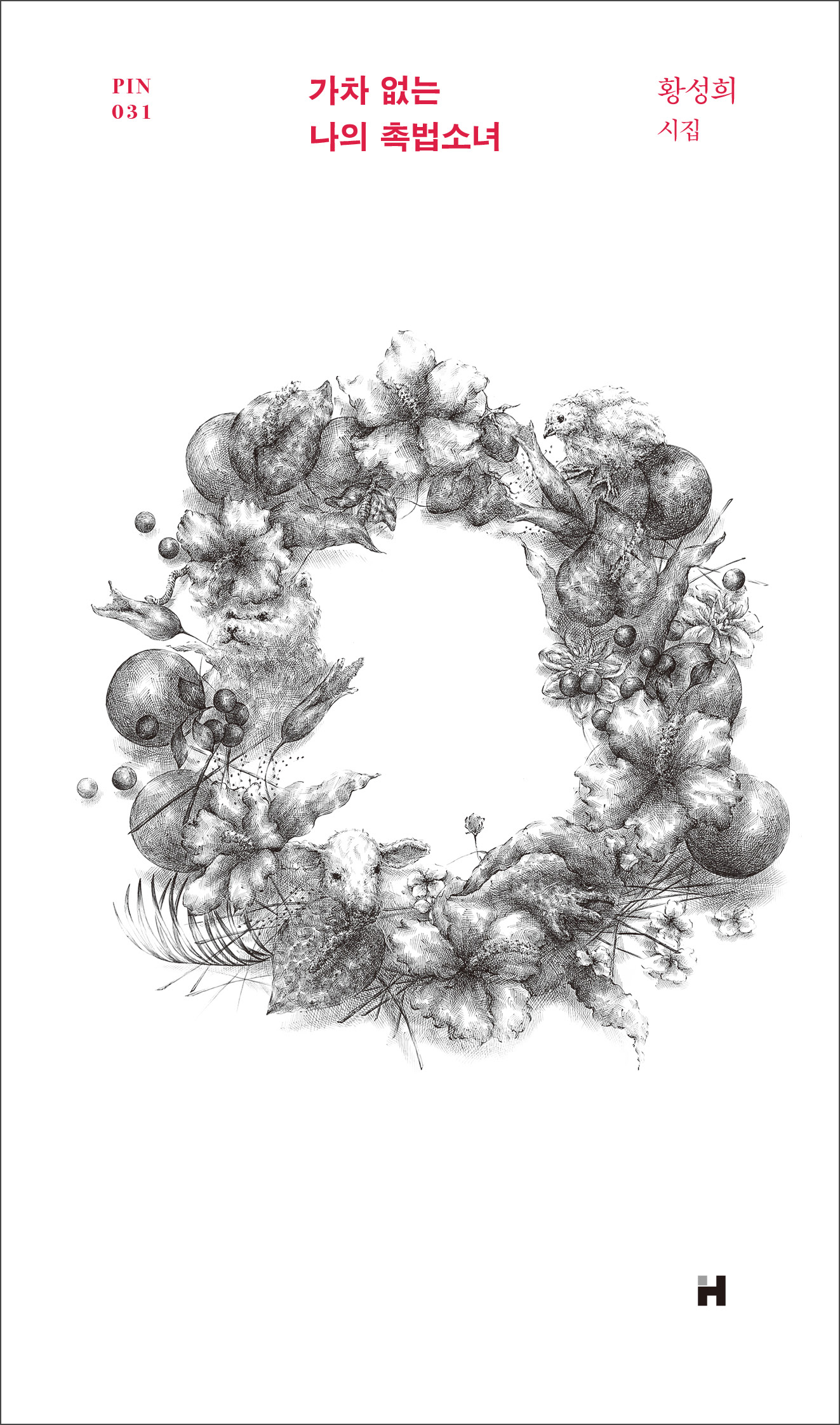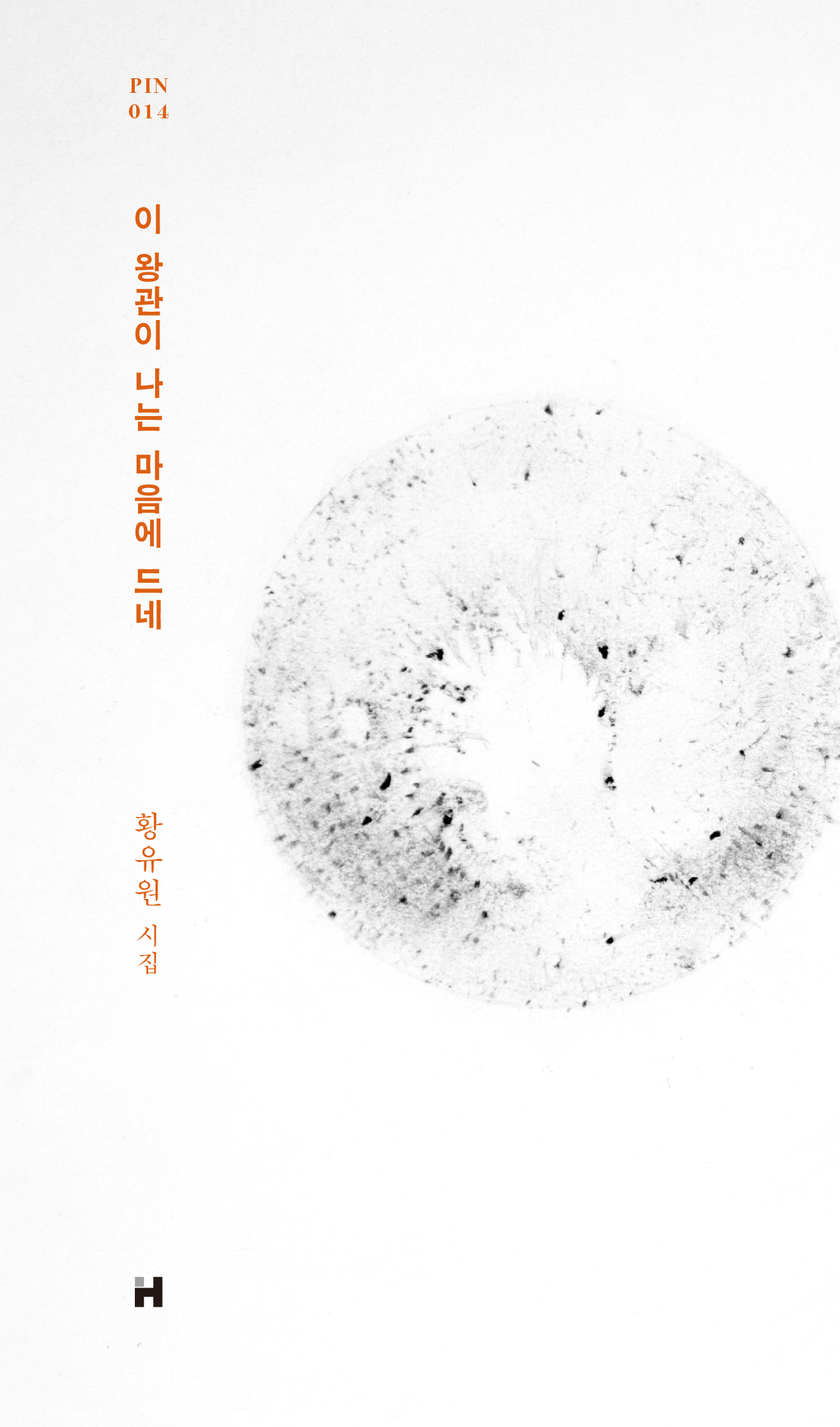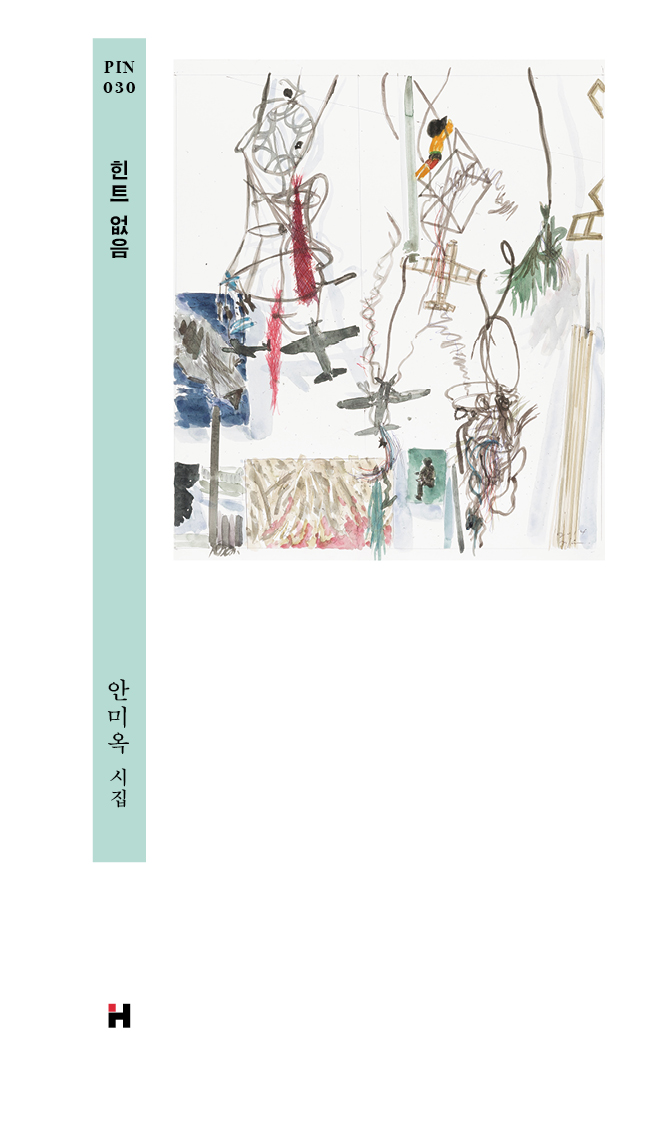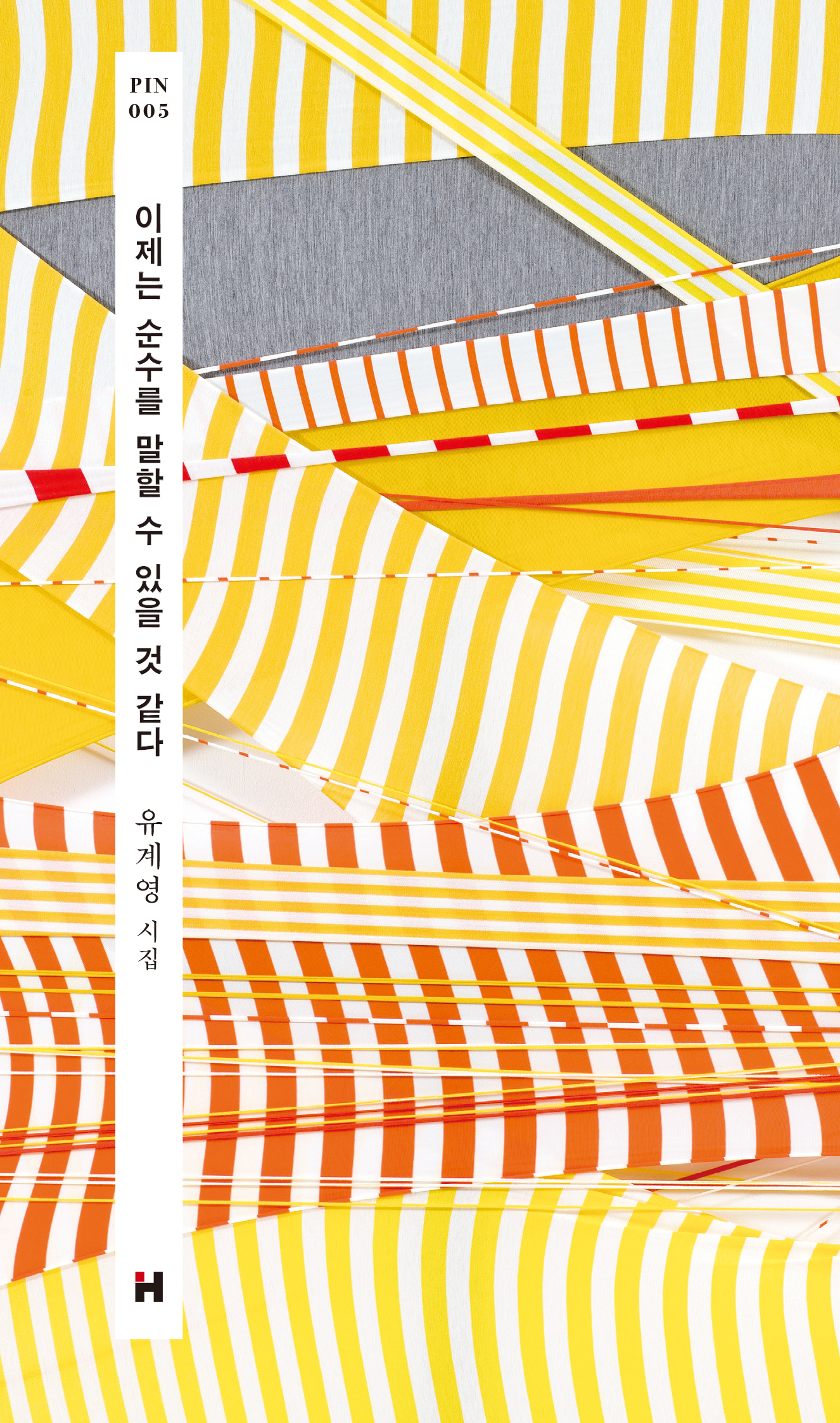문학을 잇고 문학을 조명하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한국 문학 시리즈인 <현대문학 핀 시리즈> 시인선 마흔아홉 번째 시집으로 민구의 『세모 네모 청설모』를 출간한다.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일상어의 중력을 벗어난 독특한 시어, 자연에 대한 전위적이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층위의 시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민구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무미하되 건조하지 않고, 담담하되 답답하지 않고, 순순하되 심심하지 않”(김언)지만 “킥킥 웃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슬퍼질 수 있다”(박연준)는 평을 받은 그가『당신이 오려면 여름이 필요해』이후 2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시집에는 사소한 일상을 유머로 구사한 그 심층에 존재의 처연함이 공존하는 그의 시 세계를 통해 시인 특유의 낙천성과 평범한 사고를 뒤집는 언어유희, 일상에서 찾은 행복들이 담겨 있다.
“불안과 강박에 휘둘리는 도시인들의 일상을 보듬는 경쾌한 유희”
독특한 시어와 기발한 상상력이 춤추는
민구 시인의 『세모 네모 청설모』
민구 시인은 꿈을 자주 꾼다. 그것도 악몽으로 말이다. 꿈에서 시인은 번연히 살아 계신 부모님, 반려견, 친구의 무덤을 본다. 심지어 자신의 무덤도 본다. “올 걸 예상했다는 듯이 / 나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 이름을 불러도 눈을 뜨지 않았고 / 어깨를 흔들어도 숨을 쉴 뿐 / 일어나지 않았다”(「굿모닝」). 은사님이 나타나 난데없이 따귀를 때리기도 한다(「행복」). “야산에서 구멍 난 철모를 본 뒤로 자주 싸우는 꿈”(「싸우는 꿈」)을 꾸는가 하면, “다음 날 / 그다음 날도 //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 파도 같은 꿈”(「햇빛」)도 꾼다.
그러나 시인은 결코 악몽에 휘둘리지 않는다. 깨어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온한 일상이 그를 맞이한다. 그는 죽어 있는 자신에게 “외투를 벗어서 주고 / 잠에서 깬 기념으로 / 모닝커피를”(「굿모닝」) 마신다. 심지어 “꿈이 물속으로 나를 떠밀어 / 수심이 깊어질 때면 // 쌍무지개 휘어지도록 / 붙잡아주는 이”(「햇빛」)가 있다. 그에겐 시(詩)가 그를 붙잡아주는 존재가 아닐까. “나는 시를 쓴다. 조심스레 고백하건대 시를 그럴듯하게 만든다. 의자에 앉았다가 침대에 눕는 게 일상이고, 시가 되지 못한 부속들을 그저 주워 담는 게 내 한계임을 알고 있다. 흔히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이 벽에 기대서 오랫동안 따뜻했다”(에세이「별명」)라는 고백과 “그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만들겠다(에세이 「별명」)”는 다짐으로 털어놓는다.
그토록 좋아하는 시를 쓰기 위해 그는 일을 해야 한다. “이름으로 불리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다. 이름으로만 불린다는 건 그에 걸맞은 관계를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즉, 일하자는 거다. 돈을 벌어야 시를 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대로 좋아하는 일에 치중하면서 살고 싶다.”(에세이 「별명」)
결국 “좋아하는 일에 치중하면서 살고 싶은” 바람을 이루기 위한 삶의 무게가 그를 수시로 악몽의 세계로 떠미는 것은 아닐까? “일요일인데 / 월요일이 온 것 같군요 // 일요일인데 / 일을 멈추지 못하겠다 // 빨간 날인데 /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나요(「일요일」)처럼 그는 쉬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가 하면, 포춘 쿠키를 쪼갠 후 나쁜 점괘를 받고 ”과자에서 나온 사람들이 / 나를 데리러 오고 있다(「포춘 쿠키」)는 불안에 시달린다.
붙잡을 수 없는 꿈에, 세상의 파도에 무참히 흔들릴 때
“쌍무지개 휘어지도록 붙잡아주는” 시들
하지만 그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지 않는다. “비어 있는 날짜를 신경 쓰지 마 / 좋아하는 숫자를 / 괄호 안에 넣어 // 새해 복 많이 받아 / 이건 좋은 징조야”(「새해」)처럼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줄 아는 지혜와 낙천성을 지녔는가 하면, 심지어 누군가를 웃길 줄 아는 사람이다. “너 장난 아니다! 짝이 칭찬했을 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내가 웃음거리가 됐다기보단 누군가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다는 기쁨이 컸다. 말로 웃기는 사람이 있고, 얼굴로 웃기는 사람이 있고, 숨만 쉬어도 웃기는 사람이 있다. 나는 웃음을 만들어야 했다. 만드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에세이 「별명」) 실연당한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그을린 고기와 양파를 상추에 싸서 // 자꾸만 싫다고 징그럽다고 하는 / 너의 입에 쏙 넣어”(「오래」)줄 만큼 다정하고, “나를 뭐라고 불러도 좋은 사람들”(에세이 「별명」)과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불행은 내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 너는 과거에도 그랬다고 / 타이르는데 // 행복해서 // 남의 말이 /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행복」) 않을 만큼 만족을 아는 사람이다.
그뿐 아니라 “걸어가자 길멍 / 겨울에는 눈멍 / 바다에서 물멍 / 강 건너면 불멍 // 당신을 기다리는 나 // 오늘도 흐리멍”(「멍) “네가 평평하지 않고 공평하다면 / 세모일 수도 있고 / 네모일 수도 있고 / 청설모일 수도 있지”(「평평지구」) “한 번 집을 나간 의미는 /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 이제 너를 기다리는 건 / 무의미하구나”(「의미 없는 삶」)와 같은 언어 유희들을 태연하게 구사하는 사람이다.
박연준 시인은 민구 시인을 가리켜 “(그의) 시에는 조임이 없다. 나사가 없다.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를 느슨하게 거닐 수 있다. 킥킥 웃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슬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나사와 조임이 없는 느슨함. 그렇다고 그가 치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치열함을 느슨함으로 바꿀 줄 아는 기술과 지혜를 지녔다. 결국 수심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를 “쌍무지개 휘어지도록 붙잡아주는 이”(「햇빛」)는 시를 좋아하고 시 쓰는 일을 좋아하고 (스스로 표현하듯) 시를 그럴듯하게 만들 줄 아는 시인, 자신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