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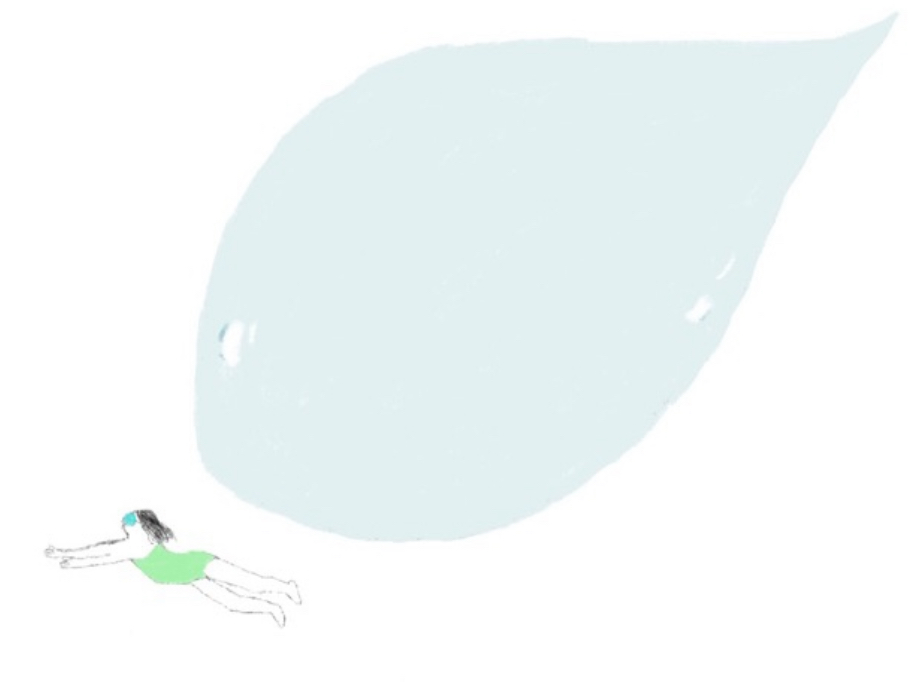
Ⓒ 정다연
“시인이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오랜 시간 글을 써오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면 난감했다. 그 순간이 더 난감했던 이유는 시인이라는 상태가 직업보다는 어떤 정체성에 더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다.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내가 글을 쓰는 이유와 맞지 않아 보였다. 나는 생계를 위해서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걸까? 때때로 돈 앞에 내가 쓴 시를 세워두면 그것은 얼마나 모래알처럼 작게 느껴지는지. 먹지도 못하고 요긴하게 쓰지도 못하는 그 작은 모래알이 그러나 나에게는 왜 그토록 소중한지 말하기란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출근도 퇴근도, 이직도 퇴직도 없는 이 일을 얼마나 유지할 계획인지 말하는 일 또한 녹록지 않았다.
어떤 때에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양해를 구하고 침묵했다. 어떤 때에는 적당한 사실을 골라 말하기도 했다. 그저 문학을 좋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답하기도 했고, 상주 작가로 근무할 때는 도서관에서 일시적으로 이런저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대답하고 나면 어딘가 찜찜했고 상대방과 나 자신을 어느 정도 공평히 속이는 기분이 들었다. 물론 원하지 않은 걸 말할 의무는 누구에게나 없는 것이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속인 건 아니었지만 나를 설명하는 것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인해 말하기 자체를 포기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로 여겨졌다. 세상에는 그 직업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존재했기에.
그래서 나는 작년부터 누군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오면, 시인이라고 답하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그 단어를 제외하고서는 나를 달리 표현할 무언가를 찾지 못한 이유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한번 말해보자고 스스로와 정한 이유도 있었다. 사랑하는 시를 언젠가 쓰지 않는 날이 온다면, 시인이라는 단어는 영영 써보지 못할 테니까.
저는 시인입니다. 말하고 나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편견을 내 앞에서 드러냈다. 많은 것이 기억에 남지만 가장 평범하고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시인은 좀…… 슬픈 사람이 아닌가요?”
나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슬퍼 보이지 않으세요?”
“네. 되게 밝아 보여요.”
나는 다시 대답했다.
“저 지금 슬픈데요?”
상대방은 당황했다. 농담이었다고 말해줄까 싶다가도 정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으니까. 시인은 슬픈 사람이고 자신은 시인이 아니므로 그것과 거리가 멀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나는 알려주고 싶었다. 슬픔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무관하게 한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으며 그건 머리를 감거나 손톱을 자르는 일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만약 그가 슬프다면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당신이 슬픈 이유가 간호사나 변호사이기 때문은 아니듯이. 물론 어느 한 지점에서는 직업에서 비롯된 고충은 있겠지만 그것이 당신 슬픔의 전부는 아니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기도 했다. 당신이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고 어떠한 이유로 그걸 나에게 말하더라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일이 왜 슬픈 거냐고 되묻지 않을 거라고.
지나고 보니 오히려 한 사람에게 시인은 슬픈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더 강하게 심어준 건 아닐까 싶다. 그가 나의 씩씩한 동료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슬픔을 모자처럼 눌러쓰고 세상을 누비며 자신만의 유머로 작품을 써내는 것을 보면 그것이 지닌 결이 이토록 섬세하면서도 대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될 텐데. 때로는 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종이 위에 겹쳐두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 앞에서 짓는 엉뚱한 표정에 같이 웃기도 하면서 말이다.
적어도 나라는 사람에게 동료들의 작품은 그랬다. 지친 일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셨던 따뜻한 꿀물처럼 한 스푼, 두 스푼 맛보며 자꾸 꺼내 보게 되는 것. 그렇게 깜빡 잠이 들고 아침이 오면 피곤한 몸을 일으켜 또 다른 하루를 버텨낼 작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슬픔이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슬픔과 걸어갈 방향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날이면 슬픔으로 한 겹 덧씌워진 눈으로 세상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오늘은 하루 동안 어떤 표정을 정성껏 빚어 슬픔을 놀라게 해줄지. 어떤 재밌는 장면을 발견하여 이야기의 씨앗으로 삼을지 마음껏 그려볼 수 있었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