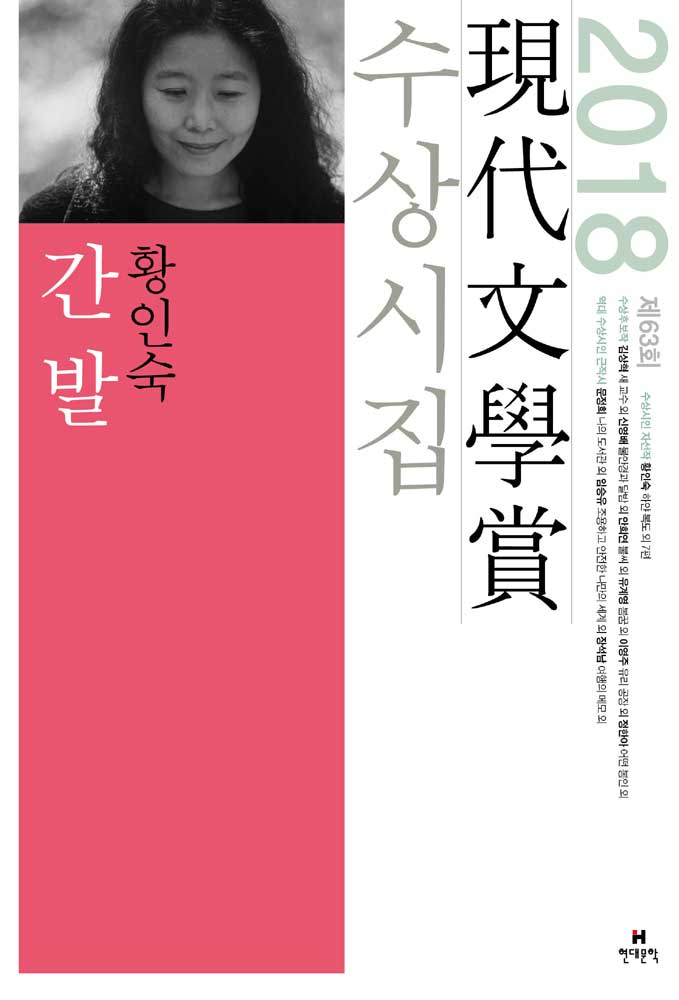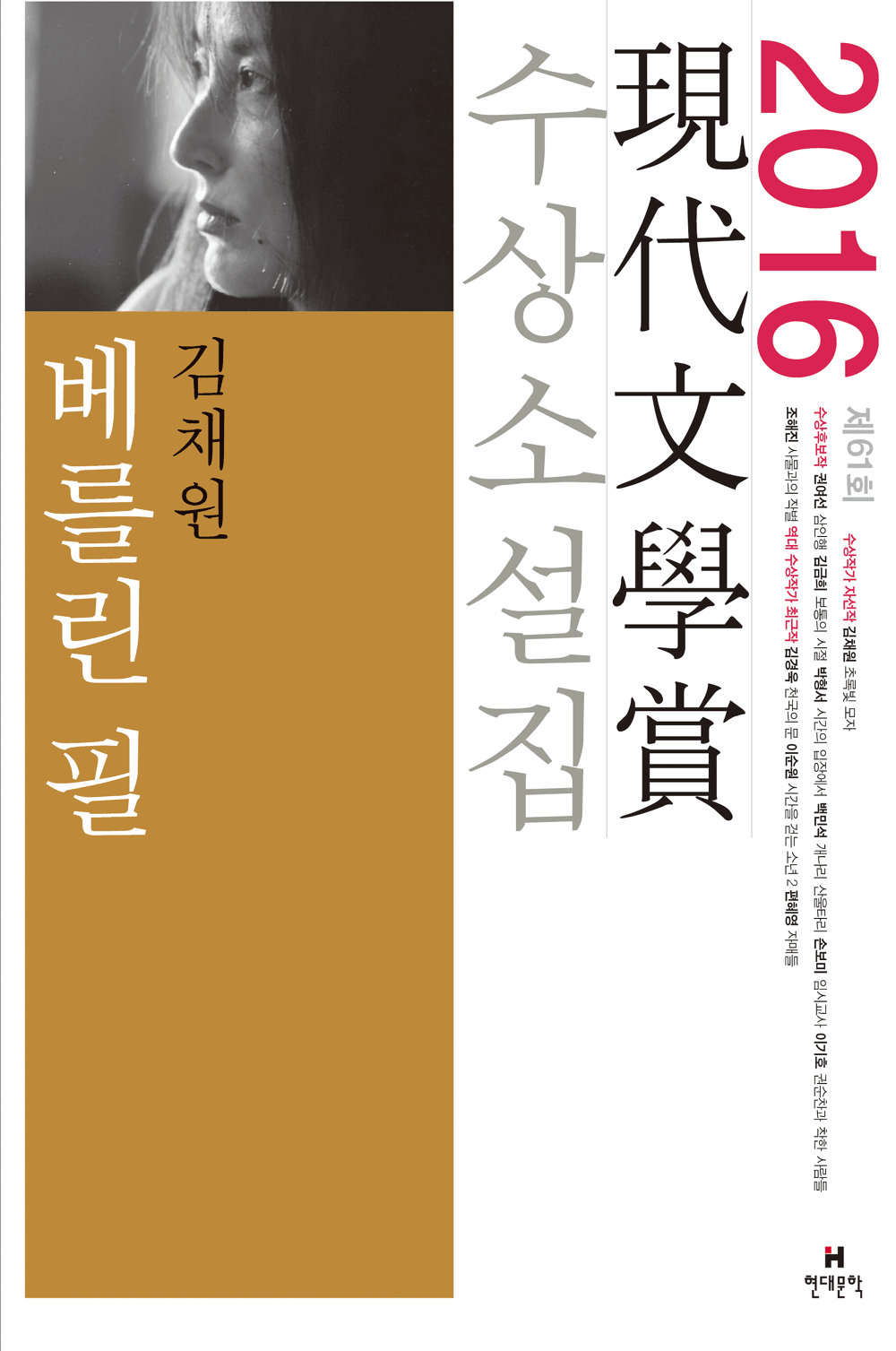지정석
- 저자 안미옥 지음
- 부제 2019년 제64회 현대문학상 수상시집
- ISBN 978-89-7275-948-5
- 출간일 2018년 12월 17일
- 사양 252쪽 | -
- 정가 12,000원
제64회 <현대문학상> 시 부문 수상자 : 안미옥 수상작 : 지정석 외
심사평
그의 시에서는 느낌이 닿을 수 있는 한계까지 가려는 섬세한 촉수가 감지된다. “다 담지 못할 것을 알면서 // 어둠은 깊이를 색으로 가지고 있다 / 더 깊은 색이 되기 위해 // 끝없이 끝없이 끝없이 / 계속되는 나무 // 한없이 한없이 한없이 / 돌아가는 피”(「론도」)나 “천변을 걷다가 / 오리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 제 얼굴을 전부 물속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 //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는 / 아주 작은 추 // (……) // 나는 얼굴을 몸속에 집어넣었다 / 안에서 쏟아지고 안에서 흘렀다”(「조도」) 같은 구절을 읽으면 언어가 닿을 수 없었던 막연한 느낌들이 가시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몸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된다. 그것은 모호한 느낌의 영역에 가둔 채 끝내 모르고 지나갈 뻔한 나의 어떤 존재를 체험하게 하는 것 같다. 그것은 이름이 없어서 막연하게 뭉뚱그려 내면이나 고독이라고 불렀던 어떤 느낌들에게 붙여주는 구체적인 이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느낌 속에만 있어서 끝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나 현상들에게, “온몸에 꽉 채우고 싶은 말”(「론도」)로 이름을 붙여주는 일, 그것을 통해 존재를 확장시키는 일은 시가 할 수 있는 본연의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하는 점을 안미옥의 시는 다시 생각하게 한다.
―김기택(시인 · 경희사이버대 교수)
수상자 안미옥의 시에는 우선 ‘체온’이 강하게 느껴졌다. “말에도 체온이 있다면 / 온몸에 꽉 채우고 싶은 말이 있다”(「론도」) 같은 구절에서, “왜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을까 // 귤을 만지작거리면 / 껍질의 두께를 알 수 있듯이 // (……) // 붉어진 두 눈엔 이유가 없고 / 나의 혼자는 자꾸 사람들과 있었다”(「지정석」) 같은 구절에서 체온은 드러난다. 자신의 삶을 오래 매만진,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오래 바라보고 삭힌 마음이 간단하고 명징한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는 점은 ‘안미옥스럽다’고 할 만했다. 커다란 꽃다발을 보내고 싶다.
―장석남(시인 · 한양여대 교수)
수상소감
시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끄럽고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더 만나고 싶다. 시를 더 깊게 경험하고 싶다. 수상 소식을 들은 날, 자전거를 타고 불광천을 한참 달렸다. 쓰고 싶다. 무엇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시를 쓰고 싶다. 질문을 놓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좋은 시인들의 시를 읽을 수 있어서, 그 덕분에 나도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쓰고 있는 것 같다. 함께 쓰고, 함께 읽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밤과 낮을 지나며, 여름과 겨울을 지나며 오늘도 한 문장을 더 쓰기 위해 앉아 있는 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